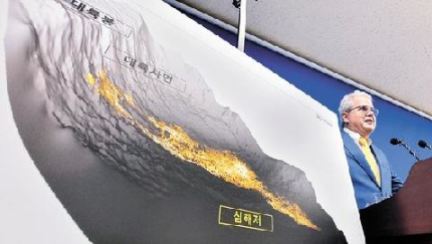Q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최고 우선 순위라는 걸 압니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성적은 우수한 편입니다. 힘든 고교 생활이지만 책에서 위로를 받아왔습니다. 멋지게 살아가는 멘토의 책을 읽으며 나도 지금만 잘 견뎌내면 그 사람처럼 멋진 삶을 살 거라는 희망을 품었죠. 그런데 삶의 모델로 생각했던 멘토가 구설에 휘말리면서 도망치다시피 세상의 관심에서 사라지니 괴롭습니다. ‘인간은 다 이중적인가’하는 생각이 들면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요. 공부를 하면 뭐하나 싶어 학업에 대한 의욕이 떨어져 걱정입니다. 제가 이상한가요.

A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현재 나의 삶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고등학교 시절은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때입니다. 상상과 환상의 나래를 펼쳐야 하는 시간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철학적 사고가 왕성히 일어나는 것도 고등학교 때인데 현재 교육 시스템은 입시 공부 때문에 자연스러운 삶의 고민조차 할 수 없게 만드니 답답합니다.
사람은 늘 좋은 멘토를 찾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고 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갖는 거죠. 사람의 감성 시스템은 신기하게도 현실과 환상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몰입하면서 마치 내가 주인공인 양 웃고 울고 분노하는 건 다 이 때문입니다. 나를 멘토와 동일시하면 멘토와 나 사이에 감성의 융합이 일어납니다. 내 자신의 가치가 그 멘토만큼 상승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도 본 적 없지만 나와 가까운, 현실의 지인으로까지 느껴지면서 닮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죠.
그러나 멘토가 완벽한 인물일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와 몰입은 내 불안 증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책과 미디어를 통해 좋은 면만 소개되다 어두운 면이 노출되니 더 과도하게 실망하는 것이죠. 대중의 비난 여론이 거센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현실성이 결여된 완전성에 대한 추구입니다. 현재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완벽한 환상을 기대합니다. 현재의 불안심리를 완전한 환상에 대한 몰입으로 해소하려는 겁니다.
환상에 대한 몰입만큼 강렬한 게 그 환상이 허점을 드러낼 때 보이는 분노 반응입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한 현재, 대중의 희망이 되었다 이중인격자로 추락하는 데는 24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현실이 힘들기에 환상을 원하지만, 그 환상이 현실이기를 바라지 않는 이중성이 우리 마음에 존재합니다.
환상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내 자아 가치가 상승하는 것처럼 느끼다가, 또 그 환상을 거침없이 추락시키면서 ‘그래, 인생 뭐 있어’ 하는 안락감도 느끼는 거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내가 만든 완벽한 환상과 내가 똑같지 않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상이 더 이상 환상으로 머물지 않고 현실화하면 상대적 박탈감에 통증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환상의 마법이 풀리기 전에 내가 먼저 그 환상을 추락시키는 게 내 자아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띄웠다가 추락시키는 것, 그건 우리 마음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숙해지는 신호라고 말이죠. 최근 범람하는 감성 마케팅이나 이미지 마케팅은 사실 진짜보단 가짜에 대한 추구였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는 단기적인 만족감은 주지만 긴 인생에서 놓고 보면 결국 허구일 뿐이라서 내 삶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학생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해야 하고, 공부 잘하면 훌륭하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얼핏 진실같지만 사실 증명되지 않은 허구입니다. 물론 공부를 못할수록 행복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적이 행복을 보장한다는 증거는 없죠. 행복한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는 연구는 있지만요. 완전한 환상에 대한 추구, 그리고 불완전하다는 게 드러난 공인에 대한 거친 분노 반응은 모양만 다를 뿐 성취 중심의 사회에서 가치 중심의 사회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성격장애 중 경계성(borderline) 인격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영화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매력적 여성이 여러 남성을 유혹하고 그 남성이 마음을 열면 가혹하게 그 남자를 차 버리는 캐릭터가 대표적입니다. 경계성 인격장애의 증상 중 하나가 좋은 이미지와 나쁜 이미지를 통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엔 완벽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좋지만 저런 점은 단점인 것이죠. 그런데 좋은 점을 보면 이상형을 찾았다는 기쁨에 몰입하고, 어느 순간 작은 단점이라도 발견하면 실망감에 강력한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증상의 저 밑바닥에는 자기 정체성(self-identity)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불안감 중 가장 큰 게 내 존재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죽음보다 치매를 더 두려워하는 건, 치매는 몸은 살아 있지만 심리적인 자기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취를 위해 애쓰고 남에게 인정 받고 싶어 노력하는 것도 자기 존재감을 느끼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성취 자체만으로는 그 존재감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성취를 한 것과 성취를 통해 내가 근사하다는 존재감을 느끼는 반응은 항상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성취를 즐길 마음의 여유가 없이 또 다른 성취를 통해 달려가는 삶은 너무 힘들고 결국 지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해집니다. 환상에 숨는 이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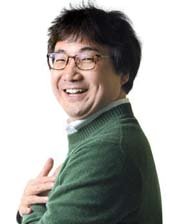
무조건 행복을 느껴야 한다는 행복에 대한 강박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인생이란 원래 약간 우울한 게 아니던가요. 높이 올라 간 사람도 언젠가는 내려가야 하고, 매력적인 미인도 늙을 수밖에 없고, 건강 관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살짝 염세주의로 사는 게 오히려 행복감을 준다는 어느 심리철학자의 조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한 주는 내가 이미 가진 소중한 것을 만끽하면 어떨까요. 전 주말에 강변에서 자전거를 타며 따뜻한 햇살과 바람을 즐겨볼 생각입니다. 황사가 뿌옇게 몰려와도 말이죠.
윤대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약 처방 맘에 안들어" 의사 찌른 환자…강남 병원 발칵](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a700cdd6-0b9e-4758-b8dd-276b7c6e93b2.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