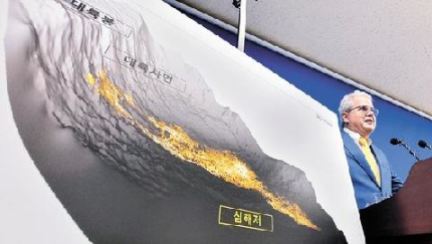최한솔
최한솔한국외국어대 노어과 4학년
한 장의 사진이 있다. 이 사진 속 아이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주저앉아 울고 있다. 이 아이의 집은 13층인데, 13층에 내려 집으로 가지 않고 23층까지 걸어서 올라갔다. 23층에 도착한 아이는 화분 두 개를 가지런히 놓았다. 화분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다. 퇴로 따위는 없었다. 잠시 뒤 아이는 사라졌다. 한 장의 편지만이 아이의 흔적을 세상에 남겨놓았다. 이 흔적 속에는 감수성이 예민한 17살 아이에게 벌어졌던 처절한 비극 한 편이 담겨 있다.
삐뚤삐뚤한 글씨체가 슬픔을 더하는 어느 학교의 교실에서 발생한 비극을 보자. 주인공과 같은 또래 몇몇 아이들은 ‘가해자’라는 역할을 수행했다. 나이에 걸맞지 않는 잔인함으로 비극의 주인공을 괴롭혔다. 관객들 앞에서 바지를 벗으라고 강요했고, 같이 샤워를 하면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만한 짓들을 했다. 이뿐만 아니다. 갈취, 폭행도 장시간 동안 이뤄졌는데 이를 본 어떤 관객도 나서지 않았다. 교사라는 역할을 맡은 어른들은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등을 돌린 모습이었다. 가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피해자에게 CCTV의 사각지대는 너무나 넓었다.
1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우리나라에서 10대가 쓰는 이런 비극은 점점 늘고 있으나 비극의 집필을 막기 위한 노력과 해결책은 요원해 보인다. 소통을 이어준다는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아이들의 소외감만 더 부추기고 있다. 퇴로가 없는 사람에게 활로를 뚫어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고 전화와 같은 사회안전망은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는 느낌이다. 아이들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학교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학교폭력 사건이 날 때마다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줄 몰랐다”는 학교 관계자의 무책임한 말에 이제 화조차 나지 않는다. “나 목말라”라며 절규하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교사. 이 직업의 정의와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또 한 장의 사진이 있다. 한 명의 여성이 장례식장에서 누군가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오열하는 모습이다. 바로 사흘 전 있었던 경산 학교폭력 자살 학생의 어머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아들의 친구를 친자식처럼 대했지만 ‘은혜’가 ‘가해’라는 폭력으로 돌아왔다. 아이가 적은 유서를 하염없이 쳐다보며 시간을 돌리고만 싶은 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을까.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아이들의 심리 현상을 분석해 대책을 세우는 어른들의 점잖은 행동의 실효성에 이제 의문이 생긴다. 학교폭력 근절의 시작은 현실적인 분노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영정 사진 앞에서 유서를 부여잡고 통곡을 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분노, 이 분노가 모든 대책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다.
최 한 솔 한국외국어대 노어과 4학년
◆대학생 칼럼 보낼 곳
페이스북 페이지 ‘나도 칼럼니스트’ (www.facebook.com/icolumnist) e메일 (opinionpage@joongang.co.kr)
![[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