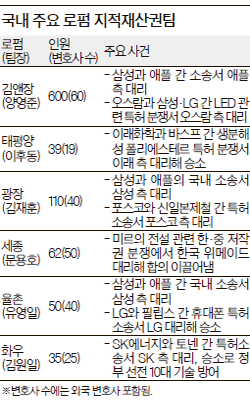
스티브 잡스는 1997년 애플의 최고경영자(CEO)로 화려하게 복귀하면서 두 가지 전략을 준비했다. 아이팟을 매개로 한 음원 유통시장의 장악과 IT 특허소송전이다. 잡스의 전략은 애플이 몇년 새 삼성과 노키아 등을 전 세계 법정에 동시다발적으로 제소하며 현실화됐다.
잡스의 생각을 애플보다 먼저 구현한 곳이 있다.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불리는 전문 특허관리기업이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츠 페이턴츠’는 지난 3일 인터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삼성전자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자사가 보유한 통신특허 7건을 침해했으니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 등 주력상품군의 미국 수입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1972년에 이동통신기기 개발업체로 출발한 이 회사는 지금은 더이상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오로지 특허와 지적재산권만으로 수익을 내는 특허괴물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개발이나 디자인, 마케팅만큼이나 특허와 소송 관리가 중요해진 것이다.
덩달아 로펌들도 분주해졌다. 기업의 주력 전쟁터가 특허 관련 협상이나 법정으로 옮아가면서 주요 병력도 협상과 소송 대응인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애플과 구글의 경우 특허 관리와 소송 관리 비용이 연구개발(R&D) 예산을 넘어섰다.
한국도 이런 변화의 흐름에서 멀리 떨어져있지 않다. 나라 경제력과 기업의 경쟁력이 이미 세계 수준에 올라서 있기 때문이다. 미국 특허분석 업체인 ‘클레임 페이턴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딴 회사는 IBM(6478건) 이었고, 삼성전자가 5081건으로 2위에 올랐다. 이 밖에 LG전자(1624건)가 10위를 차지했고 SK하이닉스(747건)와 LG디스플레이(626건)가 50위 안에 포진했다. 국내 기업이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전쟁에서 쓸 실탄을 충분히 확보한 것이다.
실탄을 사용할 병력도 크게 늘고 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은 변호사 60명, 변리사 150명을 포함해 600명에 이르는 전문그룹을 운영하며 모든 분야의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도 지적재산권팀의 규모가 2009년 29명에서 지난해에는 두 배 이상인 62명으로 늘었다. 전체 매출에서 지적재산권 분야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25%로 껑충 뛰었다. 광장은 110명의 지적재산권 그룹 소속 전문인력이 30여 개 전문팀으로 나뉘어 기업들의 법률적 필요에 대응하고 있다.
단순히 인원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첨단 기술을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이공계 출신 변호사를 대폭 확대하면서 전문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태평양은 지난해 신입 변호사 중 31%인 6명을 이공계 출신으로 충원했을 정도다. 세종의 지적재산권팀에도 공대와 약대 출신 변호사가 7명이나 포진해 있다. 로스쿨이 정착하면서 이런 경향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학부에서 이공계열을 전공한 학생이 20%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