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인 20%뿐 … 현대차 포함 10곳 51명 중 12명
나머지는 법조·관료·학자 … 바람막이 역할 비판 자초
경영합리성은 뒤로 밀린 사외이사
 [일러스트=김영희]
[일러스트=김영희]이탈리아 자동차회사 피아트그룹의 지주회사인 엑소르(Exor)가 29일(현지시간)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재용(44) 삼성전자 사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 사장에게는 이 회사의 경영전략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전략위원회(Strategy Committee) 위원 자리가 맡겨졌다. 국내 대기업의 현직 경영인이 글로벌 기업의 사외이사로 일하게 된 것은 처음이다.
엑소르의 이 같은 사외이사 선임은 국내 기업들과 크게 다르다. 중앙일보가 국내 10대 그룹 주력 계열사 10곳이 전자 공시한 사외이사 명단을 파악한 결과 전체 51명 중 전·현직 교수가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 경영 경력이 있는 이들은 12명에 그쳤다. 특히 현재 기업 활동에 몸담고 있는 인사는 5명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21명은 판·검사 등 법조인 출신과 국세청·공정위원회 등 관료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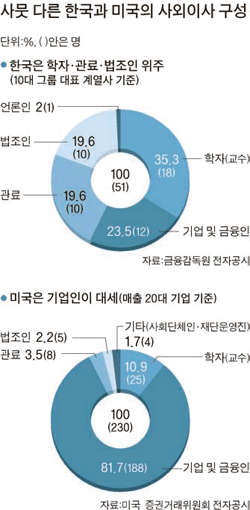
국내 기업의 사외이사 중에 학자와 관료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얼까. 한국경제연구원 김현종 박사는 “미국과 같은 투자자 이익 중심의 경영활동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의무화된 제도여서 기업들이 사외이사 제도를 경영 합리성보다는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규제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상장사들에 대해 사외이사 제도가 의무화된 때는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이다. 기업 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가 전체 이사의 절반을 넘어야 하고, 또 적어도 3명은 둬야 한다고 규정했다. 갑자기 이런 제도가 생기자 기업들은 일단 구색 갖추기 식으로 사외이사를 영입했으며, 그런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게 김 박사의 얘기다.
이에 더해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실질적으로 기업 경영에 도움을 준다기보다 명성 있는 학자나 관료, 법조인 중심으로 모양새를 갖추거나 기업의 리스크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진용을 짜는 일이 일반화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송민경 연구원은 “경영진과의 친분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도 많다”며 “투자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경영진에 의해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국내 사외이사들은 기업들이 제시하는 방향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10대 기업(6월 결산 법인인 삼성생명 제외)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신한금융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기업에서는 지난해 열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의 반대 의견 제시가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코스닥 기업 중에서 이사회 평균 출석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기업은 물론 이사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사외이사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팀 부장은 “기업에 대해 잘 모르니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손을 들어 찬성을 표하는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사외이사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재용(左), 에릭 슈밋(右)
이재용(左), 에릭 슈밋(右)10대 그룹 주요 계열사 10곳 중 판·검사 출신 인사가 없는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8곳은 지검장과 지법원장 이상급 인사가 속해 있다. 법조인이나 관료를 많이 뽑는 데 대해 기업들은 “준법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외부의 시각은 다르다. “만일에 대비해 바람막이를 사외이사로 둔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형사·세무·공정거래 관련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도 바로 이런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레너드 세일즈 전 컬럼비아대 교수는 그의 저서 『CEO의 두 얼굴』에서 “유능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춘 사외이사가 최고의 컨설팅”이라고 강조했다. 경영진이 마련한 주요 경영전략을 검토해 가부를 결정해주는 게 사외이사의 핵심 역할이라는 맥락에서다. 이런 이유로 미국 기업들은 다른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또는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데 적극적이다. 에릭 슈밋(57) 구글 CEO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애플컴퓨터의 사외이사로 일한 게 대표적 사례다.
국내에서는 삼성화재가 2005년부터 SK그룹 CEO 출신들을 한 명씩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현재는 신헌철(67) 전 SK에너지(현 SK이노베이션) CEO가 속해 있다. 최근 들어서는 김승유(69) 하나금융지주 회장(대한항공) 등이 사외이사 대열에 합류했다. 포스코의 경우 최근 주총에서 7명의 사외이사 중 4명을 전·현직 CEO로 채웠다.
CEO의 사외이사 겸직은 CEO로 일하는 회사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지난해 미국 보스턴대 마르타 겔레카니츠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CEO가 있는 산업군의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총자산이익률(ROA)이 평균 15% 더 높았다. ROA는 기업의 총자산을 활용해 얼마나 많은 당기순이익을 창출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사외이사 활동을 통해 다른 기업들이 도전에 대응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병주·조혜경 기자
미국은 82%가 기업인 … “경영 잘 아는 게 중요”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매년 선정 이유 공시
미국 매출 20대 기업 보니
사외이사 제도를 만들어 낸 미국의 경우 한국 기업들에 비해 경영인 출신 비율이 훨씬 높았다. 중앙일보가 미국 매출 상위 20개 기업의 사외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30명의 사외이사 중 경영인 출신은 188명으로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교수·연구원 등 학자 출신의 사외이사는 25명으로 전체 사외이사 중 10%를 약간 넘는 정도였다. 장관 등 관료 출신은 8명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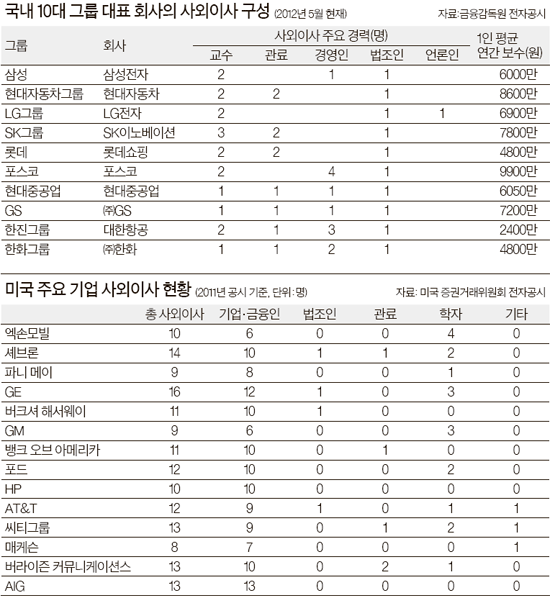
1956년 사외이사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미국은 사외이사들이 대부분 경영인 출신이다. 이사회는 기업 활동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이므로 이사들은 무엇보다 경영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미국 기업들은 기업인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은 이런 사외이사들이 전체 이사진의 절반을 넘어야 한다는 점을 상장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보험사인 AIG그룹과 의약품판매사인 CVS 케어마크 등은 아예 사외이사 전원을 기업인과 금융인 출신으로 구성했을 정도다.
현직 경영인이 다른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는 경우도 있다. 현재 월마트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토머스 스코브(60)는 GM의 사외이사를, 보잉의 최고경영자(CEO)인 제임스 맥너니 주니어(63)는 IBM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전문금융인이 사외이사를 맡은 경우도 많다. 전직 모건스탠리의 이사인 로버트 스컬리(63)는 상업 및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외이사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FO 출신이자 칼라일 그룹의 고문으로 있었던 제임스 핸스(66)는 현재 포드의 사외이사다.
상당수 기업은 사외이사를 선발하는 기준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 워런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매년 사외이사를 선출할 때마다 선정 이유를 경영보고서에 상세하게 적어놓는다. IBM·GE도 사외이사들의 약력 외에 선정 이유를 매년 공시하고 있다.
관료나 학자 출신의 사외이사를 선정할 때도 전문성이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다. 마이클 보스킨(67)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권위 있는 경제학상인 애덤 스미스상을 비롯한 다수의 수상 경력과 개인 컨설팅회사 운영 등의 경력을 인정받아 1996년부터 현재까지 엑손 모빌의 사외이사로 있다.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외이사인 수전 바이스(65)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사를 역임했다.
조혜경 기자
![[오늘의 운세] 5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