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는 없어도 '본즈'는 있다. 월드시리즈 우승반지는 끝내 그를 외면했지만 배리 본즈(38·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현존하는 최고의 타자, 최고의 선수라는 사실은 이번 월드시리즈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 다만 '월드 챔피언'에 오르려면 개인의 기량과 노력뿐 아니라 행운과 팀워크가 따라줘야 한다는 것을 한번 더 확인시켜준 아쉬운 무대였을 뿐.
그는 야구의 타이거 우즈였고 마이클 조던이었다. "그는 사람이 아니다 (He's not human)"는 애너하임 에인절스의 타격코치 미키 해처의 말이 이번 시리즈에서 본즈의 활약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다.
본즈는 무려 17년을 기다려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았다. 17년이면 한 아이가 태어나 걸음마를 시작하고, 말을 배운 뒤 사춘기를 거쳐 성인을 눈앞에 두게 되는, 그런 긴 세월이다. 1986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프로에 데뷔한 본즈는 올해 처음으로 '가을의 고전'으로 불리는 월드시리즈 무대에 섰다.
그의 월드시리즈 도전사는 수난과 굴곡의 역사다. 본즈는 1990년부터 92년까지 파이어리츠 유니폼을 입고 3년 연속 월드시리즈 문턱에서 좌절했다.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에서 신시내티 레즈(90년)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91,92년)에 아쉽게 무릎을 꿇었다. 팀 재정이 열악했던 파이어리츠는 92년 시즌을 끝으로 내리막길을 걸었고 자유계약 선수가 된 본즈는 "우승이 가능한 팀에서 뛰고 싶다"며 떠났다. 그리고 현재의 팀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었다.
자이언츠에서도 본즈는 두번 더 좌절했다. 97년과 2000년 본즈가 이끄는 자이언츠는 포스트시즌에 진출했지만 1차 관문인 디비전시리즈에서 탈락했다.
이렇게 다섯번의 월드시리즈 도전에서 좌절하는 동안 본즈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27경기 통산 타율이 0.196이었고 홈런은 고작 한개뿐이었다. 그에게는 '큰 경기에 약하다'는 비아냥이 따라다녔다.
그대로 좌절했다면 본즈는 그냥 '홈런을 잘 때리는 타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리더십과 팀워크에서 '0점'이며 자신의 타석에만 집착하는 극단적 개인주의자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을 것이고 그가 쌓아놓은 갖가지 명성에 흠집이 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즈는 이번 포스트시즌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입증했다. 가을마다 헛방망이질을 해댔던 부진을 한꺼번에 만회했다. 그는 포스트시즌 동안 8개의 홈런을 때려 이 부문 신기록을 세웠고, 월드시리즈에서도 첫 타석 홈런을 비롯해 4개의 홈런을 때렸다. 1차전 첫 타석에서의 홈런은 17년을 기다려온 본즈의 갈망이 잘 표현된 한 방으로 볼 수 있다. 포스트시즌 17경기를 치르는 동안 그는 74번 타석에 들어섰고 그 가운데 43번을 출루했으며 무려 27번을 볼넷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소인국의 걸리버'였다.
그를 상대하려 덤벼드는 투수를 꼽으라면 손가락 한두개면 충분했다. 그 엄청난 견제 속에서도 그는 7차전 마지막 타석(결국 볼넷이었다)까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다. 파티는 끝났고 본즈의 손가락에는 아직 반지가 없다. 그러나 본즈는 패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한 시리즈를 펼쳤다.
야구전문기자
pinetar@joongang. co. kr
![[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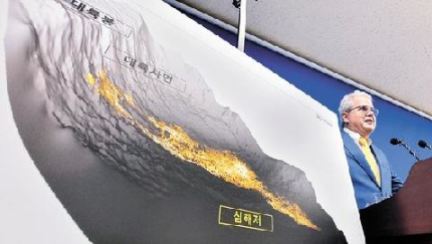
![[속보] 푸틴·김정은 회담 시작…국방·외교 참모진 대거 동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e1c52a77-fca5-46fb-a6d7-d6243489746f.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