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들리 벅월터 대표가 자신이 만든 삼계탕을 선보이고 있다. [정치호 기자]
다국적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오티스의 브래들리 벅월터(45) 한국법인 대표는 열렬한 삼계탕 애호가다. 1994년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는 거의 한 달에 두세 번 꼴로 삼계탕을 먹는다. 원기 회복에 이만한 음식이 없다는 게 그의 믿음이다.
“나이가 중년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레 건강을 챙기게 되는데, 삼계탕보다 영양가 높은 음식은 없기 때문이죠.” 특히, 닭고기 안에 소화가 쉬운 찹쌀이 들어가 몸이 아플 때 먹으면 제격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인 그가 삼계탕을 처음 맛본 것은 83년. 미 유타주 브리검영대학교에 다닐 당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자 한국에 여행 왔을 때 먹어보고는 완전히 매료됐다고 한다.
“머나먼 타국에서 삼계탕을 맛보는 순간 고향서 먹던 치킨누들수프 생각이 났다”며 “그때 그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감기 걸렸을 때 흔히들 먹는 음식이 바로 치킨 누들 수프입니다. 삼계탕과는 맛이 비슷한데다 보양식으로도 좋다는 점에서 서로 통하는 음식이죠.”
벅월터 대표가 94년 오티스 한국법인에 최고재무관리자(CFO)로 발령받으면서 다시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그 뒤 2008년부터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한국 생활이 벌써 16년째이다. 오래 살다 보니 여러 한식을 두루 먹어봤지만 삼계탕만한 게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유창한 한국말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삶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왔지만 삼계탕 없는 삶은 더욱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까지 말할 정도다.
“많이 먹어는 봤지만 만들어보긴 처음”이라는 벅월터 대표가 영계를 손질하는 것을 시작으로 삼계탕 만들기를 시작했다. 그가 모자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자 옆에서 도와주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김재선 주방장은 “스타 셰프 같다”며 응원했다.
먼저 영계 뱃속에 대추 한 개를 넣고 미리 불려 놓은 찹쌀을 마늘·인삼과 함께 채웠다. 그는 뱃속의 찹쌀이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게 조심하면서 영계의 두 다리가 풀리지 않도록 엇갈려 꼬아 묶었다.
벅월터 대표는 “삼계탕용 닭고기는 따로 있나” “찹쌀은 어느 정도 불리는 게 좋으냐”고 또박또박한 한국어 발음으로 연방 질문을 던졌다. 김 주방장은 “무게가 400~500g 정도의 알을 낳기 이전의 영계를 주로 쓰고, 찹쌀은 여러 시간 동안 물에 불리는 게 좋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삼계탕 육수를 우려내기 위해 김 주방장이 황기·대추·대파·생강·청주 등 재료를 물에 넣고 끓이자 벅월터 대표는 “삼계탕용 육수를 이렇게 따로 끓이는지 몰랐다”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삼계탕이 다 끓자 벅월터 대표는 한 수저 맛을 본 뒤 만족스런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 맛 때문에라도 (내가) 해외에 한식당을 열게 된다면 꼭 삼계탕 전문점을 열 것”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그는 한식 세계화에 대해서도 “해외에 한식이 소개될 때 본연의 맛을 완전히 잃어버린 ‘퓨전(fusion)’ 요리만 소개되는 경우를 간혹 봤다”며 “한국 사람들이 자기 음식을 더욱 사랑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에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충고했다. 삼계탕만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맛을 살려 해외 시장에 도전하라는 것이 그의 주문이다.
글=이은주 중앙데일리 기자
사진=정치호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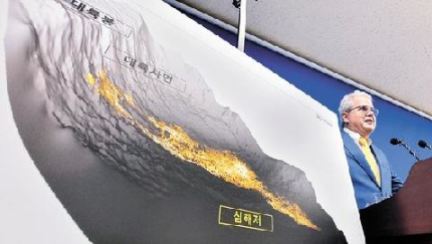
![[속보] 푸틴·김정은 회담 시작…국방·외교 참모진 대거 동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e1c52a77-fca5-46fb-a6d7-d6243489746f.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