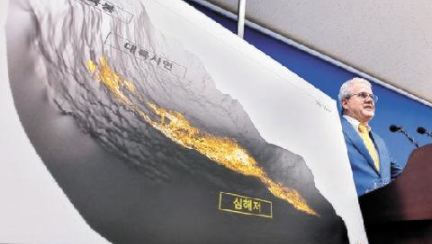중국에 ‘9년 징크스’라는 게 있다. 9로 끝나는 해에 국가 안위를 위협할 만한 대형 사건이 터지기에 나온 말이다. 중국에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게 1949년이었다. 티베트 봉기 무력진압(59년), 중·소 무력 충돌(69년), 중·베트남 전쟁(79년) 등이 모두 9로 끝나는 해에 벌어졌다. 민주화 시위대를 탱크로 진압한 6·4 천안문(天安門)사태가 89년 발발했고, 99년에는 미국의 주(駐)유고슬라비아 중국대사관 폭격 사건이 터졌다. ‘피의 9년’이라는 말도 나온다.
다시 10년이 흘러 2009년이다. 1년 전이라면 호사가들의 말장난에 불과했을 ‘9년 징크스’가 요즘 국내외에서 화제다. 중국이 심한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혹시 올해도?’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대량실업에 따른 사회불안이 가장 큰 이유다.
허난(河南)성의 벽지 농촌인 류중춘(劉塚村) 주민 리젠슈(李健秀). 그는 지난해 말 광둥성 둥관(東莞)의 직장이 파산하자 설 명절을 쇨 겸 일찍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조기 귀향 농민공(농촌 출신 노동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신세타령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낸다. 문제는 설을 쇤 후에도 이들이 다시 도시로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일자리가 사라진 탓이다. 전체 농민공 1억3000만 명 중 약 3000만 명이 농촌 유민(遊民)으로 떠돌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이었던 농민공이 이제는 사회불안 세력으로 변한 셈이다.
도시는 더 심각하다. 올해 도시 지역 실업자는 2400만 명(중국 정부 공식 추산). 이 중 대졸 실업자는 1000만 명이 넘는다. 89년 천안문 사태의 주역이 대학생이었다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의 고민이 깊다. 도시에서 집단시위는 이제 흔한 일이 됐다. 한 해 10만 건 이상의 시위가 벌어진다. 서방 일부 언론은 설을 지낸 농민공들이 2월 대거 도시로 몰려들면서 실업 문제가 폭발할 수 있다는 ‘2월 위기설’을 띄우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이쯤에서 ‘9년 징크스’에 숨겨진 또 다른 키워드를 볼 필요가 있다. 바로 ‘개혁’이다. 중국은 79년 베트남 위기 속에서도 개혁개방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89년 천안문 사태로 개혁개방은 한때 주춤하는 듯했지만 덩샤오핑은 속으로 더 큰 개혁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90년 말 상하이에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증시가 설립된 게 이를 보여준다. 중국은 99년 유고슬라비아 대사관 피폭 후에도 개방의 끈을 놓지 않았고,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성공하게 된다. 위기 속에서도 개혁방안을 찾았고, 이를 통해 성장동력을 만들었던 것이다. ‘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는 이번 위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민진국퇴(民進國退·민간 분야의 진입과 국영 부문의 후퇴)’가 핵심이다.
중국의 올 경제정책은 ‘바오바(保八)’로 요약된다. 무슨 수를 쓰든 성장률 8%를 지키겠다는 뜻이다. 4조 위안(약 800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 대책 발표 후 투자 프로젝트가 봇물 터진 듯 쏟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개혁이 바로 ‘민진국퇴’다. 국가 또는 국유 기업이 독점해온 분야를 과감하게 민간에 개방,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안이다. 서비스분야 민간기업 진입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세금을 대폭 깎아 민간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움직임이다. 투자에 의존했던 기존 성장전략을 내수시장 위주로 바꾸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국가 경제·산업구조를 뜯어고치는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게 중국 지도부의 확고한 신념이다.
중국 경제가 위기인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중국 지도부의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 30년 동안 그래왔듯 말이다. 개혁 속에서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어찌 중국만의 일이겠는가….
한우덕 중국연구소 차장
![[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