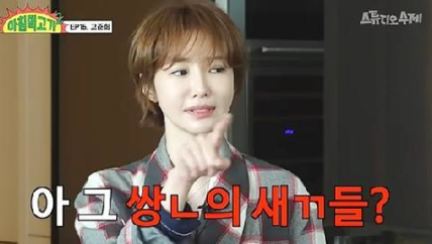어느 대학의 문학강의 시간에 교수가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톨스토이·체호프·고리키·입센·스트린드베리·졸라·프루스트·카프카·릴케·브레히트·제임스 조이스·DH 로렌스·그레이엄 그린 등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러나 학생들은 의기양양 하게 대답했다. 『모두 노벨상을 못탔습니다.』
이같은 짖궂은 농담속에는 1901년 처음 시작된 이래 21세기 세계문학을 이끌어온 노벨문학상에 대한 선망과 질시가 함께 스며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노벨문학상은 지금까지 뛰어난 작가들에게 주어진 가장 권위있는 문학상이지만,한편으로는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들을 제외시켰다는 점에서도 유명한 상이다.
이처럼 노벨문학상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스웨덴 한림원의 회원 구성 때문이라고 언젠가 뉴스위크지가 지적한 일이 있다. 18명의 한림원회원은 대부분 귀족이다. 따라서 스웨덴의 정상급 작가들이 회원이 된 적도 없고 앞으로 될 수도 없다. 이 말은 문학의 아마추어들이 프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 암시하고 있다.
그야 어쨌든 10월은 노벨상의 계절. 엊그제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시인겸 극작가 데릭 월코트가 금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됨으로써 다시 우리 문학의 노벨상 수상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작가들이 노벨상 후보로 추천된 연륜도 그리 짧지만은 않다. 지난 69년 처음으로 김은국씨가 추천된 것을 비롯,김동리(81년)·서정주(90년)씨 등 우리 문학을 대표하는 원로들이 추천되었으며,시인 김지하씨는 어려운 시절 이례적으로 일본 펜클럽에 의해 추천되기도 했다.
올해 추천된 작가는 최인훈씨. 그의 대표작 『광장』은 남북문제와 함께 동서냉전을 몰고온 이데올로기의 무의미함을 이미 60년대초에 예고한 작품이다.
우리 문학이 노벨상을 겨냥하는 것은 아직도 요원한 꿈인가. 물론 꿈만은 아니다. 좋은 번역자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작가 가와바타(천단강성)에게 사이덴스트커 같은 명번역자가 없었다면 그의 『설국』은 지금도 스웨덴 한림원의 책상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올림픽을 개최한 그런 국력의 뒷받침을 이번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에 쏟아야 할 때가 되었다.<손기상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