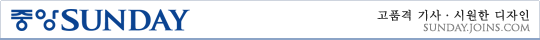
①‘나그함마디’로 가는 길 기독교는 2000여 성상을 거쳐 형성되어 온 것이다. 이 말은 곧, 모든 종교가 한 시점에서의 완성된 고정적 모습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세기의 기독교나 4세기의 기독교나 16세기의 기독교나 21세기의 기독교가 다 동등한 자격을 지니는 기독교의 모습이다. 기독교는 물론 예수교(예수의 가르침)에서 발전한 것이지만 역사적 예수 (Historical Jesus)가 과연 누구인지 모든 신학자의 견해가 분분하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The New Testament)도 똑같이 2000여 성상을 거쳐 같이 형성되어 온 것이라는 사실이다. 성경의 정본은 어느 곳에도 없다. 오늘의 27서 체제 신약성경은 4세기 후반에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지만 4세기의 성경이나, 오늘날 한국인이 읽고 있는 한글 개역판 성경은 똑같은 자격을 지니는 성서의 다른 판본일 뿐이다. 신학도들이 정본의 기준으로 삼는 희랍어 성경도 그 자체가 19세기 말에나 겨우 구비된 모습을 갖춘 것이다. 예수는 희랍어가 아닌 아람어(Aramaic)라는 갈릴리 토속 말을 한 사람이었다. 20세기는 인류 사상 가장 위대한 고고학 발굴 성과의 시기였다. 그중 성서와 관련된 두 개의 발굴이 있다. 하나는 구약과 관련된 사해 부근의 쿰란 공동체 동굴 라이브러리 문서의 발견이고, 하나는 신약과 관련된 나일강 중류 나그함마디 체노보스키온 문서의 발견이다. 후자의 문서는 외경으로 가볍게 처리될 그런 문서가 아니라 성경 자체의 이해를 풍요롭게 만드는 진본일 뿐 아니라 역사적 예수를 재구성하는 데 결정적 실마리를 제공하는 위대한, 아니 가히 혁명적이라 말할 수 있는 문헌임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따른 신학 논쟁도 날로 깊어지고 있다. 성서를 성령의 강림이라고만 믿고 있는 많은 사람도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알아야 한다. 성령도 반드시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강림하는 것이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와 함께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나 보는 것이 어떠할는지! 모든 종교나 진리는 형성 중에 있다 (All religion is in the making). 완결은 죽음이다. 새로운 형성을 향한 나의 발돋움이 한국의 기독교와 우리 사회를 보다 생명력 있고, 보다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게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한다.
도올의 도마복음 이야기 GOSPEL OF THOMAS
도마복음서를 게벨 알 타리프 절벽에 숨긴 것은 인류사상 최초의 조직적 공동체 수도원을 만든 파코미우스의 제자들이었다. 이 성화는 파코미우스(오른쪽)와 그의 스승 팔라몬을 그린 것이다. 엘카스르의 팔라몬기념수도원에서 찍었다. 사진=임진권 기자
사바크(sabakh)! 백문불여일견이라. 나는 실제로 나일강 언저리의 척박한 사막고원 일대를 밟아 보고야 알았다. 그것은 바위산 절벽 밑에서 캘 수 있는 층층비늘처럼 쌓인 암석층인데 쉽게 부스러진다. 겉은 누르스름하지만 쇠 절구로 빻으면 하얀 석회처럼 고운 가루가 된다. 질소를 풍부히 함유한 천연비료가 되는 것이다. 과거 이집트 농부들은 그것을 땅에 뿌리곤 했다. 요즈음은 화학비료를 선호한다고 했다. 아스완 댐으로 범람이 사라지고 땅은 점점 산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사바크를 캐 오는 것은 통상 동네 아이들의 몫이다. 이집트 사막을 통과하는 나일강은 아스완을 지나 룩소르(Luxor)에 이르러 ‘왕들의 계곡(Valley of the Kings)’을 끼고 크게 휘돈다. 그 굽이가 끝나는 지역에 나그함마디(Nag Hammadi)라는 나일강 서안의 도시가 있다. 나그함마디에서 강 건너편 마주 보는 곳에 엘카스르(El Qasr)라는 작은 농촌이 있다. 그 농촌을 체노보스키온(Chenoboskion)이라고도 부른다. 내가 찾아간 엘카스르에는 우리의 주제와 관련된 초기 기독교 수도승 세인트 파코미우스(St. PachomiusㆍAD 292~346)의 스승이었던 세인트 팔라몬(St. Palamon, Anba Balamun)을 기념하는 수도원이 우뚝 서 있었다. 그 수도원을 지키는 매우 노쇠하게 보이는 파파 노인이 한 명 있었는데 통성명을 해 보니 나보다 나이가 한두 살 어렸다.
1945년 12월의 사건이었다. 이 엘카스르 동네의 어린아이들이 일곱 명 떼지어 낙타를 타고 사바크를 캐러 원정을 떠났다. 12월은 날씨도 선선하고 땅이 물러 사바크를 캐기도 좋고 그때가 마침 나일강 유역이 경작기라서 비료를 줄 시기인 것이다. 엘카스르에서 3㎞ 정도 떨어진 곳에 게벨 알 타리프(Gebel al-Tarif)라는 기암절벽 산이 있다. 그 기슭에 사바크는 무진장 있다. 한 아이가 곡괭이질을 해대는데 파각하고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심상치 않은 공명 소리에 곡괭이를 멈추었다.
큰 바위 밑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니 거대한 붉은색 토기 항아리가 자태를 드러냈다. 아가리와 밑동은 좁고 중간은 불룩하다. 목 네 귀퉁이로 손잡이 고리가 달려 있고, 아가리는 사발로 덮여 있었는데, 가장자리는 천연 아스팔트 역청으로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었다. 이것을 처음 발견한 아이는 15세의 아부 알 마지드(Abu al-Majd)였다. 이 아이는 겁이 덜컥 나 그 사실을 같이 간 큰형에게 알렸다. 형 무하마드 알리(Muhammad Ali al-Samman)는 26세로 사바크 원정대의 팀장 격이었다. 알리는 높이 70㎝가량의 이 신비로운 항아리를 개봉하기를 매우 두려워했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스토리에도 나오듯이 이집트인의 관념에는 대개 이런 항아리 속에는 진(jinn)이라는 사기(邪氣)가 들어 있다고 믿었다. 잘못 뜯었다간 그 사기가 빠져나와 거대한 사람이나 동물 형상의 귀신이 되어 사람을 해한다는 액운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삼만 족속의 이 무하마드 알리는 흑인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와 이름은 같지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다. 무지렁이 촌놈이었다. 불행하게도 찬란한 이집트 고대문명의 성과가 이들 후예에게는 전혀 전달되어 있질 않았다.
알리는 진에 대한 공포도 있었지만 퍼뜩 불순한 탐욕에 사로잡힌다. 그래! 이런 마법의 항아리 속에 찬란한 파라오의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다. 용기가 솟았다. 순간 알리는 곡괭이를 들어 힘차게 내리쳤다. 학계의 추산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1578년 동안 이 항아리의 흑암 속에 갇혀 있었던 인류문명의 한 거대한 보고가 인간세의 광명으로 드러나는 그런 위대한 순간이었다.
항아리는 산산조각 났다. 어찌 되었을까? 그 순간 알리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정말 번쩍이는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혔다. 금가루의 진이 하늘을 수놓는 듯 허공이 빛났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이었다. 그의 발 아래 드러난 것은 파피루스(papyrus) 다발을 가죽으로 정중하게 포장하고 묶은 13개의 코덱스(codex)였다. 아마도 이 코덱스 겉가죽이 금박으로 장식되었을 수도 있다. 순간 그 금가루들이 증발했을 것이다.
김이 팍 샜다. 우선 돈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파피루스 파편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고문명의 후예들이 아닌 것이다. 기원 전후 시기에 책은 크게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양피지(parchment)라는 것인데, 양이나 염소ㆍ소가죽을 재료로 쓴 것이다. 이것은 요즈음 우리가 보는 족자 형태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 이것은 볼룸(volume)으로 센다. 또 하나는 파피루스인데 이것은 나일강 하류 델타 지역에서 페니키아 일대에 자생하는 4~5m가량의 갈대풀인데 이것을 잘라 엮어 편편한 바위로 눌러 놓으면 저절로 풀 성분이 나와 접착되어 종이처럼 된다. 파피루스는 1~2세기 께는 꼭 요즈음 책(冊)처럼 한쪽으로 묶어 제본을 했다. 그 제본된 책을 가죽 보자기로 싸고 네 귀퉁이에 묶인 끈으로 둘러 묶는다. 이것을 우리는 코덱스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의 코덱스 속에는 대여섯 개의 책이 같이 제본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알리가 깬 항아리에서 나온 13개의 코덱스 속에는 필경 60여 개의 책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 물론 우리의 신약성경보다 많은 분량이다.
사바크 절벽 비탈에 나둥그러진 이 지저분한 가죽 코덱스를 바라보던 아이들은 모두 재수없다는 듯이 입을 삐죽거렸다. 그렇다고 항아리를 깨고 얻은 전리품을 혼자 독식하는 것도 별로 체면이 서지 않았다. 알리는 그 코덱스를 북북 찢어 일곱 명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코덱스를 북북 찢는 그 장면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진다.
파피루스를 손에 든 아이들은 별로 기분이 내키지 않았다. 우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듯이 보였다. 그리고 알리가 나누어 주는 품새가 뭔가 내키지 않는 느낌이 있었다. 아이들은 곧 파피루스를 모두 알리에게 되돌려주었다. 우린 담배도 안 피운다. 너나 팔아 담배 몇 개비라도 얻어 먹어라! 썅. 그나마 그것을 알리에게 돌려준 아이들의 푸념의 심정이라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았더라면 21세기 정신혁명의 한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이 위대한 발견이 흔적 없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 알리는 아이들이 돌려준 코덱스를 터번을 풀어 두루루 말아 등에 메고 어깨를 둘러 가슴에 잡아맸다. 그리고 낙타에 올라타 터덜터덜 다시 알카스르로 향했다. 그 순간 알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나는 인류사의 한 희ㆍ비극이 교차되는 그 운명의 장소를 꼭 찾아가서 두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관광 코스로 지정되어 있는 국립공원을 벗어날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나는 룩소르 경찰청에 신청서를 냈다. 그리고 이틀이나 기다렸다. 겨우 허가가 떨어졌다. 무장한 경찰차가 우리를 앞뒤로 호송했다. 우리 일행 6명이 나타나니깐 나머지 54명은 어디 있느냐고 했다. 경찰청은 한국인 관광객 60명이 게벨 알 타리프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60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허가가 떨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60명의 호송 비용을 나 혼자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가는 함라돔(Hamra Dom)은 특별 분쟁지역이며 엊그제도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했다. 대통령 무바라크도 안 가는 곳이라 했다. 룩소르를 출발해서 검문소마다 그 지역 경찰들이 차를 갈아탔다. 내 차에는 사복경찰이 한 명 올라탔다. 그 지역 지리에 밝은 그 지방 사람이었다. 우리 차가 알카스르에서 에즈발 부우사라는 작은 동네를 거쳐 드디어 함라돔에 도착했을 때 사복 경찰은 허리에 찬 권총을 꺼내더니 안전핀을 풀었다.
“왜 그러슈?”
“가까이 오면 가차없이 쏴 버릴 겁니다.”
![[오늘의 운세] 5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