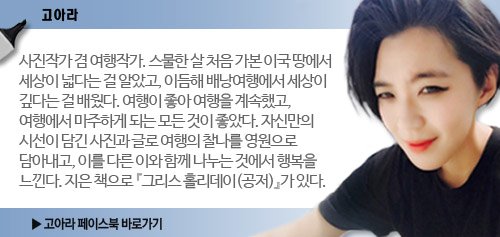겨울만 되면 내복을 꺼내 입던 유년시절에는 밤이 오는 것만큼 신나는 것이 없었다. 거의 매일 밤 행해지던 은밀한 모험 때문이다. 대게는 부모님이 집안 불을 끔과 동시에 작전은 시작되었다. 침대에서 슬그머니 기어 내려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장소물색. 보통 붙박이장을 개조해 만든 책상 밑이 유력한 후보였다. 일단 장소를 정하면 의자나 선반을 지지대로 두고 이불 하나를 질질 끌고 와 그 위에 걸쳐 천막을 쳤다. 그리고 나면 베개와 손전등을 옆구리에 끼고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주로 그 안에서 했던 일은 동화책을 부여잡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미지의 공간을 탐닉하는 것이었다. 눈을 감고 시계 초침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는 폭포로 커튼을 친 신비로운 산골짜기 속 동굴 안에 누워있었다. 이불 텐트 틈으로 보이는 천장의 야광스티커는 진짜 별이 되어 쏟아져 내렸다. 그러나 이 순수한 모험도 내복을 거부하는 나이가 되면서 끝이 났고, 텐트 속의 낙원도 영영 잊혀졌다.
웨스트피오르의 딘얀디(Dynjandi) 폭포로 가는 길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유년의 모험심을 끄집어내 주었다. 폭포로 가기 위해서는 험준한 산길을 지나야 했는데, 산길 초입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질 무렵이었다.
좁은 비포장도로는 한번 진입하면 돌아서기가 여간 쉽지 않아 보였다. 계속 가야 하나 망설여졌지만, 길옆에 서 있는 조각상의 서늘한 얼굴과 음산하게 흐르는 계곡물 소리는 딘얀디 폭포에 대한 상상력을 부추겼다.
저 깊은 산자락 뒤에 숨겨진 폭포에 가면, 오래 전 이불 텐트에서 조우했던 비밀스러운 공간이 다시 펼쳐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불을 들쳐 메고 책상 밑으로 전진하던 어린 날의 밤처럼, 비장하게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딘얀디 폭포로 가는 길에 만난 풍경은 거칠고 순수했다. 빙하가 산을 깎아 내리며 조각한 골짜기는 깊고 넓었다. 비탈진 경사면에서 근원을 알 수 없는 크고 작은 물줄기들이 여러 갈래로 쏟아져 나왔다.
산 정상에 오르자 용의 발가락처럼 늘어선 기다란 피오르 지형과 그 사이로 스며든 바다의 모습이 펼쳐졌다. 때마침 석양이 지면서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한 치의 꾸밈 없는 색으로 그려진 이 광경은 한 눈에 담기 버거울 정도로 광활했다. 잠시 넋을 빼앗겼다.
그새 땅거미가 내려앉고 있었다. 구불구불한 내리막길을 서둘러 내려왔다. 산기슭에 다다르자 드디어 폭포가 모습을 드러냈다. 곡벽의 꼭대기에서부터 시작된 물줄기는 100m를 낙하하며 7개의 폭포, 즉 딘얀디를 만들어냈다.
그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폭포, 피얄포스(Fjallfoss)에 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등산이 필요했다. 손전등으로 앞을 밝히며 돌길을 15분 정도 올랐다. 눈앞에 나타난 폭포의 모습은 마치 여인의 청아한 뒷모습 같았다. 아래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형태였는데, 하얗고 부드럽게 내리는 물결이 흡사 동화 속 ‘라푼젤’이 늘어뜨린 긴 머리카락 같았다.
폭포 옆 바위틈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왠지 모르게 아늑하고 따뜻했다. 눈을 감고 딘얀디의 신비로운 소리를 음미했다. 유년기에 책상 밑에서 상상하며 그리던 낙원이 실재한다면 이곳일 것이 분명했다. 훌쩍 커버린 나는 꿈꾸던 바로 그 장소에 앉아 어린 시절의 추억을 오랫동안 곱씹었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는 별 모양 야광 스티커가 아니라, 진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