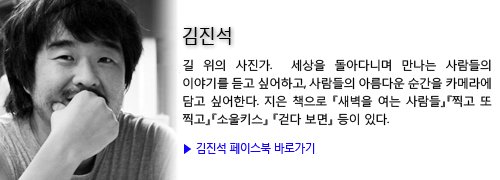EBC(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트레킹 2회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고요한 새벽이다. 일행들의 짐 싸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린다. 늦잠을 자서 허둥대는 사람들. 잠을 거의 못 잔 듯 계속 하품을 하고 있는 사람들. 표정들은 약간 긴장되어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 간단하게 카고 백에 짐을 챙기고 빵과 커피로 아침식사를 마쳤다. 나의 바람과는 달리 날씨가 너무 좋아 루크라 공항까지 가는 비행기가 아무 문제없이 운행한다.
카트만두에 있는 국내선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라고 하지만 영 불안하다. 작고 볼품없는 형체, 이게 과연 뜨기는 뜰까? 약 2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작고 아담한 비행기. 허리를 숙여 비행기를 탔다. 이 작은 비행기에 여 승무원까지 있다. 출발 전 솜뭉치와 사탕 몇 개를 준다. 내가 타본 비행기 중 최고(?)의 기내 서비스인 셈이다. 사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솜뭉치는 왜 줄까? 앞자리에 앉았던 심샘이 간단하게 솜뭉치의 사용법을 가르쳐준다. 귀를 막는다. 엔진 소리가 너무 크다.
난 그 어느 때보다 안전벨트를 꽉 조여 메고 아무 말 없이 담담하게 창밖만 바라본다. 사실 무지 떨고 있다. 서서히 움직이는 비행기. 그러더니 어느새 카트만두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높이로 떠 있다. 어제 공항에 도착할 때는 어두운 밤이어서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촘촘하게 작은 건물들과 사원들이 눈에 들어온다. 멀리서 출근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보인다. 제법 규모가 큰 도시다. 아침 햇살을 받아서인지 도시의 느낌이 따스하다.
그리 높지않는 고도로 비행기는 날아가고 있다.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밭들과 꼬부랑 이어진 길들. 간간이 보이는 사람들까지, 꼭 우리네 시골 풍경이다. 비행기가 한참을 날더니 더 큰 엔진 굉음소리가 난다. 목적지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비행기가 방향을 바꾸니 저 멀리 하얀 눈으로 만들어진 병풍 같은 히말라야가 눈에 들어온다. 마치 작은 언덕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는 산. 저 산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히말라야다. 인간의 욕심이 없었다면 미지의 세계로 남았을 산. 여기 사람들은 신들이 살고 있었다고 믿는 산, 히말라야다.
지금 나는 산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들이 그려 놓은 그림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도저히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풍경이다. 이것을 사진으로 담으려고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 멀리 보이는 풍경만으로 나는 이미 압도되었다.
한눈에 들어오는 루크라 공항. 해발 2800m가 조금 넘는 곳으로 백두산보다 높다. 이 공항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다. 절벽 위를 깎아 만든 활주로는 거리가 채 200m 정도밖에 안 된다. 짧은 활주로와 바람 때문에 이착륙 시 사고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공항이다. 우리를 태운 비행기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에 매우 안전하게 잘 착륙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갑자기 몸이 이상해졌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숨이 꽉 막힌다. 몸은 붕 뜬 느낌, 머리는 무언가 짓누르는 듯하다.
고산병.
일반 사람들의 경우 갑자기 높은 지대에 오면 생기는 현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의의 일행들을 살펴보니 다들 상태가 좋아 보인다. 나만 그런 거 같아 말도 못하고 숨을 자주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하며 간신히 출발점에 섰다.
우리는 일행들의 걷는 속도와 상태를 고려해 팀을 나눴다. 히말라야 여행사 최영국 대표와 심산 선생님을 위주로 1진이 꾸려졌고, 나머지 사람들은 2진이다. 난 사진반 수업을 듣는 제자와 말진으로 섰다. 상태를 고려한 것도 있고 사진을 찍기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 뒤에 셰르파 ‘짱가’가 있다. (아주 잘 생기고 키가 큰 셰르파다. 우리 셋은 이후 내려올 때까지 동행하게 된다. 원래 이름은 정거인데 별명을 부르기로 했다. ‘짱가’ 라고.)
1진이 출발하고 2진도 바로 출발했다. 그리고 우리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칼라파타르. 검은 산이라고 불리는 칼라파타르는 히말라야에서 일반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산이다. 고도는 해발 5550m.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고 걷기만 된다.
30분 정도 걸었을까, 루크라 마을을 빠져나오는 즈음 문제가 생겼다.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생겼던 두통이 더 심해졌다. 숨은 더 가빠졌다. 발걸음 하나하나 옮기는 게 고통스럽다. 속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다 있나’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평소 운동도 안 하고 등산도 안 했다지만 제주올레며 스페인의 카미노를 누볐는데. 일명 ’걷는 사진작가‘라는 내가 몸이 좋지 않다 보니 아름다운 풍광도, 사람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무엇보다 제대로 사진을 찍지 못해서 마음이 무겁다.
일단 응급 처치로 두통약을 먹었다. 걸음은 평소 걸음보다 더 느린 속도로 간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 정도의 걸음 속도는 제주 올레에서 봤던 그 달팽이 걸음 수준이다. 이 고산에 적응하는 것이 우선이다. 카메라를 든 손의 감각은 이미 사라졌고 무겁게 느껴지기만 한다. (지금 와서 고백하지만 이날 찍은 사진의 70% 이상이 흔들렸다.)
그 상태로 한참 걷다가 앞서 출발했던 본진에 합류했다. 점심을 먹기 위해 1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우리를 보더니 무척이나 안쓰러운 표정이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나 역시 내가 참 안쓰럽다.
일단 몸 상태를 회복하는 방법을 찾는 게 급선무다. 이곳의 유경험자인 최 대표와 심샘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최대한 천천히 걷고 필요하면 약을 먹으라는 게 전부다. 고산병에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한다.
약이라는 것도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그리고 비아그라.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라. 고도가 높아지면 산소가 부족해진다. 부족해진 산소를 몸 전체로 빨리 전하기 위해 혈관 확장제인 비아그라를 먹기도 한다.
문제는 내가 상비약을 전혀 챙겨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말 대책 없다. 히말라야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 우선 일행들에게 약을 구걸해 먹고, 한참을 쉰 다음 걸음을 옮겼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첫날이라 롯지(산장)까지는 그리 멀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그리 멀지 않다던 롯지는 보이지 않고 어느덧 히말라야에 해가 지고 있었다. 비교적 짧은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몸 상태로 더딘 발걸음이 계속되었다. 마음이 급해졌다. 해가 진 상태에서 길을 걷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다. 속도를 내보려고 하지만 앞으로 달려가는 마음과는 달리 내 다리는 여전히 달팽이다.
해가 지고 난 후 한참을 지나 기진맥진해서 롯지에 도착했다. 심샘이 롯지 앞에서 우리를 맞이해 준다. 딱 봐도 걱정스런 표정이다. 아무 말 없이 짐을 풀고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찍 숙소로 들어가 침낭을 덮고 누웠다.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얗다. 이런 상태로 계속 걸을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온몸을 더 긴장시키고 있다.
참고로 고산병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머리를 감지 말라고 한다. 물론 세수와 발 씻는 것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한다. 이유는 모르겠다. 단지 경험에서 나온 건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지는 모르겠다. 귀찮은데 씻지 말라고 하니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본다. 머리가 아픈 탓에 잠도 오지 않는다. 오늘 밤은 길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히말라야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


![[오늘의 운세] 5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