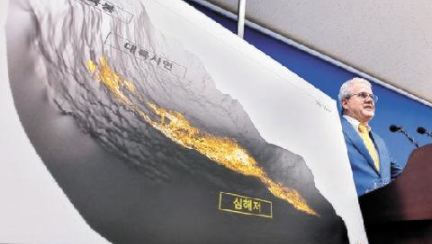'갑진년(1724년) 6월 29일. 아침 10시 (아내를) 도저히 살리지 못해 삶을 마치게 했으니 참으로 슬프다.'
'6월 30일. 내동(친척 이름)이 시신을 염습했다. 이게 꿈인지 사실인지. 대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약 300년 전 부인을 홀연히 떠나 보낸 선비의 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지난해 10월 대구의 고서점에서 발견된 일기 『갑진록』이다. 2년 뒤 5월 1일 기록이 끝난 날까지 아내를 그리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애틋한 사부곡(思婦曲)이다.
일기는 전남 보성에 살았던 임재당(任再堂·1678∼1726)이란 선비가 한문으로 반듯하게 써내렸다. 이를 찾아낸 조원경(58) 나라얼연구소 이사장은 부부의 날인 21일을 앞두고 번역을 마친 뒤 20일 번역본을 공개했다.
선비는 아내를 염습한 날 부부가 함께 했던 18년을 돌아보며 아내를 추억한다. '집사람은 1683년 계해 정월 초하룻날 밤12시쯤 태어나 42살에 세상을 마쳤다. 마음이 아름답고 행동이 단정하며 말이 적고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못하는 게 없었다. 부부 사이에 서로 공경함은 언제나 똑같았다…두 해 동안 내가 병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때 아침 저녁 쉼없이 병을 고치려고 간호했다. 그때 주위 사람들에게 "하늘이 나를 돕는다면 반드시 남편보다 나를 먼저 데려 가라"고 했다….'
선비는 복받치는 슬픔을 한시(漢詩)로도 표현했다.
'남은 한은 너무 슬퍼 끝이 없고/병은 이리저리 다스렸지만 낫지 못했구려/당신 죽게 된 건 모두 나 때문이니/이제는 모든 걸 저절로 잊고 싶구려.' 일기 가운데 쓴 애도시엔 '약을 써도 낫지 않음을 슬퍼하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또 '책상 위에 농 한 짝, 시렁에 놓인 함/시집오는 그날 함께 가져 온 것/함과 농 그대로이나 주인 없으니/볼 때마다 큰 슬픔 참지 못하겠네'라는 시 등 100편을 지었다.
해가 바뀐 을사년(1725)에는 이런 일기를 적었다. '꿈에 어머니도 보고 또 집사람과 함께 슬픔을 서로 나누고 크게 울다가 깨어 보니 벌써 새벽 닭이 울었다'. 조촐한 제사를 송구스러워하는 내용도 나온다. '초하루와 보름 제사가 다가올 때마다 홀아비로서 넉넉하게 되지 않으니 슬픔을 어찌하겠는가.'
한해가 더 지난 병오년(1726)에도 그리움은 크게 다르지 않다. '며칠 계속 꿈에 집사람을 보았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지막에는 '집안이 모여 큰형님 셋째 아들을 양자 삼기로 했다'고 했다. 그 순간에도 '집사람이 어떻게 (양자를) 생각할지 알지 못해 슬프다'고 아내를 떠올린다. 그러고는 7월 11일 임재당도 아내 곁으로 떠났다. 임재당의 양자는 무과에 합격했고, 손자는 과거에 급제해 정육품 이조좌랑에까지 올랐다.
경산=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
![[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