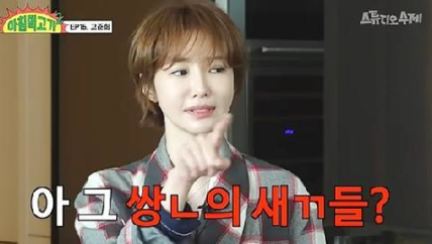정부미 가격의 인상은 이미 예고되어온 것이지만,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설명이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어야했다.
농수산부는 풍작으로 인해 산지 쌀값이 정부의 추곡 수매가를 훨씬 밑돌고 있기 때문에 정부미가를 올려서 쌀값의 안정을 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산지쌀값의 하락을 막는다는 이유는 얼핏 납득이 갈 것 같으나 시장수급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보다는 양곡특별회계의 적자누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미가 인상이 불가피하고 시기적으로는 쌀값이 떨어지고 있을 때가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충분히 말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안정세에 있으므로 정부미가 인상의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을것이라는 얘기를 제시해야 옳았다.
정부미가는 81년12월에 2.9%(상품미) 에서 4.7% (혼합곡) 를 올린 이후 2년동안 동결되어 왔다고 농수산부가 주장하고 있으나 작년 10월 추곡 수매가를 7.3% 올리면서 보리쌀 값과 함께 혼합곡도 12%가량 올렸었다.
그러면서도 양특적자는 계속 늘어왔으므로 이제 소비자 부담을 늘려서라도 적자축소에 임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온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양특적자의 누증은 정부 재정운용에 「아킬레스의 건」이 되고 있다.
수매가 인상과 시장가 안정이라는 이중곡가제가 낳은 양특적자는 70년의 28억원에서 82년에는 1조2천4백82억원으로 엄청나게 불어났다.
올해에는 하·추곡수매가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2천억원 가령의 적자가 더 생겨서 양곡적자 누계는 1조5천억원에 이르리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양특적자는 한은차입에 의존하여 꾸려가고 있으므로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에 크나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양곡 방출가 인상은 앞으로도 계슥될 소지가 남아 있다.
지난날 뒤로 미루어온 빚이 점점 감당해낼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양곡생산 정책이나 곡가정책은 이제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시기에 와있다고 판단된다.
종전의 방식을 답습한다면, 양특적자는 불어 날대로 불어나서 곡가지지정책에도 한계를 가져오고 소비자의부담 완화에도 역시 한계를 가져오게 된다.
그같은 딜레머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수단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실행에 옮겨야할 전환점을 마련해야한다.
장기적으로는 이중곡가제를 폐지하고 시장수급 동향에 따라 곡가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곡가조절용 양곡을 확보하여 시장가격을 조절하면 된다. 곡가가 하락할 때 정부가 사들이고 상승할 때 파는 방식을 고려하라는 것이다.
농가는 수확기에 대량 출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 정부가 농가와 협의하여 출하를 조절토록 양곡보관에 힘을 빌려주거나 출하조절 자금을 대여하거나 하면 족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농가의 영농자금 상환을 조정하여 일시 출하를 막아야 한다. 그래야만 곡가의 연중 평준화를 기할 수가 있다.
이번 정부미가 인상과 정부미 소비촉진 대책은 이율배반적이기도 하다.
정부미를 소화하는 대응책이 별도로 강구되어야만 물가안정 위협을 무릅쓴 정부미가 인상의 뜻이 살아난다.
가계의 정부미 소비지출을 늘리도록 호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