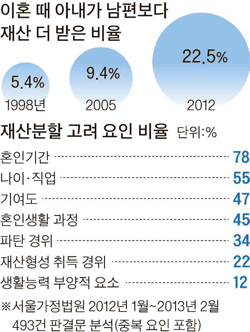
전업주부인 A씨(52·여)는 공무원이었던 B씨(56)와 1986년 결혼했다. 슬하에 1남2녀를 둔 부부는 다툼이 잦았다. B씨는 자주 외도를 했고, A씨와 자녀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2011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결혼생활을 지속할 마음이 없었던 남편 B씨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올 초 1심 판결문을 받아들게 된 그는 큰 낭패를 봐야 했다. 법원이 A씨와 B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7대 3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재판 당시 A씨는 재산이 은행예금 3만5000원밖에 없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 2억7000여만원 중 1억9000만원을 A씨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산에 대한 기여도, 나이·직업, 이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B씨는 연봉 6000만원을 받고 있는 데다 향후 퇴직연금 수령도 예상되지만 A씨는 암 수술을 받은 큰딸과 대입 시험을 준비 중인 아들을 별다른 수입 없이 홀로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사례처럼 이혼 사건에서 남편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재산을 가져가는 아내들이 7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1991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재산분할제도가 불러일으킨 변화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전경근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1~2일 개최된 서울가정법원 개원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최근 판례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가정법원이 판결한 재산분할 사건 493건을 과거 자료와 비교분석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재산분할 시 아내에게 50% 넘는 비율을 인정한 판결은 지난해 22.5%로 크게 늘어났다. 98년엔 5.4%, 2005년에는 9.4%에 불과했다. 절반인 50%를 인정한 판결도 2005년 29.9%에서 37.4%로 늘었다.
송 연구위원은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과거보다 여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라며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면서 가정 내 경제적 기여도가 커지고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뀐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들의 판결 경향이 바뀐 점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재산분할제도 도입 초기에는 법관들이 남편의 재산비율을 100%로 정하고 아내에게 조금 나눠주는 식으로 비율을 정했다. 하지만 근래엔 초기 값을 남녀 각각 50%로 정하고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했다.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1990년대만 해도 남편이 경제권을 가진 만큼 재산은 남편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근래 들어서는 전업주부라 해도 여성의 가정 내 공헌도를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쪽으로 인식이 변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제도가 이혼 후 당사자들의 생계까지 고려해주는 부양적 의미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성격이 변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김진옥 가정법원 공보관은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청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대방에 대한 부양 의미까지 감안해 판단하는 경향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재산분할 때 고려 요소로는 ‘혼인기간’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전체 사건 중 가장 많은 78%의 판결에서 언급됐다. 함께 산 기간이 길수록 여성에 대한 인정 비율이 높아졌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보다 맞벌이나 부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인정됐다.
박민제 기자
![은퇴해도 월 300만원 꽂히네…"한국서 가장 부유한 세대 온다" [860만 영시니어가 온다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1/6164bf75-f38e-4fd7-80ab-135806d5a6da.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