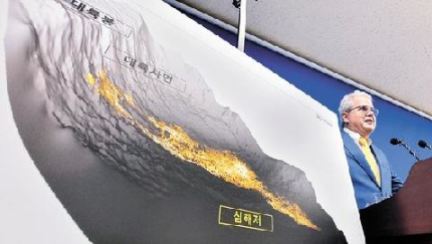대학의 졸업「시즌」이 다가왔다. 올 봄엔 3만4천 여명의 학사가 배출된다. 사회는 신선한 바람을 맞아들이는 활기마저 있어 보인다. 어느 직장이나 이맘때면 신입사원이 활보하고 있다. 젊은이의 정기에 넘친 표정들은 이 사회의 생명감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만큼 이들 대학 졸업생에게 큰 기대를 갖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아직 신생국이며 또한 후진국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은 우선 옆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사회가 요구하는 최고의 가치와 기준은 딴 데에 있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는 이들의 보답을 바라는 만큼 희생까지도 요구한다. 급료가 탐탁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가족은 가족대로 이들에게 무엇인가 짐을 지워 주려고 한다. 그것은 교육비의 무거운 부담이 준 어쩔 수 없는 인과의 관계일 것도 같다.
이때에 대학 졸업생은 계관의 기쁨도 가시기 전에 역겨운 고민과 두통에 직면해야 한다. 한 노학자는『오늘의 청년도 이 노성한 현실주의자들보다 더 현실 위주라면 확실히 세상은 변했다』(월간 중앙 3월호)고 개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취직」이란 서양류로 말하면 일직의 사회적 소명이다.『신이 부른다』는 의미(vocation) 그대로이다. 양의 동서를 부문하고 그 원리는 같다.「취직」이란 용어는 중국 이밀의「진정표」에서 처음 쓰여졌다. 이밀은 1천6백여 년 전 진나라 사람이다. 그는 황제·군주가 부른다는 뜻으로 이 말을 사용했다. 오늘의 민주주의 시대에는 바로 시민사회가 이들을 부른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 생활의 종착역이 취직인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비록 원천적인 문제이지만, 쉽게 고민하고 쉽게 희열에 넘치는 것은 지식인의 금도는 아닌 것 같다. 사회는 마땅히 우리가 기여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선비들이 이룩한 결과이기도 하다.「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가 출현했던 중세의 합리주의만으로는 오늘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의 시대는 합리주의 시대에서 과학의 시대로 전환하는 일대 전기에 기울고 있는 것을 다 같이 실감한다.
과학 시대의 한 면이 갖고 있는 특징은 단순 지성의 시대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창조적 다양성이 풍부하게 요구되는 지성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고전적인 사고방식, 인습에 의존하는 가치관으로는 이사회에 발 디딜 곳이 없을 것이다. 실로 새 학사는 새 사람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약 처방 맘에 안들어" 의사 찌른 환자…강남 병원 발칵](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a700cdd6-0b9e-4758-b8dd-276b7c6e93b2.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