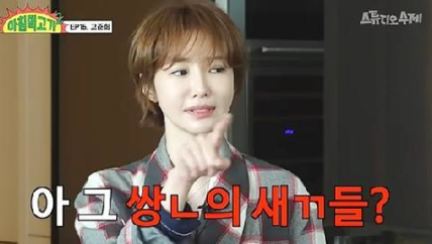봄에는 꽃이요, 가을엔 달이라.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때 흔히 춘화추월(春花秋月)이라 한다. 봄에는 지상 가득 만발한 꽃에 취하지만, 가을엔 하늘 높이 뜬 달에 매료되는 것이다. 봄에는 봄대로, 가을엔 가을대로 나름대로의 정취가 있다. 누가 더 낫다고, 또 누가 더 아름답다고 말하기 어렵다. 춘란추국(春蘭秋菊)은 바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때 쓰는 말이다.
봄의 난초와 가을의 국화는 제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봄과 가을을 대표하는 아름다움으로 자신들을 뽐낸다. 그야말로 호각지세(互角之勢)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봄과 가을을 빗댄 말 중 춘와추선(春蛙秋蟬)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봄에는 개구리처럼 개굴개굴 울어대고 가을에는 매미처럼 맴맴 우는 게 여간 시끄럽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언론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라니 언론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낯이 뜨거워진다.
그나저나 추석(秋夕)이 지난 지 한 달 가까이 되니 바람이 차가워지며 가을이 꽤 깊어졌다. 거리에 뒹구는 낙엽을 보고 있자니 나도 몰래 ‘나뭇잎 하나 떨어짐에 천하가 가을인 것을 안다’는 ‘일엽낙지천하추(一葉落知天下秋)’라는 말을 되뇌게 된다. 짧게 말해 ‘일엽지추(一葉知秋)’다. 회남자(淮南子) 설산훈(說山訓) 편에선 ‘산적 한 점을 맛보고 가마솥 안의 고기 맛을 다 알고, 깃털과 숯을 걸어 놓아 방의 건조함과 습함을 안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런 낭만적인 읊조림도 잠시다. 무어라 메우기 어려운 쓸쓸함이 가슴을 솔솔 파고 든다. 이제 겨울도 머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에서다. ‘한래서왕추수동장(寒來暑往秋收冬藏)’이라고 했다. 추위가 오면 더위는 가니, 가을에는 거두어들이고 겨울에는 재워 놓으라는 이야기다. 문제는 거둘 게 없는 이들이 동지섣달 긴긴 겨울을 어떻게 날까다.
이럴 때는 또다시 회남자(淮南子)의 설림훈(說林訓) 편에 나오는 ‘임하선어불여결망(臨河羨魚不如結網)’의 교훈을 새겨야 한다. ‘물가에서 고기를 부러워하며 우두커니 서 있는 것보다 얼른 집으로 돌아가 그물을 짜는 것이 낫다’는 말이다. 가을이 끝나고 초겨울을 맞기 전에 겨우내 살림 채비에 들어가야 한다. 그 준비에 추호(秋毫)의 게으름도 있어선 안 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