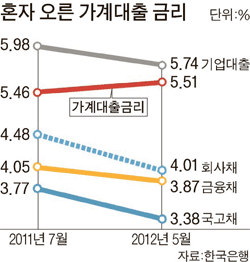
중소기업 A사의 대표는 지난해 말 대출금 만기를 연장하러 B은행에 갔다 얼굴만 붉히고 왔다. 회사 신용등급이 ‘C1’에서 ‘B3’로 올라 대출금리가 내려갈 줄 알았지만 은행에선 예전 금리인 연 8.2%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표준 금리’에 지점장이 재량으로 정하는 ‘전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22일 감사원·금융감독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B은행은 A사의 표준 금리가 낮아져 금리를 내릴 수 있었지만, 수익성이 나빠질까 봐 전결금리를 예전보다 높이는 식으로 대출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권의 ‘바가지’ 금리 장사가 도마에 올랐다. 보통예금 금리를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낮은 0.1%로 유지하는가 하면, 서류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기려는 사례까지 나왔다. 그간 은행권의 행태를 감안하면 최근 불거진 CD금리 담합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만기 연장 대출 520만7000건을 조사한 결과 A사처럼 전결금리를 높게 적용해 금리가 높아진 사례는 9.7%에 달했다. 이 제도를 이용해 덧붙인 가산금리는 평균 0.85%포인트나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를 낮출 때는 한도가 있지만, 금리를 높일 때는 한도가 없어 8%포인트까지 가산금리가 붙기도 했다”고 전했다.
남대문 경찰서는 최근 대출계약서 원본에서 상환기한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국민은행 모지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초 대출계약서 원본은 만기가 ‘3년’으로 적혀 있었으나, 해당 은행은 ‘3’의 아랫부분을 칼로 긁어내 ‘2’로 바꾸고, 뒤에 ‘2개월’을 적는 수법으로 대출 만기를 ‘3년’에서 ‘2년2개월’로 바꿨다. 이런 조작은 국민은행 다른 지점에서도 저질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의 상환시기를 앞당겨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한 지점에서만 30여 명 정도가 서류 조작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연 0.1%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은행 보통예금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거세다. 은행권에서는 고객이 언제든지 보통예금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년 가까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보통예금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인다. 이런 보통예금은 국내 은행 전체 수신의 약 10%를 차지한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는 “한국의 기준 금리가 3%대인 점을 감안하면 0.1%의 금리는 턱없이 낮은 셈”이라며 “산업은행 등이 연 2~3%의 금리를 주는 상품을 선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금리를 올릴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금리 ‘바가지’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개인에게 주로 돌아간다. 최근 1년 새 금리가 내려도 되레 가계대출 금리가 오른 것이 그 단적인 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금리는 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7월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덕분에 기업대출 금리는 지난해 7월 5.98%에서 올해 5월 5.74%로 낮아졌다. 하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5.46%에서 5.51%로 되레 올랐다. 기업대출 금리는 금융채 등에 연동돼 시장금리를 반영하지만, 가계대출은 CD금리에 연동된 대출이 많다 보니 CD 금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덩달아 금리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한 셈이다. 여기에 금리 변동주기가 CD금리는 3개월, 코픽스는 6개월 등으로 길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한국 은행산업이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한 과점 형태이다 보니 소비자 불신을 사고 있다”며 “이런 과점은 최근 불거진 담합 등의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퇴해도 월 300만원 꽂히네…"한국서 가장 부유한 세대 온다" [860만 영시니어가 온다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1/6164bf75-f38e-4fd7-80ab-135806d5a6da.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