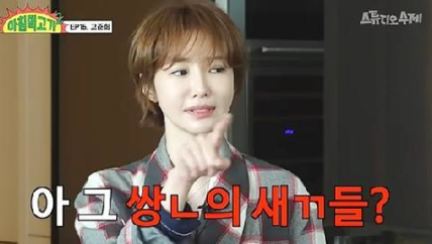독일 사진가 토마스 스트루스가 2007년 수도권에서 찍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사진. 초고층 콘크리트 건물이 괴기한 느낌마저 준다. [갤러리 현대 제공]
건조하기 짝이 없다. 심심하고 무표정하다. 거대한 사진에 드러난 건 황량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이거나 성냥갑마냥 늘어선 컨테이너 박스다. ‘표현 없는 표현’의 역설일까. 독일 사진가 토마스 스트루스(56)가 지난 3년간 찍은 한국 사진을 선보이는 ‘코리아 2007~2010’전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매몰돼 영혼이 사라져버린 땅을 보고하는 자리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과 일터가 저런 곳이라니, 새삼 진저리 치게 된다.
남과 북 오가며 작업
18일엔 특별강연회도
독일 사진작가 토마스 스트루스
17일 전시개막을 앞두고 15일 오전 서울 사간동 갤러리현대 전시장에서 만난 스트루스는 단순 명료한 사진과 달리 말이 꽤 긴 작가였다. 남과 북 모두를 방문한 뒤 “분단국의 특수 상황을 외부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었다”고 밝힌 그는 ‘자연과 정치’가 자신의 핵심 주제임을 강조했다.
“북의 통제와 검열에 놀랐어요. 안내인의 지시에 따라야 했기에 제가 찍고 싶은 장소에서 자유롭게 머무는 것조차 불가능했어요. 남한의 아파트는 왜 그리 높고 한데 몰려 있는지요. 남과 북의 사정을 감안하면 앞으로 20년 뒤쯤엔 통일이 되지 않을까요. 한국인이 부지런하고 역동적인 건 좋지만 너무 과한 것은 아닌지….”
스트루스가 언급한 자연과 정치의 연결이란 이를테면 강원도 양양 바닷가를 둘러싸고 있는 경계 철조망이거나, 거제도 풍광을 압도하며 솟아난 육중한 네 개의 붉은 철주다. 사진에 드러나지 않고 모습을 감춘 사람들은 그 익명의 조형물 속에 함축된 채 욕망과 힘의 구조를 받치는 원소가 된다. 그는 기계문명과 테크놀로지가 인류를 어디까지 몰고 갈 것인가 사진으로 묻고 싶다고 했는데 그 사진이야말로 기계적 이성만 남아 더 징그럽게 느껴진다.
그는 20세기 후반, 이미지가 각광 받는 적기에 탄생한 사회·인문주의적 사진작업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그의 분석과 기록은 한반도를 모르는, 아니 알 수 없는 이방인의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는 내수용 사진가가 아니니 불평할 수는 없지만 내수 판매용이라면 좀 더 애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다.
전시는 내년 1월 9일까지. 18일 오후 3시 서울 대현동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스트루스의 특별강연회가 열린다. 선착순 150명, 02-2287-3500.
정재숙 선임기자
◆토마스 스트루스=1954년 독일 갤던에서 태어나 뒤셀도르프 미술대학에서 현대미술의 거장 게르하르트 리히터에게 회화를, 사진의 유형학파를 조성한 베른트와 힐라 베허 부부에게 사진을 배웠다. 세계 유명 문화유산과 박물관 등을 찾은 관람객을 대형 사진으로 잡은 ‘미술관 연작’으로 이름을 얻은 뒤 ‘천국 연작’ ‘인물 가족 연작’ 등으로 사진 값 비싼 스타 작가가 됐다. 최근 유럽과 미국, 아시아의 도시들을 소재로 한 ‘도시와 자연 풍경’ 작업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