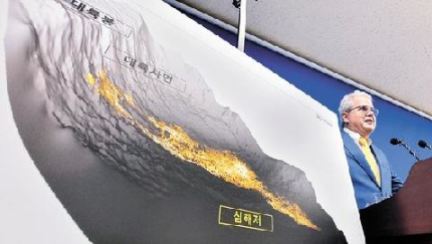지난달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쌀 분과위원회가 쌀 시장 조기 관세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 유야무야로 끝난 조기 관세화 논의가 재점화됐다는 점에서 일단 다행이다.
쌀 조기 관세화 논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관세화 유예를 대가로 일정량의 쌀을 5%라는 낮은 관세로 의무 수입하는 현 방식이 과연 쌀 산업-또는 쌀 생산 농가에 보탬이 되느냐, 아니면 2015년으로 예정된 관세화를 자진해서 앞당기는 것이 외려 나은가 하는 문제다.
우선 현 의무 수입제는 지난해 쌀값 하락이 보여주듯 분명한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쌀 수요가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난해 30만t을 넘어선 의무수입물량(TRQ)은 가격 붕괴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북한에 대한 쌀 지원 중단 때문 운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의도적 본말전도일 뿐이다. 문제는 현 구조상 이런 수급 불균형이 갈수록 커질 것이란 점이다.
2004년, 관세 유예화를 대가로 우리는 해마다 2만여t씩 의무수입물량을 늘려주기로 약속했다. 유예화 마지막 연도인 2014년에는 40만8700t의 쌀을 무조건 들여와야 한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조기 관세화다. 차라리 적정한 관세를 매기고 쌀 시장을 여는 게 외국 쌀로 인한 물량 압박을 덜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의무수입물량은 관세화 시점에서 동결된다. 관세화를 한 해 앞당기면 2만여t, 내년부터 관세화로 전환한다면 2015년 이후로 계속해 연간 8만여t의 물량 도입을 차단할 수 있다. 적어 보인다면 농산물 가격이 약간의 수급 변화에도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떠올리자.
사실 이 문제는 관세화 재유예란 부담을 떠넘긴 노무현 정부도 고민한 흔적이 있다. 최종 합의문에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다’는 권리를 확보한 걸 보면 말이다. 문제점이 다 드러난 이제, 하루라도 빨리 그 권리를 쓰는 게 옳다.
국내 쌀 시장 붕괴가 걱정된다면 쌀에 대한 국민적 정서에서 우리나 다름없는 일본의 예를 들고 싶다. 1999년 조기 관세화로 돌아선 일본의 이듬해 쌀 수입은 98t, 그것도 시험·시식용이었을 뿐이다. 이후로도 외국 쌀 수입으로 일본 쌀 산업이 흔들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어떤 정책이든 시간은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쌀 관세화의 경우 시간의 문제는 결정적이다.
박태욱 대기자
![[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