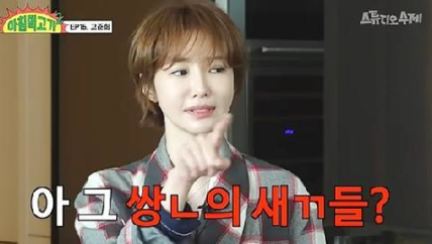시대가 변하면서 장묘(葬墓)문화도 바뀌고 있다. 서울의 경우 올 들어 처음으로 화장(火葬)의 비율이 매장을 앞질렀다는 소식이다.
전국적으로는 화장 비율이 아직 30%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화장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다.
수도권 지역 성인 남녀의 51.9%가 매장보다 화장을 원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1.2배가 묘지로 바뀌고 묘지면적이 국토의 5.2%에 달하는 현실에서 화장문화의 확산은 다행스런 현상이라 하겠다.
화장문화의 확산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주택가에 납골당을 지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본지 8월 23일자 2면).
건설교통부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납골당의 설치장소를 도시 외곽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한정했던 제한규정을 삭제한 데 따른 것이다. 납골당과 함께 화장장이나 공동묘지에 대한 설치장소 제한도 풀렸다.
법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일본 등 외국처럼 동네 안에 납골당이 들어서고 공동묘지가 조성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주택가에 납골당이 들어서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쓰레기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납골당이나 화장장을 어딘가에는 있어야 하지만 우리 동네에는 안된다는 '님비(NIMBY)' 현상의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직은 우리 현실이다.
납골당이나 화장장을 꺼림칙한 '혐오시설' 로 여기는 배경에는 죽음에 대한 어두운 이미지가 자리잡고 있다. 조상을 잘 모셔야 후손이 잘 된다고 믿으면서도 조상이 잠들어 있는 묘지나 납골당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란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도리는 없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불멸(不滅)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인정한다면 죽음은 걸치고 있던 외투를 벗어버리는 것처럼 가볍고 친근한 것이지 무거울 것도 거리낄 것도 없다.
가끔이라도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에게 인생은 희미하게 떠 있다 사라지는 새벽별이며, 세차게 흐르는 시냇물의 거품이며, 풀잎에서 증발하는 아침이슬이다.
움켜쥐면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덧없는 인생에서 탐욕과 질투는 설 자리가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 벗어놓은 외투의 흔적 앞에 꽃 한송이를 놓으며 삶과 죽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동네 안 지척에 있다면 고단한 세상살이에 그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배명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