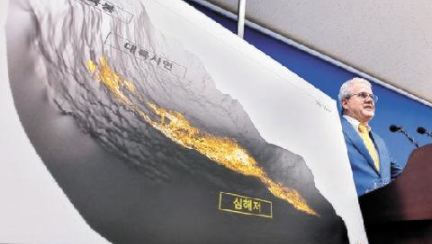18일 부산은 영하권이었다. “10월 28일 귀국하기 전 클리블랜드에서 사흘 내내 집 앞에 쌓이는 눈을 치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눈 이야기만 나와도 질렸죠. 이 정도 날씨, 정말 덥네요.”
20일 출국을 앞둔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왼손타자 추신수(26·사진)를 만났다. 올 시즌 94경기에 나서 3할9리의 타율, 14홈런에 66타점을 기록한 추신수는 지난해 왼쪽 팔꿈치 수술 뒤 6월부터 빅리그 무대에 나서 놀라운 상승세로 팀 타선을 이끌었다. “성공적인 시즌 아니냐”고 묻자 “성공요? 절대 아니죠. 제 꿈은 훨씬 더 크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는데.
“절대 아닙니다. 나한테 성공이란 클리블랜드 지역 또는 모든 미국 야구팬들이 ‘추(choo)’라고 들었을 때 ‘아! 메이저리그에서 이런저런 활약을 보였던 선수’라고 단박에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기억에 남는 야구 선수가 되는 것, 그게 내 성공이다.”
-올 한 해를 회고해 본다면.
“야구에 대한 자신감, ‘아, 이제 내가 메이저리그에서 풀타임으로 뛰는 선수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올 시즌 나름대로 활약한 것이 자신감 때문이었다면 좀 막연하긴 하다. 하여튼 긴 터널을 지나온 느낌이다. 내년 시즌엔 더 잘할 자신이 있다.”
-귀국하자마자 곧 출국인데, 그간 어떻게 지냈나.
“발리로 지각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부산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 매번 한국에 나올 때마다 잠이 부족할 정도로 만난다(웃음). 오면 온다고 환영회 해주고, 이제 가니까 또 환송회 나오라고 한다. 빨리 미국에 들어가야겠다. 예전엔 체중 110㎏을 훨씬 넘겨서 팀에 합류하곤 했는데 이번엔 100㎏을 안 넘겼다. 한국에서 술도 많이 마셨다. 그러나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 방울도 입에 안 댄다. 내년까지 음주는 이걸로 끝이다.”
-부인(25·하원미)과는 어떻게 만났나.
“2003년 겨울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 한눈에 마음이 끌렸다. 다음 날 바로 ‘사귀자’고 했고 허락을 받았다. 곧바로 시애틀(당시 소속팀) 마이너리그 캠프에 합류하며 살림을 꾸렸다. 급하게 오는 바람에 결혼식도 못 올리고…. 스물한 살에 미국으로 데려와 정말 함께 많이 울었다. 말도 잘 안 통하고, 내가 야구하러 나가면 (아내는) 혼자 있어야 되지 않는가.”
-많이 싸웠겠다.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 나를 잘 이해해 준다. (아내는)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싸움꾼’ 스타일인데 나한텐 정말 잘 해준다. 아내한테 항상 이야기한다. 내가 운동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잘 내조해 달라. 야구가 끝나고 나면 평생 뒷바라지는 내 몫이라고.”
-운동이 끝나는 날, 그날은 언제쯤인가. 메이저리그 이후의 계획도 생각해 봤을 텐데.
“일단 올해 둘째 계획이 있고(첫아이는 다섯 살 된 아들 무빈군. 아들은 던지고 치고, 부수고 이러고 노는데 딸도 있었으면 좋겠다. 미래 계획은 미련 없이 미국에서 할 만큼 야구를 하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 야구 롯데에서 뛰고 싶다(추신수는 2007년 해외파 특별지명으로 SK에 지명된 상태다). 미국도 야구장에 4만∼5만 명이 오지만 롯데처럼 열성적인 팬들은 없다.”
부산=김성원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