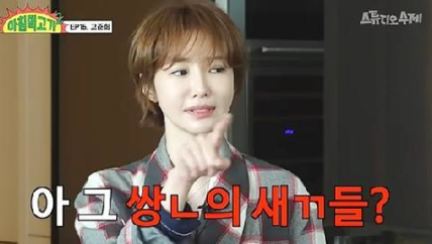이 같은 현실적 제약도 논의의 여지는 있으나, 이번 디자인은 한마디로 ‘무국적·무상징·무녹지’ 등 3무(無)가 그 특징이다. 어느 나라 건물인지부터 정체불명이다. 상징성도 희박하며, 쌈지공원 등 녹지공간도 없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당장 다음 달에 착공한다는 새 청사는 서울시와 문화재위원회 간에 다섯 번이나 벌어진 기 싸움의 결과지만, 고작 무정란(無精卵)의 기형이다.
인체로 비유하면, 처진 한쪽 어깨에 체적(體積)도 30% 감량됐다. 성냥갑 같은 재미없는 건축은 허가조차 하지 않겠다며 디자인을 강조했던 서울시가 모범을 보이긴커녕 ‘거꾸로 행정’의 표본이다. 어딘지 튀는 것 같으면 퇴짜를 놓는 듯한 문화재위원회의 예술관도 문제지만, 눈만 끌려는 튀는 건물 일색으로 도시환경을 물들이는 것도 시각공해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돌출’은 공감을 얻지 못해 진정한 개성이라 할 수 없다.
우선 공공건물은 공공성이 기본이다. 여기엔 그 지역 사람들의 정서뿐만 아니라 국가적 이미지도 반영된 국적 있는 정체성이 내포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모스크바 시 청사엔 러시아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고 도쿄 시 청사엔 일본 출신 건축가의 혼이 서려 있다. 유럽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다. 오래 전 왜색(倭色) 논란이 거셌던 부여 박물관의 경우도 국적 있는 디자인의 정체성이 문제였다.
둘째, 공공건물은 일반 오피스 빌딩과는 다른 외관이어야 한다. 그런 차별성은 건물의 미학적 상징성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직접적인 현시성보다는 건축의 특정 시각요소를 통한 암시성이 불러일으키는 연상작용을 가리킨다. 과거 전통이나 미래 이상을 형상화하는 자체가 상징성이다.
셋째, 건물 주변과 맞닿아 있든 중앙에 있든 공원 같은 녹지공간은 최우선 확보해야 하는 필수요소다. 콘크리트나 유리 같은 인공재료의 삭막함을 순화시키고 휴식공간을 배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좁은 공간이라도 녹색 공간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스위스나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신청사는 시민의 공감을 얻을 공공성이 빠져 있다. 김치나 된장 냄새 나는 한국의 수도 서울다운 디자인,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디자인, 인공과 자연이 조화된 시민 중심의 녹지 디자인 등이 퍼블릭 디자인의 최소한의 덕목이다. 승용차 이용을 억제한다고 주차 용량을 겨우 50대만 생각한 발상도 근시안적 안목이긴 마찬가지다.
거추장스러운 현 본관을 조상 신줏단지처럼 모신 주객전도의 결과가 ‘3무’의 원인일 수도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 새 청사는 주변정리부터 돼야 한다. 호랑이도 못 그리고 일그러진 생쥐만 남은 형국에 서둘러 첫 삽을 뜨는 일은 재고해야 한다.
그간 착공 지연과 추가 설계비용 등은 이미 낭비됐다. 1500여억원의 막대한 건립비도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 대처 전 영국 총리의 말처럼 ‘디자인하든지 그만두든지(Design or resign)’를 논의할 때, 서울시 신청사의 진짜 얼굴 표정이 제대로 드러날 것이다. 행정은 짧고, 예술은 길기 때문이다.
유한태 숙명여대 교수·디자인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