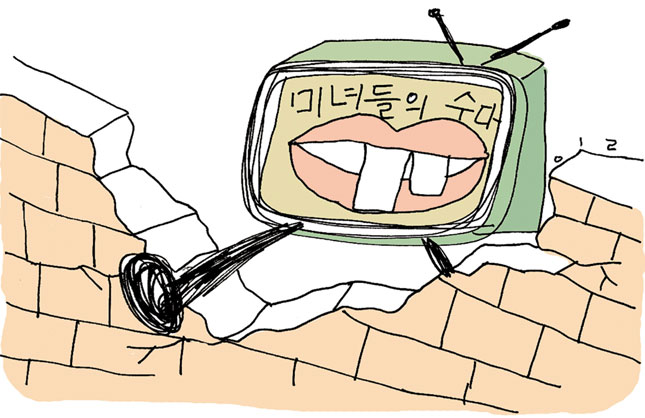 일러스트 강일구
일러스트 강일구 ‘미녀들의 수다’라는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짧은 치마 입은 여자들을 주르르 앉혀놓고 상대 패널로는 남자들만 모아놓는 포맷이라니. 한때 유행하던 유사 짝짓기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외국인한테까지 확대하려고? 그렇게 예쁜 여성 외국인 스타를 만들어 보려는 의도 아냐? 삐딱한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어눌한 말투로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는 점점 참신하게 들렸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니 이건 나름대로 방송사(史)에서 커다란 발전이라는 의미까지 찾게 됐다.
오래전부터 명절 때마다 우리는 주한 외국인들의 노래자랑 대회를 봐왔다. 한국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며 한국인의 몸짓을 흉내 내는 그들의 노력을 우리는 가상히 여겼다. 한국인과 결혼한 서양인들이 사투리를 능숙하게 쓰고 제사상까지 잘 차려낸다는 사실을 기특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시선은 분명 일방적인 것이었다. 한국에 온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의 영역에 안착한 그들을 칭찬하고 한국적인 문화에 얼마나 동화되었나를 지켜보고 기뻐하는 것이었다. 이런 시선에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들’은 반드시 두꺼운 테두리를 뚫고 들어와 ‘우리’의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는. ‘껍데기만 외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 다 됐어요’라고 해야 예뻐해 주겠다는.
인터넷을 하다 보면 종종 어린 세대들이 언제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폐쇄성을 키워왔나 싶어 깜짝 놀랄 때가 있다. 한국과 관련된 시비나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보이는 날카로운 반응과 독단에서는 ‘건드리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자폐적인 의식과 열등감마저 느껴진다.
그런 의미에서 ‘미녀들의 수다’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존중하겠다는 시도만으로도 한 걸음 전진한 방송이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우리가 자폐적인 모습에서 벗어났다는 성숙함도 보인다. 각기 다른 실력의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그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다른 시선을 가진 수많은 인종으로 이루어진 글로벌한 사회가 됐으며, 장벽을 뚫고 우리와 동화되지 않은 사람들과도 시선을 주고받으며 공존해야 함을 알게 된다.
물론 아직은 정색하지 않는 수다 정도로만, 문화적인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는 데는 한계가 뚜렷이 있다. 스타화되는 몇몇 출연자와, 인터넷에서 설화(舌禍)와 악플 공세에 시달린 출연자들이 몸을 점점 사리게 되면서 이야기는 점점 “한국 남자들은 털이 없어서 좋다”는 식의 무의미한 한국 찬양으로 흐를 조짐도 보인다. MC 남희석은 다소 논쟁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대화를 뚝 끊어버리니 깊이 있는 진전이 없다. 출연자가 ‘한국 남성들의 백인 여성에 대한 성적인 환상’에 대해 말을 꺼내는데 남성 패널이 ‘나는 아니다’라고 발뺌만 하면 ‘서로의 문화를 되돌아보자’는 의도는 싱거워진 채 개인적인 경험만 늘어놓는 여타 수다 프로그램과 다를 게 없어진다.
바라건대 ‘미녀들의 수다’는 제목처럼 수다가 더 자유분방하게 펼쳐졌으면 좋겠다. 가볍게 툭툭 던지는 그들의 수다 속에 폐쇄적인 우리 문화가 미처 보지 못했던 심각한 문제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해 나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아직도 더 많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
이윤정씨는 일간지 문화부 기자를 거쳐 영화 제작자로 활약한 문화통으로 문화를 꼭꼭 씹어 쉬운 글로 풀어내는 재주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