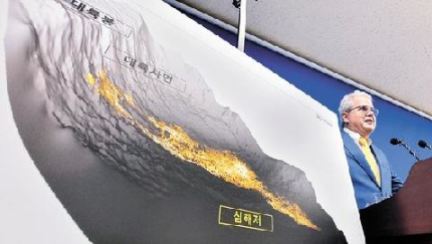남북 간 격차를 새삼 실감하면서도 한편으로 엉뚱한 생각이 든다. 밤낮으로 환한 도시 지역에 사는 남한 사람들은 이제 별 보기가 별 따기만큼이나 힘들어졌구나 하는 자각이다. 무슨 반(反)문명주의라도 부르짖자는 게 아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에게 별과 달은 해만큼이나 소중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라는 아이들이 안됐다. 어른에겐 그나마 어릴 적 추억이라도 있다. 칠흑 같은 밤이라도 반달이 떠 있으면 밤길이 한결 수월하다는 걸 요새 아이들은 알까. 달이 아까부터 자꾸만 나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겪어 봤을까. 휴가철에 찾는 관광지의 밤도 눈부시게 번쩍이는 조명에 점령당한 지 오래다. 우리는 이미 캄캄한 밤을 잃어버렸고, 그 탓에 초롱초롱하던 별들도 스러지고 말았다. 도대체 은하수를 본 게 얼마나 오래 전인가.
그나마 별들이 낮고 밝게 깔리는 곳은 인적 드문 들판이나 산이다. 더 찬찬히 별을 즐기려면 전국에 산재한 천문대를 찾으면 된다. 하지만 요즘엔 천문대들마저 빛(光)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영화 '라디오 스타'에 나오는 영월의 별마로 천문대는 국내 최대의 시민천문대다. 봉래산 허리를 휘감는 4.5㎞의 진입로에는 일부러 가로등을 세우지 않았다. 불빛은 천체 관측에 독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근 스키장에서 하늘로 쏘아대는 조명에는 속수무책이다.
전문적 관측보다 교육 기능이 더 강한 대도시 천문대라면 차라리 이해된다. 서울 광진구 시립청소년수련관의 천문대는 지상에서 45도까지는 관측할 엄두를 못 낸다. 주변 아파트와 상가 조명 때문이다.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대전시민천문대도 마찬가지. "특히 가로등 불빛 탓에 지상 30도까지는 관측이 힘들다"고 이 천문대의 임상순(38) 교육팀장은 말했다. 천문대를 위해 광진구의 야간 조명을 금지하거나 대전 시내 가로등을 끄라고 주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국내 최대의 1.8m 구경 반사망원경을 갖춘 영천시의 보현산 천문대는 인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측을 돕는 좋은 사례다. 산 밑 정각마을(별빛마을)의 가로등에는 모두 갓이 씌워져 있다. 밤하늘로 빛을 뿜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사설 천문대가 있는 횡성의 천문인마을은 1999년 동네를 아예 '별빛 보호지구'로 선포해 유명해졌다. 하지만 "여기가 무슨 그린벨트냐" "별만 쳐다보다가 공장도 빌딩도 못 들어서게 할 셈이냐"는 일부 주민과 한동안 갈등을 겪어야 했다. 밤하늘이 좋아 97년 횡성에 정착, 천문인 마을을 조성한 서양화가 조현배(54)씨는 "요새 아이들에겐 '칠흑 같은 밤'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더라"며 "도시에서 온 아이들에게 일부러 캄캄한 밤길을 산책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 마을의 가로등에는 모두 스위치가 달려 있다. 천체를 관측할 때는 등을 끈다.
외국에서도 국제 어두운 밤하늘 협회(International Dark-Sky Association.IDA) 같은 단체가 야간 조명을 억제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안전 문제도 있으니 도시 조명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천문대에서라도 밤하늘을 마음껏 볼 수 있게 배려하자. 캄캄한 밤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밤하늘과 별을 안겨주자. 주민과 자치단체가 협조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마침 내일(17일) 밤 횡성 천문인마을에서는 별 찾기 대회(메시에 마라톤)도 열린다. 지금은 토성의 띠를 관측하기에 딱 좋은 때다.
노재현 논설위원
![[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