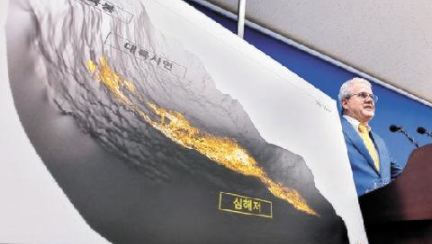전략전술과 정치공학은 격동과 위기 속에서 꽃핀다. 무력과 권력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역사 현장일수록 정치기술은 세련되게 발달한다. 춘추전국 시대의 29세 젊은 장군인 손자(孫子)가 내놓은 병법서(兵法書)도 어지러운 시대의 산물이다. 경험과 상상력이 만나 산출한 정치공학의 지혜는 2천5백년을 견뎌 왔다.
손자는 말한다."용병을 잘하는 자는 승리를 세(勢)에서 찾는다. 군대를 잘 싸우게 만드는 형세는 마치 둥근 돌을 천길 낭떠러지에 굴려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인재를 발굴해 맹렬하게 움직이게 하면 저절로 주변에 세가 붙는다."(병세편.兵勢篇)
중심세력을 만드는 일, 움직이게 하는 일, 가속(加速)을 붙여 세를 불리는 일. 이것이 손자가 제시하는 세를 키우는 세가지 방법이다.
국회에서 4당체제가 처음 형성된 1988년의 정치구도는 전례없는 혼미의 시대였다. 제1당의 총재였던 노태우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동의안이 3야당의 연합으로 부결되자 등에 식은 땀이 났다. 5년 임기 동안 식물 대통령이 될 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세 확산을 꾀했다. 제2당의 김대중 총재는 4당체제에 안주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방어적이었다. 제3당의 김영삼 총재는 스스로 중심이 돼 3당합당이라는 전무후무한 사건을 일으켰다. 천길 낭떠러지에 몸을 던졌다. 도덕적 명분을 버리고 절대적인 세 확산을 얻은 정치공학의 성공사례였다.
지금의 신4당체제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전보다 훨씬 심하게 국회에서 왕따당하고 있다. 그나마 있던 중심세력이 분열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감사원장 후보의 임명동의안이 그처럼 허망하게 부결되진 않았을 것이다.
4년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하는 그도 등에서 식은 땀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무당적 대통령'인 그를 위해 중심세력이 되어 줄 의원들은 별로 없어 보인다. 대통령은 말은 빠르지만 의원들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데는 무능한 것 같다.
중심세력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그가 설사 낭떠러지 모험을 감행한다 해도 정치적 세를 얼마만큼 불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기야 세 불리기 대신 뺄셈정치를 추구하는 盧대통령은 손자의 정치공학적 충고 따위는 우습게 여길지 모른다. 그는 차라리 천운을 믿고 있는 것 같다.
전영기 정치부 차장
![[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