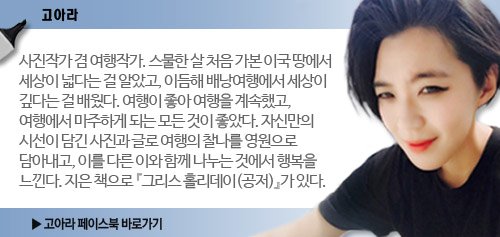밤새 폭우가 몰아쳤다. 새벽 내내 바람에 삐걱거리던 나무 울타리 대문 소리에 잠을 설쳤다. 눈 밑에 검은 주머니를 길게 달고선 하루를 시작했다. 부슬비가 내리는 오늘의 목적지는 피야드라글리유푸르(Fjaðrárgljúfur)라는 협곡이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협곡은 키르큐바이야르클뢰스투르(kirkjubæjarklaustur)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의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링로드에서 살짝 벗어나 206번 비포장도로를 타고 약 2㎞를 왔다.

공터에 차를 세울 때만 해도 나는 무심했다. 아이슬란드를 한 바퀴 도는 동안 크고 작은 협곡을 무수히 보았고 수없이 감탄했다. 그래서 협곡이 다 같은 협곡이겠거니 했다. 차에서 내리자 산속 깊숙한 곳에서나 느껴질 법한 서늘한 공기가 맨살에 닿았다. 왼편에는 라바 필드(Lava Field)가 광활하게 뻗어있고 오른쪽에는 거대한 언덕이 솟아 있었다.

협곡 입구에 도달한 나는 예상과는 다른 협곡의 모습에 다리가 풀리고 말았다. 양옆으로 펼쳐진 각양각색의 기암절벽은 길고 깊은 통로를 이루고 있었다. 그 사이로는 강이 구불구불하게 흐르고 있었는데, 그 형상이 마치 거대한 구렁이가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듯했다. 협곡의 내부는 나무 한 그루 없었지만 숲처럼 푸르고 정글처럼 울창했다. 굴곡이 심해 어디가 끝인지 보이지 않았지만, 한없이 깊은 것은 분명했다.

폭우에 강물이 제법 불은 탓에 협곡의 안을 걷는 것은 무리였다. 언덕 위로 나 있는 트레일을 따라 올라가기로 했다. 누런빛의 잡초로 가득한 길은 절벽에 가까워질수록 밑에서 보았던 진한 녹색으로 변모했다. 그 색이 어찌나 밝은지 눈이 멀 지경이었다. 절벽 끝에 다다르자 두 발아래 협곡의 속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피야드라글리유푸르 협곡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에 형성되었다. 빙하에서 녹아내린 물은 이곳으로 흘러들어 200만 년 동안 축적된 땅을 깎아내렸고, 그 결과 깊이 약 100m, 길이 약 2km에 이르는 협곡이 탄생했다.

아득한 협곡의 경사면은 어딜 둘러보아도 같은 모양으로 조각된 것이 없었다. 어떤 것은 코끼리 상아처럼 빼죽하고, 다른 것은 주걱처럼 둥글었다. 황소의 허벅다리처럼 넓적하거나,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아치 모양도 보였다. 수십 세기 전 이곳을 흐른 물결이 얼마나 세차면서도 우아했는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짙은 고동색의 팔라고나이트 암석 위에는 이끼와 풀이 가득 자라 있었다. 물기를 한껏 머금어 촉촉하게 빛났다. 아마존 열대우림을 떠올리게 하는 풍경이었다.

트레일을 따라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가면 갈수록 지형은 험준해지고 색은 멀미가 날 만큼 화려해졌다. 길의 끝에 도마뱀의 머리를 쏙 빼닮은 암석이 허공으로 불쑥 튀어나와 있었다. 폭이 2m가 채 안 돼 보였다. 다리가 미친 듯이 후들거렸다. 바닥만 보고 겨우겨우 걸어 암석의 끄트머리로 걸어갔다. 여전히 다리는 어정쩡하게 구부린 채 반쯤 감았던 눈을 겨우 떴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대자연의 경이로움에 꼼짝없이 갇혔다. 장엄함과 두려움에 조금도 발을 떼기가 힘들었다. 그저 고개를 돌려 시선을 이리저리 던질 수밖에 없었다.

코앞에서는 하얀 폭포가 바위틈 사이로 쏟아져 내렸고, 밑으로는 강줄기가 까마득한 협곡을 타고 흘렀다. 등 뒤에는 또 다른 세상인 듯 뻗어있는 벌판이, 머리 위에는 운무가 가득했다. 나는 그야말로 자연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많은 감정이 몸통을 관통했다. 그러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시간과 자연이 빚어낸 광경 앞에 나는 한없이 작고 무지했다. 이내 입을 다물고 생각을 멈췄다. 그리곤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자연의 품 안에 그저 꼭 안겼다.
![은퇴해도 월 300만원 꽂히네…"한국서 가장 부유한 세대 온다" [860만 영시니어가 온다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1/6164bf75-f38e-4fd7-80ab-135806d5a6da.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