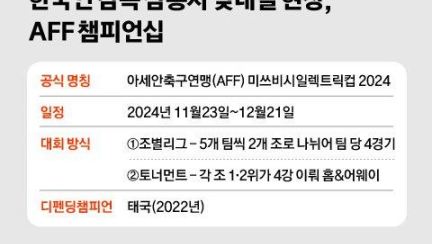이철호
이철호논설실장
중국 한복판의 드넓은 관중 평원. 남쪽에 험준한 친링 산맥이 지나고 북쪽으로 웨이수이(황하로 유입되는 강)가 흐르는 천년고도 시안(西安)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다. 원래 황량한 밀밭이던 이곳에 10조원의 투자와 함께 엄청난 속도전이 진행됐다. 중국 관리 60여 명이 현장에 나와 삼성 측과 머리를 맞대며 15개월 만에 공장을 완공했다. 인허가 신청과 동시에 2600세대 농가가 철거되고, ‘알박기’와 묘지 이장 문제까지 중국 정부가 도맡아 해결해줬다. 시안 공장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중심으로 삼성 전체 반도체 물량의 5%를 생산한다.
이 공장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치적 고향’을 의식한 ‘외교적 투자’로 해석하는 건 오해다. 우선 시안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물과 전력이 풍부하다. 바로 옆에 웨이수이가 흐르고, 산시성은 중국 최대의 석탄지대로 전력이 남아돈다. 또 전 세계 컴퓨터의 90%, 휴대전화의 85%를 만드는 나라가 중국이다. 덩달아 반도체 수입이 2013년(2313억 달러)에 원유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신경을 자극하지 않으려면 현지 생산이 답이다.
요즘 중국은 반도체에 혈안이다. 지난해 21조원의 반도체 펀드를 만들었고, 막강한 권한을 가진 ‘반도체 영도 소조’까지 신설됐다. 향후 10년간 반도체 분야에 1조 위안(약 175조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이미 중국은 LCD에서 이런 전략으로 재미를 보았다. 불과 7년 만에 LCD 국내 자급률이 55%를 돌파한 것이다. 그나마 한발 앞서 중국에서 현지 생산한 LG·삼성은 다행이다. 일본의 샤프를 비롯한 전 세계의 비(非)중국계 LCD 기업은 바람 앞의 촛불 신세다. 중국이 과연 반도체의 꿈(夢)도 똑같이 이룰 수 있을까?
삼성의 큰 그림은 중국 시안에서 보면 그 윤곽이 더 뚜렷해진다. 시안 공장 옆에는 반도체 2개 라인 크기의 공터가 있다. 앞으로 현지 생산물량이 세 배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넓은 게 최근 착공한 경기도 평택의 반도체 부지다. 줄잡아 80조원을 투자해 5개 라인이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이다. 한동안 갤럭시 광풍에 가려졌지만 여전히 삼성전자의 핵심 주력은 반도체다. 앞으로 평택에 어떤 라인을 넣느냐에 따라 삼성의 운명이 달라진다.
최근 세계 반도체 시장엔 쓰나미가 덮치고 있다. PC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마이크로프로세서(MPU)의 강자인 인텔부터 휘청대고 있다. 삼성이 경쟁력을 가진 D램도 똑같은 이유로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다. 그나마 삼성·하이닉스·마이크론이 사이 좋게 시장을 나눠 갖고 있는 게 다행이다. 중국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게 D램이지만 기술과 비용의 진입장벽이 무척 높다. 섣불리 발을 들여놓았다간 ‘치킨 게임’의 악몽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기막힌 매물이던 일본의 엘피다를 마이크론에 빼앗긴 게 뼈아픈 실책이다.
대개 전망이 밝은 반도체로는 세 분야가 꼽힌다. 날로 팽창하는 데이터 센터의 서버용 낸드 플래시, 스마트폰의 두뇌인 모바일 AP(응용 프로세서), 메모리보다 네 배나 시장 규모가 큰 시스템반도체가 그것이다. 하지만 반도체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하면서 곳곳에서 혈전이 예고되고 있다. 인텔은 뒤늦게 모바일 AP에 손댈 징조이고, 삼성은 시스템반도체에 팔을 걷어붙일 채비를 하고 있다. 만약 삼성이 평택에 D램 라인부터 넣는다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긴장할 게 분명하다. 또 삼성이 시스템반도체 라인부터 먼저 깔면 인텔과 정면승부나 다름없다. 시장 수요를 감안하면 낸드 플래시나 모바일 AP 라인도 가능한 선택지다.
중국의 압박과 세계 반도체 지각 변동으로 삼성도 고민하는 눈치다. 머지않아 운명을 건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건 송전탑 갈등이다. 평택은 ‘무한 지원’을 다짐하지만 송전선이 지나는 안성 주민들은 반대하는 모양이다. 중국 시안의 ‘15개월 준공 기적’과 너무 비교된다. 우리가 여유 부릴 때는 아닐 듯싶다. 정치·사회 갈등으로 괜찮은 일자리까지 해외로 걷어차는 건 지나친 사치다.
이철호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