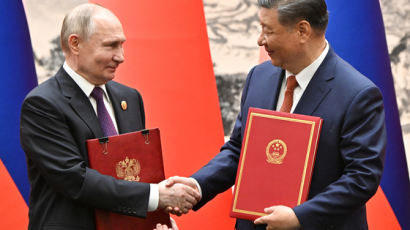한국과 일본은 과거에 묶인 채로 국교 정상화(1965년 6월) 50년을 맞았다. 두 나라의 발목을 묶은 ‘과거사 망령’은 일본이 가해자다. 하지만 일본만 탓하며 빗장을 걸어 잠그기만 한다면 한국 외교의 숨통이 막힐 수 있다고 외교계 원로들은 걱정했다. 원로들이 제시한 한·일 관계를 풀 5대 해법은 이렇다.
① “큰 판을 읽어라. 모든 바둑돌은 연결돼 있다”=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장관을 지낸 유명환 전 장관은 “한·일 관계 악화는 한국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 동맹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좋은 한·일 관계는 중국·러시아에 대한 지렛대로도 작용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외교 수장이었던 송민순 전 장관도 “한·일 관계 악화는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일본의 소극적 내지는 비협력적 자세로 연결되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고 했다. 김영삼 정부 초대 외교장관과 노무현 정부 주미대사를 지낸 한승주 전 장관은 “한국 외교는 바둑판과 같아서 한쪽 모서리 끝에 있는 돌이 움직이면 정반대편에 있는 돌이 영향을 받는다”며 “큰 판을 시간·공간적으로 연결시키는 연계적 사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② “정상회담 없는 정상화도 괜찮다. 접촉면부터 늘려라”=유 전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등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기 전에 양국 정상이 국빈방문 등의 격식을 갖춰 만나는 것은 국민감정상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런 만큼 “다자회의 등 국제행사 무대에서 만나 실무적으로 정상 간에 할 일을 논의하는 등 접촉면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연초에 한·중·일 3국 장관회담부터 열어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주일대사와 외교장관을 지낸 공로명 전 장관은 “82년 전두환 정권 때 한국이 일본에 경협자금을 요구해 양국관계가 악화되자 일본 정치인 30여 명이 각기 따로 한국을 찾아 전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관계를 풀려고 노력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가지도, 일본에서 오지도 않는다. 외교는 결국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다. 다양한 채널 간 접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③ “피해자 한국이 먼저 손 내밀면 주도권 챙긴다”=한 전 장관은 “우리가 먼저 정치적 용기를 발휘해 일본에 보다 높은 차원의 대응을 해야 한다”며 “가해자인 일본에는 혐한이 있지만, 도리어 피해자인 한국에는 혐일이 없다. 우리 국민의 너그러움과 대국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 전 장관도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19세기 말에서 1945년까지에 멈춰 있다. 피해자인 우리가 먼저 과거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50년 동안 한·일 관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④ “일본이 스스로 변화할 ‘마중물’을 줘라”=공 전 장관은 “일본이 변할 수 있는 마중물(펌프에서 물이 나오도록 먼저 부어주는 물)을 줘야 한다”며 “위안부 국장급 협의에서 우리 안을 치밀하게 마련하되 일본이 원하는, 안 받을 수 없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그 일부를 흘려서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예까지 들어 조언했다. 김대중 정부 외교장관을 지낸 이정빈 전 장관은 “과거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외교장관이 독도에 대해 ‘한·일 정부가 서로 공식적으론 침묵을 지키자’고 제안했는데 우리가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감안해 이에 응했다”며 “한·일 관계에서는 이처럼 예민한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여러 현실적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⑤“국제사회와 소통하고 설득하라”=한 전 장관은 “최근 한·미·일 정보교류협정처럼 한국은 정상회담 없이도 일본과 협력의 노력을 끊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입 꽉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한·일 관계가 지역 전반에 장애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충분히 국제사회에 설명해야 한다. 교과서적인 원칙만 되풀이해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장세정 외교안보팀장, 정용수·유지혜·유성운·정원엽·위문희 기자 zhang@joongang.co.kr



![[오늘의 운세] 5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