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고민 드라기 어깨가 무겁다. 그는 디플레이션 진압의 선봉장이다. 그는 “소극적 대응이 낳은 위험은 과잉 대응의 위험을 능가한다”며 양적완화(QE)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승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A spectre is haunting Europe).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아니다. 디플레이션이다. 돈의 추악한 두 얼굴 가운데 하나다. 또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의 요즘 물가상승률은 0.3~0.4% 수준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최근 칼럼에서 “유로존 물가 흐름이 1994년 일본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해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원년이다. 크루그먼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위험성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주 잭슨홀 미팅(중앙은행 총재 연찬회)에서 “상황이 어떤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국채 시장은 이미 디플레이션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독일 등 주요 회원국의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시장금리)이 26일 이후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잦아졌다. 금리 하락은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에만 해도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음산한 시그널이다. 시장 금리는 실질 금리에다 물가 상승 예상치를 더한 값이다. 디플레이션의 징조라는 얘기다.
통화정책 전문가인 찰스 굿하트 영국 런던 정경대학(LSE) 석좌교수는 지난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물가 하락을 “유로존 운명에 흉조(An Evil Omen)”라고 표현했다. 유로존 균열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놀라운 발언이다. 굿하트 교수는 유로존 붕괴설이 한창이던 2012년 “그 통화동맹이 깨지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던 인물이다.

이날 굿하트 교수는 “유로는 대중과 시장보다는 엘리트(기업인·정치인)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며 “디플레이션이 낳을 고통이 유로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럴 때 의문이 든다. 물가가 떨어지면 좋지 않을까.
굿하트 교수는 “(웃으며) 인플레이션이 돈 가치 하락으로 채권자의 재산을 빼앗는 일이라면 디플레이션은 돈 가치 상승으로 채무자들의 부담을 더 키운다”고 설명했다. 그 바람에 제조업체 등 일반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 일자리가 사라진다. 개인 소비 지출은 급감한다.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진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가장 가까운 예다.
굿하트 교수는 “인플레이션이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은 계층적 갈등을 키워 조직적 저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처럼 조용하게 정권 교체 정도로 끝난 게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디플레 후유증은 어떨까. 역사를 거슬러 1870년대 시작된 미국의 ‘그레이트 디플레이션(Great Deflation)’이 대표적인 예다. ‘미국판 잃어버린 20년’이다. 당시 대표적인 채무자였던 농민들은 이중 고통에 시달렸다. 곡물 값 하락과 농가 부채 부담 가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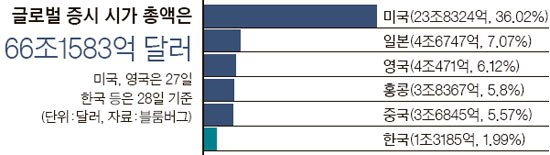
미국 금융역사가인 존 스틸 고든은 『월스트리트 제국』에서 “기계화 덕분에 생산성이 가파르게 올라 물가가 떨어졌다는 게 정설”이라고 설명했다. 파장은 경제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다. 고든은 “시카고 등에선 기업인이 살해돼 전봇대에 내걸리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미국 역사상 가장 체제 부정적인 인민주의자들이 득세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인민주의자들은 민주당과 손잡고 1896년 반(反)월가의 상징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1860~1925)을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 브라이언은 선거에선 졌다. 하지만 “남북전쟁으로 겨우 하나가 된 미합중국이 디플레이션 때문에 다시 붕괴 벼랑 끝에서 흔들려야 했다.(고든)” 당시 미국은 독점 규제로 거대 기업을 제어하고 중앙은행 설립으로 월가를 견제하는 개혁을 단행해 겨우 합중국 분열을 피했다.
현재 유로존의 디플레이션은 가장 약한 고리를 강타하고 있다. 바로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남유럽이다. 그리스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넘게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9월 이후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와 0.2% 사이를 오가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실업률은 10%를 웃돌고 있다. 상황이 조금만 더 나빠지면 사회적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마침 두 나라엔 ‘21세기 브라이언’으로 불릴 인물도 존재한다. 그리스 시리자(급진좌파)의 대표 알렉시스 치프라스와 이탈리아 오성운동 리더인 베페 그릴로다. 두 사람은 자국 내에서 제 2당과 제3당을 이끌고 있다. 둘은 긴축 반대, 유로존 탈퇴 등을 주장한다. 그리스 신문인 카트메리니는 “최근 시리자의 지지도가 중도우파인 신민당보다 높다”며 “물가 불안과 침체가 더 이어진다면 시리자의 집권도 가능하다”고 지난 18일 보도했다.
이들의 등장과 유로존 균열을 막는 1차 소방수는 바로 드라기 ECB 총재다. 무엇을 할 것인가(What is to be done)? 그는 양적완화(QE)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앞엔 두 가지 장애물이 놓여있다. 첫 번째는 ECB의 최대주주인 독일의 딴죽 걸기다. 독일이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QE 규모가 파상적일 수 없다. 효과가 반감한다. 일본이 2001년 QE를 처음 실시했지만 과감하지 못해 실패한 전력이 있다.
두 번째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이다. ‘QE 등으로 돈을 풀면 디플레이션이 진정될까’. 장담할 수 없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투자 심리와 소비 심리가 위축된 기업이나 개인이 돈을 쓰지 않으면 물가는 꿈쩍하지 않는다. 미국의 잃어버린 20년 당시에도 통화인 금 공급이 늘어났지만 물가 하락을 막지 못했다. 일본이 2013년 4월 이후 무제한 QE를 실시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이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런 장애물이 버겁다는 것을 알아서일까. 드라기는 잭슨홀에서 “재정적자 한도(연 GDP 3%)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회원국 재무장관들에게 SOS를 친 셈이다.
강남규 기자




![[오늘의 운세] 5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5/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