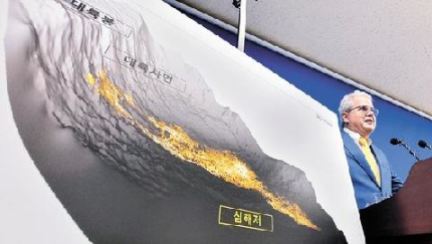「알제리」를 선봉으로 한 비동맹중립 16국은 최근 한국의 대「유엔」외교에 커다란 장애물을 던져놓았다. 주한「유엔」군의 철수, 남북한 동시초청 안 등 지금까지 공산 측서 밀어오던 일을 가로맡고 나선 것이다.
한국정부의 입장은 통한문제 건 주한「유엔」군 문제 건 아예 논의조차 하지 말자는 이른바 「불 상정원칙」. 따라서『논의해 보자』는 주장과『당분간 덮어두자』는 주장은 우선 운영위에서 격돌하게 되었다.
운영위「멤버」는 25개국.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20개국은 9월19일 총회 개막 후에 지역별로 선출된다. 어느 쪽 주장이 채택될 것인가는 이때까지 기다려봐야 대략 점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낙관하는 듯이 보인다. 낙관의 가장 큰 근거는「7·4성명」이 이룩한 성과. 남-북한이 서로 능동적인 자세를 보인 이상『한반도 문제는 한민족의 손에』맡겨달라는 주장이 명분상 훌륭히 먹혀들어 갈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러한 전망은 지난해 26차 총회 때의 경험에 비춰봐서도 상당히 수긍이 간다.
역시「불 상정원칙」을 내세웠던 한국 측의 주장은 남-북 적십자회담의 성립덕분에 득표공작이 한결 수월했던 것이다.
하지만 평양 쪽의 수 읽기가 그렇게 건성건성 한 것만은 아닌 듯 싶다.「유엔」주변의 「업저버」들도 미국이「알제리」안을「스트라익·아웃」시키는데는 상당한 난관이 예견된다는데 거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결의안을 제기한 것이 종래와는 달리 아아「블록」과 비동맹중립국가들이라는 사실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구상을 대변하는 것은 몽고·「알바니아」등 공산국가들이었으므로 70여 개국에 달하는「중립국 표」가 몰 표로 휩쓸려 가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는 사실상 똑같은 북한 안을 중립국들이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들의「몰 표 화」가능성이 전혀 없지도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우려는 중공가입 후 미묘하게만 변해 가는「유엔」안의 기류에 비춰 불 때 결코 넘겨버릴 수 없는 문제점이라고 지적되었다.
뿐만 아니라 결의안의 내용자체도 극히 교묘하게 작성되었다. 해마다 제기되었던「언커크」해체 안을 쑥 빼 버렸는가 하면 주한「유엔」군 철수 안에도 한가지 단서를 단 것이다.
즉「유엔」군은 모두 철수하되 미군이 한-미 양국정부 합의하에 계속 주둔하는 것은『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유엔」군 파견 16개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5개국은 수명의 연락장교만 남겨놓은 형편.「알제리」안이 언뜻 명분상의 장점을 지닌 듯이 보이는 것도 무리만은 아닌 것이다.
중공「유엔」가입 후 한반도의 정치현실은 오히려 기정사실화의 방향으로 굳어졌다. 중립국들의 지지를 받은 이러한 흐름은『북한을 포함한』모든 나라와 관계개선의 용의를 비친「로저즈」방언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업저버」들은 지난 2∼3개월 사이에 북한이 8개 사절단을 33개국에 파견, 이번「알제리」안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득행각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한국과 미국의「불 상정 전략」은 적어도 내년 총회 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정형수술을 받아야할 것 같다.
한국의 대「유엔」외교는 47년 2차 총회 이후 14차 총회까지「한국지지결의안」으로 기세를 올렸으나 61년「스티븐슨」안(북한조건부초청 안)으로 대폭 후퇴, 71년에는 다시 불 상정원칙으로 전향했었다. 그리고 이「불 상정원칙」이 불과 2년만에 한계점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홍사덕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