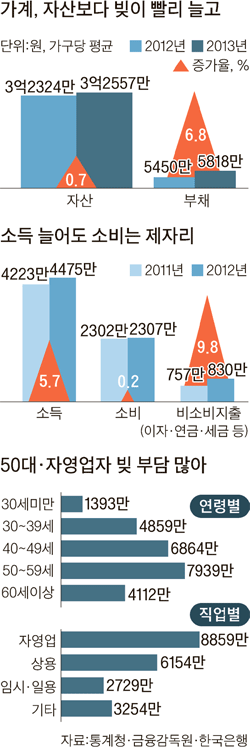
직장인 김진호(33)씨는 교사인 부인과 맞벌이로 한 해 7500만원을 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 갖기를 미루고 있다. 빚 부담 때문이다. 그는 “전셋집을 얻을 때도 적지 않은 대출을 받았는데 내년엔 다시 전셋값 올려주느라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할 형편”이라며 “아이를 갖게 되면 한 사람은 직장을 쉬어야 하는데 외벌이로 이자 갚고 생활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벌이는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정작 쓸 돈은 없다. 불어난 빚에 이자 부담은 커지고 연금과 세금 등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돈도 늘어난 탓이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조사한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나타난 우리 가계의 살림살이 모습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전국 2만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가계 빚이 늘어나는 속도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올 3월 말 기준으로 5818만원으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6.8%(368만원) 증가했다. 빚은 소득 상위 20%(5분위)를 제외하고는 전 계층에서 늘고 있다.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인 하위 20%(1분위)의 증가 폭이 24.6%로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11.3%)와 임시·일용직 근로자(16.9%)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전통적으로 빚을 많이 끌어 쓰는 연령대는 40~50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선 60세 이상(12.3%)과 30대(10.3%)에서 부채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 40~50대를 앞질렀다. 가계 빚 증가세가 젊은 직장인과 노령층으로 빠르게 확산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는 빚에 한참 못 미친다. 가계 자산의 73%를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탓이다. 가구당 자산은 올 3월 기준으로 3억2557만원으로 한 해 전에 비해 0.7%(233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득은 늘었지만 이자 내느라 소비는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가구 평균 소득은 4475만원으로 전년(4223만원)에 비해 5.7%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지출은 2307만원으로 전년 대비 0.2%(5만원) 증가에 머물렀다. 대신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공적연금·사회보험료(8.7%), 이자(6.8%), 세금(3.6%) 등 비소비지출이 9.8% 급증했다. 소비도 비중이 가장 큰 식료품(-2.0%)은 준 대신 통신비(7.6%), 의료비(4.7%), 주거비(3.7%)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
자연히 가계의 재무구조는 악화하고 있다. 가구당 원리금 상환액은 올해 709만원으로 지난해(596만원)보다 18.9% 급증했다. 처분 가능한 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06%에서 108.8%로 증가했다. 가구당 부채가 8859만원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이 비율이 153.8%였다.
한은 거시건전성분석국 박장호 과장은 “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은 주는데 부채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특히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고연령층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들이 받는 대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전체 자영업자 수는 감소세인 반면 50세 이상 자영업자는 월평균 3만 명씩 늘고 있다.
빚 갚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가구도 늘고 있다. 10가구 중 2가구(20.5%)는 대출 원리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7가구(70.2%)는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또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구 중 상당수(80.5%)는 저축과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아예 ‘대출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한 가정도 지난해 7%에서 올해는 8.1%로 늘어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도 커졌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노후 대비는 언감생심이다. 노후 준비가 잘돼 있다고 답한 가구는 9%에 그친 반면 ‘잘돼 있지 않다’(34.3%), ‘전혀 안 돼 있다’(20.8%)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는 “예전에는 집을 사기 위한 투자용 대출이 많았다면 요즘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생계형 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며 “미국의 양적완화가 마무리되고 금리가 오름세를 탈 경우 가계 부담이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민근·이지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