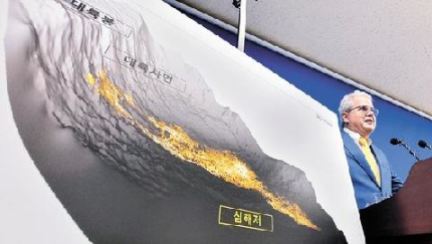대한민국은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자찬해 왔다. 산업화란 자동차와 선박, 통신기기, 전자, 철강, 석유화학에 이르기까지 선진국 수준의 제품생산능력을 갖추고 1인당 소득을 100달러 미만에서 2만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는 얘기다. 민주화란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가능한 나라가 됐다는 얘기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이 나라의 정치현실에 대해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다. 기성 정치인들을 신뢰하고 존경하기보다는 그들을 향해 불신과 혐오감을 표출하는 이가 늘어만 가고 있다. 정치인들이 눈앞의 이익과 권력에만 집착할 뿐 미래비전을 제시하거나 사회적 공동선을 만들어내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다. 여야 정당에서나 국회에서나 설득·타협을 통해 국민 갈등을 녹여내는 역할을 하기보다 국민 갈등을 증폭시켜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언동을 늘상 서슴지 않아 ‘제발 싸우지 말라’는 게 국민들의 하소연이 됐다.
한국 정치수준이 이른바 민주화 이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도덕성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론을 이끌어가는 사회지도층에게도 책임이 있다. 우선 정치마켓을 이끌어가는 언론과 정치담당 기자들은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소신·경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권을 장악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는 데 몰두한다. 누가 진지하고 참신한 정책적 비전이나 대안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기삿거리가 안 되고 서로 패거리를 만들어 싸워야만 기사를 쓴다. 계파에 관심도 없고, 당직에 욕심을 내지 않은 채 나라 장래를 걱정하는 소신 있는 정치인들은 언론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풍기는 나라사랑의 향기를 전혀 맡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한국의 정치시장에서는 정치판 싸움기술을 터득한 정치꾼들이나 운동권 출신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다. 학계·행정부·기업 등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정계에 들어가도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다. 빌 클린턴이나 버락 오바마 같은 정치 신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미국 정치의 매력을 우리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도 품격이 낮고 믿음을 못 주기는 마찬가지다. 세계 10대 무역대국이 됐다고 자랑하지만, 산업화 역사가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중국에 쫓기고, 외환보유액이 3000억 달러를 넘어도 외환위기의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한국 경제의 현실이다. 연평균 3%를 밑도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7년 세월을 보냈고 앞으로 성장활력이 되살아날지도 불투명하다. 그러면서 일본 같은 장기불황에 대한 공포도 커지고 있다.
만성적인 경기침체 현상이야 선진자본주의 국가도 대부분 겪고 있지만, 기업활동의 자유나 시장경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이 선진국보다 취약하다. 정부 주도 방식으로 산업화를 이끌어 왔던 관료들은 아직도 규제행정에서 얻어지는 사익 추구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은 어떤가. 대화와 타협의 전통을 만들지 못해 재벌 대기업들은 골치 아픈 국내투자보다는 규제가 적은 해외투자를 선호한다. ‘고용 없는 성장’의 한 원인이다. 재벌은 재벌대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지 못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고 편법상속을 일삼아 왔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렇다고 경제적 강자인 재벌들이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규제를 확대하면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 기존 순환출자 같은 것을 당장 해소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시장경제가 건강하게 작동되려면 경쟁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공정하게 다스릴 법치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조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단어에서 보듯 불신의 대상이 돼 있다.
한국 자본주의 체제가 최소한의 품격을 유지하려면 재벌들의 돈 버는 방식이 공정하고 떳떳해야 하며, 편법상속의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들을 도와주고 일자리를 계속 늘려 근로자들을 먹여살리겠다는 애정이 느껴지게 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국민행복시대’는 공무원들이 밤낮없이 야근을 하고 정치인들이 복지 확대 법안을 양산해서 이룩되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품격을 갖추고 향기가 나도록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법조계와 언론계도 동참해야 할 것이다.
강봉균 군산사범학교와 서울대 상대를 졸업했다. 행시 6회(1969년). 관료 생활 31년 동안 정보통신부·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3선 의원.
![[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