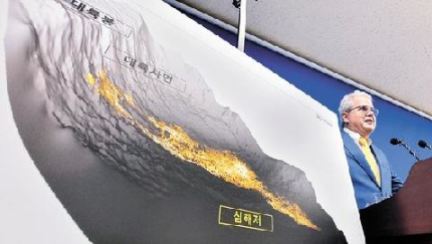눈덩이처럼 불어난 공적자금의 상환 문제가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저녁 재정경제부 감사장에서 벌어진 진념(陳稔)부총리와 야당 의원간의 언쟁이 한 예다.
얼핏 단순한 설전(舌戰)처럼 보이는 이날의 언쟁 속에는 공적자금 상환부담을 다음 정권 이후로 넘기려는 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야당간의 신경전이 숨어 있다.
정부는 이달 초 공적자금 백서를 발간하면서 공적자금 상환 연기를 위해 정부보증 채권을 차환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공적자금용 채권을 발행했던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 회수 부진으로 만기가 된 채권을 갚아줄 만한 현금이 없고, 따라서 이들 기관의 부도를 막으려면 정부보증 채권을 다시 발행해 바꿔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가운데 절반 가량은 이런 차환발행 형식으로 10년 이상 만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외환위기의 업보(業報)격인 공적자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같은 차환발행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 1백37조원 가운데 지난 6월 말 현재 회수된 자금은 34조2천억원(회수율 24.9%)에 그치고 있다. 이미 떼인 돈만 해도 45조원에 달한다.
반면 만기가 되는 채권은 내년에 5조6천억원을 비롯, 2006년까지 해마다 20조원 안팎이어서 도저히 제때 갚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차제에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일들은 남아 있다. 우선 정부가 공적자금의 조성 및 상환 원칙을 어겼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채권발행.집행기관인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투입했던 자금을 회수한 돈으로 만기가 된 채권을 갚는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해왔다.
정부는 보증만 서준 것인 만큼 공적자금은 국채(國債)같은 직접 채무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 등이 도산하는 경우에만 대신 물어주는 우발채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가 차환발행용 보증을 다시 서준다는 것은 이런 윈칙을 지키지 못한 것인 만큼 그 원인과 책임을 가리고 후대(後代)로 넘어갈 공적자금 상환 부담의 실태와 상환계획 등을 다시 작성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차환발행이 공적자금 회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다. 어차피 정부가 보증을 추가로 서줄 것이 뻔한데 예금보험공사 등이 회수에 죽기살기로 매달릴 리가 없기 때문이다. 25%의 회수율은 경기가 부진한 탓도 있지만 이런 도덕적 해이에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차환발행을 하더라도 이 중 일부는 국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채는 정부의 직접 채무가 되므로 매년 국가 예산 및 결산과정에서 국회 동의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나 관련 기관의 공적자금 회수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저금리 추세를 활용하면 국채를 유리한 조건으로 팔 수 있고 상환기간도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