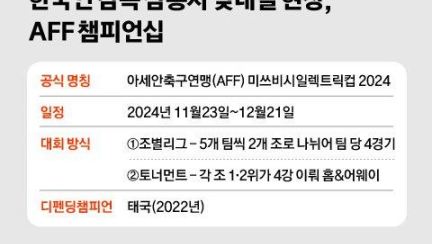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1980년대 초에 유행한 노래의 ‘시월의 마지막 밤을’이란 구절이 생각난다. ‘마지막’이란 말이 아쉬움을 주는 말인 것은 분명하지만 ‘시월’이 덧붙어 이 아쉬움은 몇 배로 커진다. 내일이면 11월이니 이 좋은 가을이 끝나 가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짧은 봄만큼이나 짧은 가을은 아쉽다. 봄보다도 가을은, 겨드랑이 사이로 혹은 손가락 사이로 뭔가가 슥 빠져나가는 듯한 진한 허전함이 있다. 이영훈과 이문세 콤비가 만들어 낸 ‘사랑이 지나가면’이나 50년대 박인환의 시에 곡을 붙인 ‘세월이 가면’의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의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같은 구절이 유난히 생각나는 것도 바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듯한 가을의 느낌 때문일 게다.
이영미의 제철 밥상 차리기 <33> 가을에 잠깐 만나는 홍옥과 풋대추
풍성한 가을의 과일들도 계절 따라 막 지나가고 있다. 가을에 수확하는 과일의 상당수는 겨울까지 저장해 두고 먹는 것이 많지만, 이 계절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들도 많다. 나는 끝물 과일을 좋아한다. ‘신상’을 원하는 요즘의 소비 패턴은 과일에서도 늘 제철보다 이른 과일들에 집중하게 된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철 이른 과일은 맛이 어설프다. 진짜 제맛이 드는 계절까지 진득하게 기다리는 것이 옳고, 특히 제철을 살짝 지난 끝물이 되면 과일이 더 맛있어진다. 게다가 비닐하우스 재배가 아닌 제대로 된 노지 것들이고, 끝물이니 농약 등도 적게 쓴 것들이라 여러 가지로 좋다.
10월까지 여름 과일의 마지막 것들이 나온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라고 말하는 게 옳다. 참외와 토마토 같은 전형적인 여름 식물들은 서리가 내리면 그 즉시 시커멓게 죽는다. 그전까지 참외는 여전히 달고 맛있으며, 토마토 역시 탱탱하고 진한 맛을 자랑한다. 다른 채소가 비쌌던 이 가을, 우리 밥상에는 토마토와 참외 등을 썰어 넣고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유 등을 뿌린 간단한 샐러드가 자주 올라왔다. 포도는 거봉과 캠벨은 다 끝나고 가장 달고 맛있는 머루 포도가 마지막으로 나온다. 이런 끝물 여름 과일을 아직 맛이 덜 든 감귤과 어찌 비하랴.
막 먹기 시작한 가을철 과일 역시 빨리 지나가는 것들이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홍옥 사과와 풋대추다. 이제야 풋대추가 홍갈색을 띠며 제대로 익었다. 풋대추는 10월에 아주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과일이다. 그것도 웬만한 시장에는 없고 큰 재래시장에 가야 볼 수 있다. 엄지만 한 크기는 과일이라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이지만, 그래도 반지르르하고 탱탱한 풋대추를 한 번 먹고 넘어가지 않으면 가을에 뭔가 할 일을 못한 것처럼 섭섭하다.
마른 대추의 달고 쫄깃한 맛과 달리 풋대추는 약간 뻑뻑한 듯 물기가 적으면서 탱탱한 육질이 매력이다. 한입 깨물면 아작 하고 껍질이 씹히면서 연두색 육질이 입에 들어온다. 그리 자극적이지도 않은 이 맛이 왜 이렇게 가을 느낌으로 진하게 남아 있는 걸까. 바로 이 계절에만 잠깐 맛볼 수 있기 때문인 듯하다.
풋대추는 냉장고에 잘 보관하려 해도 무르면서 썩고 맛이 뚝 떨어진다. 그렇다고 그리 많이 먹을 수도 없는 과일이다. 껍질이 너무 강해 급하게 먹으면 목구멍이 까끌까끌하다.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한다는 말도 있다. 그러니 한 됫박 사 온 풋대추는 깨끗이 씻어 채반에 좍 펴 놓고, 오다가다 심심할 때 한두 개씩 먹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3~4일 지나면 대추는 조금씩 마르고 껍질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한다. 점점 말라 가는 대추는 매일 맛이 달라진다. 신맛이 줄어들고 단맛이 강해지면서 탱탱한 질감 대신 쫀득한 질감 쪽으로 옮겨 간다. 가을이 점점 깊어 가고 채반에 펼쳐 놓은 대추가 풋것의 맛을 완전히 잃어버린 뒤 남은 것들은 좀 더 바짝 말려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마른 대추가 필요한 때 요긴하게 쓴다.
홍옥은 70년대 초까지 가장 즐겨 먹었던 사과 품종이었다. 달고 아작한 부사라는 품종이 모든 사과 시장을 평정해 버리기 전까지 우리는 홍옥과 국광 두 가지 사과를 주로 먹었다. 홍옥은 부사에 비해 크기가 작고 마른 수건으로 껍질을 닦으면 유난히 반짝거린다. 이름 그대로 정말 예쁜, 빨간 구슬이다. 어느 가게에는 ‘백설공주 사과’라고 써 붙여 놓았는데 그런 이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생김새가 고혹적이다.
홍옥은 어느 사과와도 견줄 수 없는 향기가 일품이다. 하지만 부사에 비해 신맛이 강해 꺼리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육질이 지나치게 연해 조금만 지나면 퍼석거리면서 상해 버린다. 보관성이 약한 홍옥은, 그래서 겨울 내내 두고 먹을 수 없고, 이 화려한 가을에 잠깐 맛을 보고 지나가는 과일이다. 이런 약점 때문에 홍옥은 보관성 좋고 달고 아작거리는 부사가 나오자 인기 없는 품종이 됐다. 그래서 오랫동안 시장에서 이 사과를 보기 힘들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홍옥을 잊지 못했고, 10여 년 전부터는 짧은 시기나마 당당하게 과일가게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홍옥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상기시켜 주는 일종의 향수 식품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껍질조차 얇은, 이 예쁘장한 사과를 한입 깨어 물면 독특한 홍옥의 향이 입 안에 가득하다. 어릴 적에는 그 홍옥이 어찌 그리 커 보였는지. 한 손으로 쥐어지지 않아 두 손으로 사과를 쥐고 껍질째 아구아구 먹었던, 내가 살던 한옥집의 해 잘 드는 툇마루가 떠오른다.
대중예술평론가. 요리 에세이 『팔방미인 이영미의 참하고 소박한 우리 밥상 이야기』와 『광화문 연가』 『한국인의 자화상, 드라마』 등을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