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들은 별명보다 호(號)를 즐겨 짓고 부른다. 스스로 짓기도 하지만, 평소 그림 그리는 솜씨나 품성을 아는 스승이나 지인들이 걸맞게 지어주는 것이 화단의 아름다운 풍속으로 내려오고 있다.
한국화가 서세옥씨는 어려서부터 한문과 동양미술론에 눈이 밝아 어른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자리에 자주 불려다녔다.
하루는 춘곡 고희동과 소정 변관식 선생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마침 호 이야기가 나왔다. "자네도 이제 호를 가질 나이가 됐지?"라고 물은 스승들은 제자의 이름 세옥(世鈺)이 '단단한 금과 옥돌'이라 너무 야무지니 좀 모자란 듯하게 하(瑕·흠집)자를 넣어 '하정(瑕丁)'이라 하라고 작호해 주었다.
젊고 혈기 넘쳤던 세옥씨는 그 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획수가 너무 많은 '瑕'자가 쓰기 어려운데다 뜻도 별로라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스승들은 즉석에서 다시 "옥이 산에서 나오니 산정(山丁)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며 고쳐주었다. 쓰기 쉽고 뜻이 좋은데다 부르기도 좋으니, 금상첨화라. 서세옥씨는 1960년대부터 '山丁'을 쓰기 시작해 화력 50년을 이 호와 함께 보냈다.
하지만 산정은 정작 '산사내'란 한글 별명을 더 즐긴다. '정(丁)'이 사나이를 가리키는 말인데다 스스로 산에 묻혀 그림만 그리고 사는 사내 대장부라 자부하기 때문이다. 서울 성북동 소나무숲에 집을 지은 산정은 도연명의 '귀거래사'에서 뜻을 얻은 '무송재(撫松齋)'라는 당호를 짓고 오늘도 그 산속에 숨어 그림 그리는 산사내로 속세의 어지러움을 잊고 산다.
정재숙 기자

![[오늘의 운세] 5월 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0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세상에 홀로 나간지 8년…27세 예나씨의 쓸쓸한 죽음 [소외된 자립청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07/be204767-01c0-4ae6-bbc9-1c6fb4ac3bba.jpg.thumb.jpg/_ir_432x244_/aa.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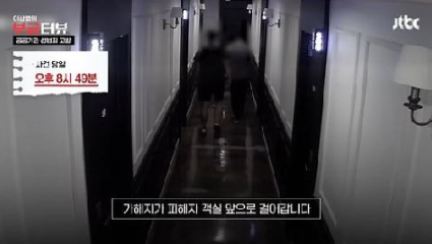
![[속보] 민정수석 부활…尹대통령, 김주현 전 법무차관 내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07/875a9d53-c1f3-4484-b22f-a4855c4b1d25.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