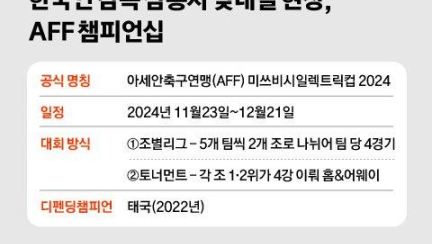2010년 6월 대한민국에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언론도 시민도 이웃의 무심함을 지탄하고 자책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그동안에도 반복돼 왔다. 사람이 죽어 ‘미라’가 될 때까지 바로 옆집에선 모르는 게 도시다. 그 옆집 사람들이 특별히 무디고 모질어서가 아니다. 그저 도시는 원래 그런 거다.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때때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곳. 남의 일에 선의로 끼어들었다 잘못하면 되레 해를 당하는 곳. 어쩌면 도시에선 무심히 사는 게 자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어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불의를 제지한 시민은 영웅의 칭호를 받는다. 위험한 일을 했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도시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건 시스템이다. 문명화된 도시일수록 치안 시스템, 복지 시스템 등 각종 사회안전망이 촘촘하다. 그러므로 이번 사고에서 지탄받아야 하는 건 이웃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한국의 치안시스템이 엉망이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다. 전반적으론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꽤 괜찮은 편이다. 한데 이상하게도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보호시스템은 유난히 허술한 구석이 많이 보인다.
최근 일련의 사건에선 그 내용도 경악할 만했지만 사회적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게 더 놀라웠다.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보호하는 어른이 하나도 없는 아파트에 저희들끼리만 살도록 방치돼 있었을까. 어떻게 부모가 없는 집에 10대 청소년들이 몰려가 며칠씩이나 사는데 아무도 제지하거나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외부인이 무시로 드나들 수 있었을까. 왜 평소에 이런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어린이·청소년 보호시스템이 어쩌면 이렇게 대범하고 ‘쿨’할 수 있을까.
부모가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혼자 집에 두고 외출했다가는 고발당한다든지, 학교에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든지 하는 미국 같은 나라 얘기를 하자면 입만 아프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일찍이 마련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만 커진다. 어린이들이 어른의 눈밖에 방치돼 있지 않도록, 가출청소년이 발생하면 부모까지 데려다 원인을 캐고 가족교육을 시켜서라도 바로잡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라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사고에 높으신 분들이 범죄 근절책을 찾으라고 했단다. 한데 인간 사는 세상엔 살인·성폭력 같은 범죄가 늘 있다.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데서 발상을 바꿔 어린이·청소년들을 범죄에서 지키는 온갖 방도를 찾아내 꼼꼼하게 시행하는 게 먼저일 듯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범죄도 달려들지 못하도록 말이다.
양선희 위크앤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