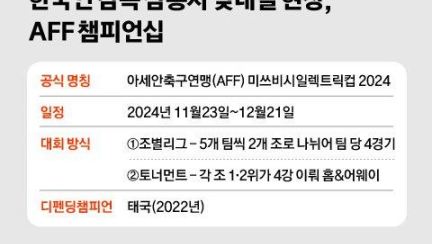울산 언양장터의 마지막 대장장이 박병오(朴炳悟 ·58)씨는 “쇠도 인간과 같아서 정성껏 다듬어야 쓸만한 연장이 된다”고 말한다.
그는 대장장이를 천직으로 여기고 50년 가까이 쇠를 달구고 다듬어 온 장인(匠人)이다.
그의 일터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언양장 안에 마련된 대장간. 그는 이 곳에서만 28년째 쇠를 다뤄온 언양장의 토박이 장꾼 가운데 한명이다.
이 일대 농부들 사이에서 朴씨는 ‘마술사’로 통한다.아무리 단단한 쇠도 떡 주무르듯 하여 원하는 농기구로 빚어 내는 그의 손재주 때문이다.
하지만 장날이면 단골로 북적이던 대장간도 고객이 줄어들어 3∼4년전부터는 장날에 한두시간 작업을 하면 그만이다.영농기계화에 농군마저 줄어 들어서다.인건비가 나오지 않는데다 대장장이가 되려는 젊은이가 없어 장정 3∼4명이 하던 가열·해머질·담금질을 혼자서 해 낸다.
그가 대장간에 처음 발을 들여 놓은 것은 울산 양사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12살때. 울산 인근에서 가장 큰 장터인 울산시 중구 성남시장 대장간의 불꾼이 된 것이 시작이었다.
가난한 농가의 8남매 중 7번째인 그는 입을 덜기 위해 대장간에 맡겨졌다. 그가 대장간에서 처음 맡은 일은 풀무질. 가슴이 숯검댕이가 될 정도로 7년간 풀무질을 해댔다. 벌겋게 달아오른 쇳덩이를 보면서 배고픔과 육체적 어려움을 잊을 수 있었다고 했다.
불을 잘못 다뤘다고 선배들이 달궈진 쇳덩이로 머리를 지져 생긴 흉터가 지금도 남아 있다.
풀무를 놓고 해머꾼이 됐을때 그는 모든 쇠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지기도했다.하지만 얼마 되지않아 자신이 어설픈 대장장이라는 사실을 알아 차렸다.독창적인 기술이 있어야 밥벌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朴씨는 “마흔살쯤 되니까 가열(加熱)·담금질·망치질 등 3단계를 웬만큼 할 수 있는 대장장이가 된 것 같았다”고 말했다.
같은 칼이라도 고기 ·뼈 등 자르는 용도에 따라 담금질과 망치질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호미도 사용자인 아낙네나 아저씨의 신체조건에 맞게 무게 ·모양을 바꾸는 정성을 기울였다.그가 개발한 이앙기 모상자 떼 내는 기구는 7년간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걸작품이다.
지난 7일 장날 경남 함안에서부터 수소문 끝에 배종수(裵鍾守 ·77)씨는 찾아와 이 기구를 구입해갔다.경남 일대 농군 사이에서 이 기구는 명품으로 통한다.
이같은 탐구심과 노력으로 대장간은 항상 붐볐다.2남1녀의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켰고 보금자리도 마련할 수 있었다.
朴씨는 “대장간 문을 닫고 싶어도 아직 대장간을 찾는 농민들이 있어 대장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퇴한 뒤 사라져 가고 있는 풀무 등 대장간 용품과 옛 농기구 모형을 만들어 보존하고 사용법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허상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