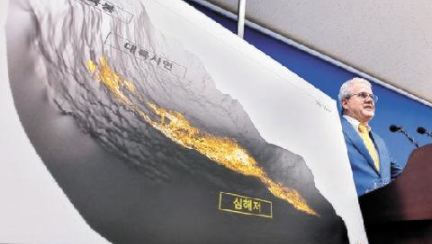지방국립대 교수인 후배가 씩씩거렸다. “자연계열 연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물정도 모르고 욕부터 하다니….”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출신인 백희영 여성장관 후보자가 제자들과 함께 쓴 논문에 대해 “제자들의 논문을 가로챘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현실을 개탄한 거다. 수화기 너머 벌겋게 달아올랐을 그가 눈에 선했다.
그의 분노를 이해한다. 기자 역시 연구실 출신이기 때문이다. 화학, 그중에서도 유기화학을 전공했다. 당시 했던 연구 결과가 이후 두 차례 걸쳐 해외 학술지에 게재됐다. 기자를 포함, 각각 네 명과 여덟 명이 공저자로 올랐다. 의당 지도교수도 포함됐다. 그의 머리에서 나온 연구주제였고 그와 논의하면서 얻은 결과였다. 그게 국제적인 관행이기도 했다.
백 후보자도 자연계열 교수니 유사한 입장일 거다. 그런데도 손가락질을 받았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백 후보자의 학자적 양심을 의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제자의 것을 편승하거나 가로채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장전입을 통해 ‘강남 아파트’에 입주한 박 의원이 그런 잣대를 들이댈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백 후보자가 상황을 설명했지만 이들은 아랑곳없었다.
과한 비난은 또 있었다. 평소 성차별적인 언어에 예민한 곳이 여성위다. 당연히 그래야 할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투기의 여왕’이란 표현까지 나왔다. ‘여왕’이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와 함께 쓰일 때 얼마나 나쁜 인상을 주는지 잘 알 텐데도 그랬다. 실제 대부분의 국민은 백 후보자를 ‘복부인’쯤으로 여길 거다. 더 이상 진실을 따지는 건 무의미한 일이 됐다.
‘자매애는 힘이 세다(Sisterhood is powerful).’ 1970년대 이후 여성들의 주제였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유대감을 통해 불평등을 극복하자는 게 핵심이다. 적어도 국회 여성위에선 그래온 측면이 있다. 여야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전혀 달랐다. 백 후보자의 도덕성이 의원들의 기대 수준에 미흡한 탓이 클 게다. 여성정책과 그다지 관련 없어 보이는 이력도 문제일 거다. 하지만 과거엔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과도한 의혹 제기는 어떻게 봐야 할까.
여성계에 정통한 한 인사는 “두 세계의 충돌이 본질”이란 견해를 내놓았다. 여성학계와 가정학계 간 대립이란 거다. 실제 김대중 정부 이래 여성 운동가들이 정·관계에서 약진한 측면이 있다. 여성장관을 지낸 한명숙·지은희·장하진 전 장관이 대표적이다. 반면 가정학계는 변방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게 뒤집혔다는 거다. 여성학계에서 백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하고 가정학계에서 “적격”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럴 법한 설명이다.
그렇다곤 하나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다. 자매애를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불평등 구조가 개선된 게 아니니 말이다. ‘파이’를 키우는 게 더 급선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다. 가뜩이나 여성 인재에 야박한 이명박 정부 아닌가.
고정애 정치부문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