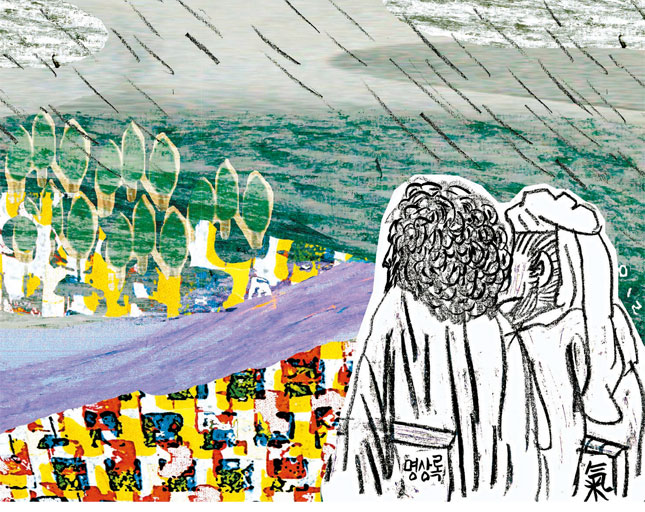
기(氣)의 사유, 그리고 도가
주자학이 마주친 최고의 경쟁상대는 불교다. 수·당대에 득세한 불교, 그 고도의 형이상학과 치밀한 심층심리학은 가위 난공불락이었다. 주자학은 정면대결을 피하고 사이드잽을 날리기로 했다. “행태만 놓고 보자. 그들은 세계를 환상이라고 떠들고, 가족과 사회를 떠나는 무책임한 짓을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한형조 교수의 교과서 밖 조선 유학 : 퇴계, 그 은둔의 유학 <2>
이에 비해 노장은 적어도 ‘실재하는 기(氣)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 인정을 받았다. 주자는 이 기의 우주론 위에 유교 본래의 윤리학을 이(理)의 이름으로 결합시켰다. 아 참, 하나 더 있다. 심리학과 수양론은 공식적으로 배척한 불교의 핵심을 몰래(?) 끌어다 썼다. 그래서 주자학을 유불도(儒佛道) 삼교 통합의 체제로 부른다.
1. 오늘은 노장이 채택한 기의 사유, 그 골격을 보기로 한다. 기는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일상어이지만, 한편 지하철 ‘개량 한복’들의 질문처럼 모호하고, 공중부양을 한다는 분들의 소문 속에 있는 신비이기도 하다. 기는 우주의 원질이다. 기는 먼지보다 미세한, 자기 속에 활동력을 내재한 에너지의 풀(pool)이다. 원초적 태허(太虛)에서 무거운 것은 땅으로, 가벼운 것은 하늘로 올라가 엉겼다. 땅에 수화목금토의 물질이 형성되는 동안 하늘에는 수화목금토의 별들이 생겼다.
하늘과 땅이 맷돌처럼 이빨이 맞지 않아 수많은 생명들이, 사물들이 곡식가루가 흘러나오듯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태극기의 원환처럼 양극적 대립물들 사이의 교호와 교대의 작용으로 정리되는데, 이를 수식화한 것이 역(易)의 괘상들이다. 라이프니츠는 “이 역의 그림은 우주에 있어서 오늘날 존재하는 과학에 관한 최고의 기념물”이라고 찬탄한 바 있다.
2. 기들은 구름무늬의 춤으로 비유되듯,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 변환의 역동적 장 속에 있다. 그래서 주로 흐르는 강에, 때로 급류에 비유되었다.
인간은 기의 흐르는 강물 속에서 잠시 엉켜 한시적 삶을 살다, 다시 어머니인 기의 바닷속으로 회귀한다. 노자가 말했다. “보라, 사물들이 분분히 일어났다가, 다시 그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서 비슷한 통찰을 만났다. “시간은 이 세상에 생겨난 모든 것이 모여 흐르는 거친 강물 같은 것. 어떤 것이든 나타났다 하면 순식간에 흘러가버리고, 다른 것이 나타나 그 자리를 채운다. 그리고 그것 역시 금방 사라지고 만다.”
이 흐름 속에는 뜻도 의미도 없다. 그저 흘러갈 뿐. 노장은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그저 수용하라고 말한다. 니체가 우주의 영겁회귀 그 장엄함 앞에서 ‘신성한 긍정(heilige ja-sagen)’을 읊었던 것과 진배없다.
3. 세상에는 수많은 차이들이 존재한다. 서로 다른 사물들, 가로 놓이고 세로 놓인 것들, 아름답고 추한 것들, 정상적인 것과 이상한 것들…. 자연의 도(道)는 그러나 이 차이들을 무심히 밟고 지나간다. 차이와 구별은 인간의 것이지, 다만 유용성의 편견이고 우상이지 자연의 의도는 아닌 것이다. 그리하여 장자(莊子)는 말한다. “우리가 ‘분리’라고 부르는 것들이 자연의 관점에서는 ‘생성’이고, 우리가 ‘탄생’이라 말하는 것들이 자연에서는 곧 ‘소멸’이다.”
그렇지 않은가. 존재하는 것들은 우주의 관점에서 다 귀한 자식들이고, 아니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노자가 그래서 왈, 천지불인(天地不仁)이라고 했다. 자연은 자신의 급류로 피조물들을 가차없이 쓸어간다. 거기 불평도 원망도 하지 말라.
4. 인간이 벌이는 시비와 선악은 자연의 필연성과 혼돈(混沌) 앞에서 길을 잃는다. 장자의 우화를 기억할 것이다. “혼돈이 있었다. 친구들이 그 흐리멍덩함을 안타깝게 여겼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눈·코·입의 감각기관을 하나씩 뚫어주었더니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다.”
혼돈은 위대한 수용이자, 판단 중지를 말한다. 그것으로 관조를, 안심입명을, 아타락시아를 얻을 수 있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칭찬과 비난에 초연한 삶, 정념의 파토스를 탈각한 그 자리가 노장이 기의 사유를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지혜 혹은 안목이다.
장자의 비유에 조삼모사(朝三暮四)가 있다.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에 분노하고,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에 환호하는 어리석은 원숭이들. 그들은 다름아닌 충분히 진화하지 못한 우리네 인간들이다. 장자는 “자연이 본래 한 얼굴임을 모른 채, 헛되이 지력을 소모하는 우리들…, 종류와 개수에 변함이 없는데도 엇갈린 희로의 폭풍에 휘둘리는” 우리들을 향해 지독한 독설을 날린 것이다.
5. 기에는 선악이 없다. 마찬가지로 최종적 범주인 삶과 죽음 또한 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장자는 아내가 죽었을 때 박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친구 혜시가 문상을 갔다가 기겁을 하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 나도 아내의 죽음에 어찌 슬프고 아득하지 않았겠나. 그러나 돌이켜 보니 생명은 원래 없었던 게 아닌가. 혼돈의 흐릿함 속에서 어쩌다 기가 생겼고, 그게 형체가 되고, 다시 생명이 된 것이 아닌가. 그게 또 변해서 이제 죽음이 되었네. 이것은 봄·여름·가을·겨울이 번갈아 오는 것과 같은 것. 아내는 지금 천지라는 거실에 편안히 누워있다네. 그걸 울고불고 곡을 해서 시끄럽게 해야겠나.”
장자가 죽으려 할 때 둘러섰던 제자들은 오랜 주(周)문화의 전통에 따라 후히 장사를 지내고 싶어했다. 장자는 손을 내저었다. “나는 하늘과 땅을 관으로 삼고, 해와 달과 별을 주렴으로, 만물의 호송 속에 떠나갈 것이다. 장례준비가 다 되었는데 뭘 더 보태겠단 말이냐.” 짐승과 새들이 뜯어먹을 것이라고 걱정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땅 위에 두면 까마귀 밥이 될 것이고, 땅밑에 두면 개미 밥이 될 것인데, 굳이 이쪽 밥그릇을 저리로 넘길 일이 무어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고전한학과 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주희에서 정약용으로』『조선유학의 거장들』 등을 썼다.

![[오늘의 운세] 5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