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난 2001년 9월, 목마른 구조대원들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물을 찾았다. 직원이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돈을 내세요.” 몇 시간도 안 돼 이 얘기가 인터넷에 오르고 며칠 만에 미국 전역에 퍼졌다. 회사 측은 막대한 양의 커피를 구호물품으로 제공하며 파문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2년 넘게 불매운동에 시달렸다. 가파른 성장세도 꺾이기 시작했다. 임금이 높고 일하기 좋은 직장이라는 평판이 한순간에 휘청댔다. 남미의 커피 농가를 지원하며 쌓은 친환경 이미지도 마찬가지였다.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자인 로널드 알솝이 쓴 『위대한 기업들의 브랜드 전쟁』에 나오는 얘기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이윤 추구가 얼마나 기업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다.
사회책임경영(CSR) 전도사 필립 머비스 보스턴칼리지 교수
사회책임경영(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CSR) 전문가인 필립 머비스 보스턴칼리지 교수는 “최고 기업이 되려면 환경(Environment)·사회(Society)·지배구조(Governance) 등 3박자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값싸고 좋은 상품만으론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 역시 지구와 인간을 돕는 상품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더하지 않고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했다. SK그룹의 CSR을 자문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그를 서울 을지로2가 SK텔레콤 본사에서 만났다.
-CSR을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 많다.
“CSR은 1950~60년대 그렇게 시작됐다. 기업이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자선사업을 주로 했다. 그것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관련 단체에 수표를 끊어 주는 식이었다. 대상도 고객에 한정됐다. 15년 전 월마트는 고객에게 정성을 다했지만 직원 배려엔 소홀했다(90년대 월마트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악명을 떨쳤다). 시간이 지나며 수준이 높아졌다. 요즘엔 주주뿐만 아니라 임직원과 사회를 고려하는 게 일반화됐다. 이익을 내면서도 윤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나타났고, 최근엔 지구와 환경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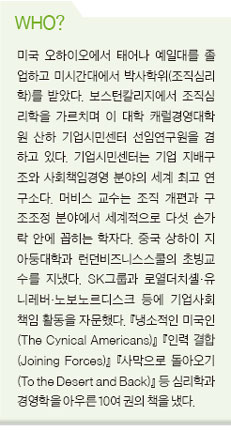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주주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 그렇다는 얘긴가.
“맞다. 세 가지 계기가 있었다. 회계 부정으로 스캔들을 일으킨 엔론 사태가 첫째다. 기업을 감시하는 눈이 많아지고 회계 기준을 강화한 사베인-옥슬리법이 만들어졌다. 둘째는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쓰나미다.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정부 개입이 불가피해지면서 기업이 사회와 따로 놀 수 없다는 게 입증됐다. 비정부기구(NGO)의 목소리도 커졌다. 이런 영향으로 배당을 많이 주기 위한 단기 성과주의가 퇴조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요즘 경영대학원(MBA)에선 ‘주주자본주의’와 함께 ‘이해관계자 모델’을 가르친다. 기업이 주주와 고객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같은 위기 상황에선 모든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나.
“기업에 여유가 없어진 건 사실이다. 고객과 마케팅·연구개발·CSR 가운데 어떤 걸 줄여야 할지 딜레마에 빠진다. 하지만 CSR 투자는 계속해야 한다. ‘금융위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물으면 답은 ‘기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어려울수록 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노력이 말로만 그쳐서도 안 된다. ‘지구를 지키고 소외계층을 돕는다’고 아무리 광고해 봐야 소비자는 다 안다.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창의성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른 기업과 손잡고 시너지를 창출하거나 직원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 등이 있다.”
-기업은 CSR의 효과를 바로 알기 어렵다고 답답해한다.
“측정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전혀 안 해도 기업이 망하고 너무 집착해도 망한다. 회계 투명성 등 ‘성적표’는 바로 알 수 있다. 회사의 평판, 임직원의 애사심, 판매량, 신시장 개척도 등도 알 수 있지만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하긴 어렵다. 사회에 대한 영향은 더 복잡하다. 행복이나 건강을 수치로 표현할 순 없다. 효과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하거나 게으르게 살 수는 없지 않나.”
-한국 기업의 CSR 수준은 어떻게 보나.
“CSR엔 단계가 있다. 1단계는 일자리·이익·세금 등 법을 준수하는 기업 본연의 역할이다. 2단계는 자선·기부·환경운동 등 외부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3단계는 이를 자연스럽게 회사의 이익과 일치시킨다. 한국 기업은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서고 있다. LG는 친환경 디자인을, 삼성은 에너지 절감을, 현대차는 전지기술을 부각하고 있다. SK는 모바일 기술을 공익과 접목하고 있다. 미아 찾기, 기부, 비상시 구조 요청 등이 네트워크로 지원된다.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공익과도 일치한다. 출발은 늦었지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아직 부족한 점도 있을 것 같다.
“삼성과 SK 등에서 임직원의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있지만 몸으로 때우는 측면이 강하다. 손발이 아니라 기업이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 그래야 밥 한 끼를 주는 게 아니라 밥상을 차리는 법을 가르치는 수준에 올라선다. 시스코는 매년 수천 명의 젊은이에게 기술 교육을 한다. IBM은 수백 명을 세계 저개발 지역에 파견해 한두 달씩 자원봉사를 한다. 사회공헌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투자를 이익으로 바꾸는 전략도 부족하다. 한국 기업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데도 반기업 정서가 강한 이유가 있다. 일부 기업이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간한 ‘2007년 사회공헌 백서’에 따르면 전경련 소속 208개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은 1조9556억원으로 경상이익의 2.5%에 달한다. 5년 전보다 두 배로 늘었고 미국보다 훨씬 비율이 높다. 기부금이 1조478억원, 직접 운영 프로그램에 지출한 비용이 8589억원이다. 올 연말 나올 2008년 수치도 ‘성장세는 둔화되겠지만 줄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다. 하지만 이 금액 중 상당수는 순수하거나 자발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기업 오너들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기부란 카드를 내보이곤 했기 때문이다.
-세계화가 한국 기업에 던지는 과제는.
“스케일을 키워야 한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해외 소비자 덕에 기업이 유지되고 성장한다. 이에 비해 해외 CSR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작다. 물론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브라질·남아공 등에서 글로벌화를 꿈꾸는 기업들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해외 고객에게 어필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올 1월 한글판이 나온 책 『세계 최고 기업들의 기업시민활동(Beyond Good Company)』에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 기업과 위대한 기업의 차이가 뭔가.
“지금까지 좋은 기업은 품질 좋은 물건을 값싸게 만드는 회사를 뜻했다. 앞으론 이것으론 부족하다. 지구와 인간에게 도움이 될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기부나 봉사보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 사회에 해를 주지 않는 차원을 넘어 사회를 이롭게 하는 상품을 만드는 게 위대한 기업이다. 미국의 신발회사인 팀버랜드는 상품에 원료와 탄소 배출량은 물론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일일이 표시한다. 편익을 키우고 부작용은 줄이기 위한 노력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알린다. 소비자도 이에 호응한다. 건강한 음식,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화장품, 공해 예방과 오염 제거, 어린이 비만 예방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은퇴해도 월 300만원 꽂히네…"한국서 가장 부유한 세대 온다" [860만 영시니어가 온다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1/6164bf75-f38e-4fd7-80ab-135806d5a6da.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