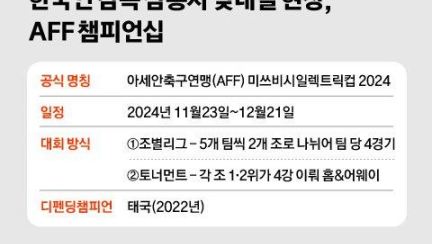▶ 오사카 선술집에서 김영희 대기자(左)와 만나 집필을 약속할 때의 필자(왼쪽에서 두번째).
혼났다. 내일이면 나도 해방된다는 희망에 부푼 이 시간. 이런 시간이 나에게도 오다니, 인생이라는 것 참 길고 좋구나.
3년 전이던가. 일본 '고베'에서 재일 한국인을 위한 제2의 노인홈 '고향의 집' 준공식에서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를 만났다. '오사카'에 노인홈을 만든 윤기씨가 또 하나 큰 일을 해낸 것이다. 행사가 끝나고 우리 일행은 방정환문화재단 이억순 이사장과 동아일보 김충식 논설위원, 윤기씨와 어느 술집에 들어가서 따끈한 정종을 마시다가 무엇 때문인지 내가 홍승면.천관우 이야기를 꺼냈다. 그랬더니 김 대기자가 중앙일보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써달라고 했다. "여기서 약속하는 겁니다" 라고도 했다. 그 난이 워낙 인기라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겠지 이해하고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그런데 3년째 되던 어느 날 약속을 지켜달라는 소식이 왔다.
그리고 쓰게 된 것이 '구름의 역사'다.
나는 '인생만유기'를 쓸 작정이었다. 어차피 인생이 대수로운 것인줄 알고 살아왔는데 별로 대수로운 것이 아니더라는 이야기. 만화처럼 농처럼 장난을 쳐보려고 했다. 제목 후보를 몇 가지 보여줬더니 중앙일보 김수길 편집국장이 "구름의 역사? 그거 좋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연재가 시작되었다. 시작한 지 이틀밖에 안 되던 어느날, 관훈클럽에서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에게 상을 준다기에 나갔더니, 누가 "운사 선생이시죠? 좋습니다. '구름의 역사' 스타트 잘 끊으셨습니다. 기대합니다"라고 했다. 거기에서 큰 기운을 얻었다. 넉달 동안 써오면서 그때 그렇게 격려해준 우정에 감사한다.
반응이 많았다. 특히 예과 친구들은 "운사, 아직도 젊구나"라고 했다. 사진이 나가면 "야, 내 사진이 나갔다고 삼지사방에서 전화가 온다"고 좋아했다. 이름만 나가도 좋아들 했다. "한국의 현대사를 보는 것 같다"는 이야기는 도리어 부담이 되었다.
내가 그렇게까지 공부한 것이 없기 때문이었다. 지금 새삼스럽게 공부할 수도 없는 일이다.
보통 이 난의 원고는 미리 써온 것으로 작업한다고 했다. 나는 그날 그날 썼다. 내 평생의 버릇이다. 새벽 3시에 신문이 오면 그 회를 읽고 다음 작업에 들어갔다.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무수히 피웠다. 새벽에 팩스로 원고를 보내면 홍수현 기자가 입력해 또 그것을 나에게 보내준 작업, 매우 고달펐을 것이다.
나보고 기억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했다. 좋긴! 얼굴이 선명히 떠오르는데, 이름이 뭐더라? 그런 경우 숱하게 많았다.
제일 난처한 것이 그 이야기에 알맞은 사진 구하기였다. 내 앨범은 청주대학 연구실에 가 있다.
어떤 분은 왜 그렇게 당국의 주목을 많이 받았느냐고도 했다.
후회스러운 것은 꼭 써야만 할일을 못 쓴 것, 그분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데 못한 일들이다.
김 대기자가 나를 운동장으로 끌고 가서 한바퀴 돌아보라고 할 때는 과연 돌 수 있을까 중간에 주저앉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까지 온 것이 희한하다.
한운사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