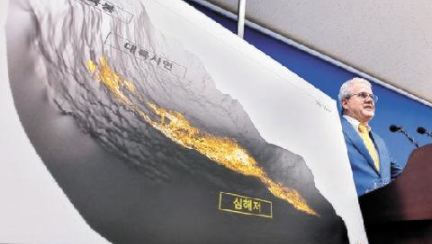영국의 제1야당인 보수당은 지난달 집권 노동당과 오랜만에 손을 잡았다. “노동당과 친구는 아니지만 (금융위기를 맞은) 지금은 하나가 돼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보수당 당수 데이비드 캐머런은 “노동당 정부의 위기 관리 대응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캐머런으로선 정치적 부담이 있었지만, 위기 상황에서 그는 ‘협력’을 선택했다.
고든 브라운 총리는 이번 사태에서 위기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캐머런 역시 야당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기회가 됐다. 큰 고비를 넘긴 뒤 정책 비판으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이번에 보수당이 보여준 초당적 리더십은 60여 년 전 정치 선배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보수당 처칠의 전시 내각에 자유당과 노동당이 스스로 참여했던 경우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노동당의 결단이었다.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전시 내각은 훗날까지 많은 사람의 기억에 남아 있다.
반면 프랑스 야당은 스스로 초라해지는 길을 택했다. 사회당은 금융위기 직후부터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만 주력했다. 사르코지의 제안으로 이뤄진 유럽 4개국 정상회담이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자 사회당은 “사르코지식 보여주기 정치로 시간만 잃어 버렸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는 태도는 사회당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후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역사적 합의안이 나왔다. 이에 따른 구제금융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사회당은 기권을 택했다. 구제금융에 반대한다면 합리적 이유를 대고 반대표를 던지는 게 책임 있는 야당의 행동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 “무턱대고 반대만 한다”는 여론의 비난이 부담스러웠다. 그렇다고 찬성표를 던지면 사르코지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아 마냥 찝찝했던 게 아닌가 싶다. 무책임과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의 야당은 어느 쪽일까. 최근의 국내 뉴스를 보면 어려운 나라 사정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정부 깎아 내리기에만 열을 올리는 건 아닌가 싶다. 야당도 분명히 국민의 대표다.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협력’이 필요할 때도 있다. 국민을 위해서다. 위기 때의 리더십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을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진배 파리 특파원
![[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