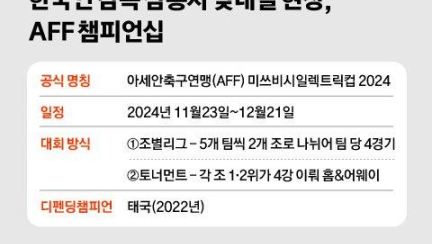하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듯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 발리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2009년 말까지 어떤 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인가다. 절차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진통을 겪었는데, 구체적인 감축 협상에 들어가면 훨씬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개발도상국 지위를 누렸다.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던 1992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라는 의무를 지지 않았다. 10년이 지난 지금 국제사회는 한국을 개도국으로 보지 않는다. 국제 위상에 맞는 ‘회비’를 내라고 요구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고, 1인당 배출량도 OECD국 가운데 중간 수준이다. 더 이상 핑계를 대며 뒤로 빠질 수 없다. 정부 내 분위기도 2013년 이후에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기후변화 제4차 종합 대책’에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됐다. 2012년까지 추진할 이 대책에는 풍력·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내년 말까지 국가 중장기 감축 목표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국제사회의 압력이나 국내 사정 사이에서 충분히 고민한 결과인지는 의문이다. 가뜩이나 층이 얇은 국내 전문가들이 대거 발리 회의에 참가했던 11일에 공청회가 열렸고, 발리회의 결과가 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발리에서 유엔과 유럽연합(EU)이 제안한 감축 목표는 미국·일본·캐나다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감당하기 어렵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보다 25~40%를 줄이자는 제안 중에서 최소치인 25%를 적용하더라도 한국은 에너지 소비를 현재보다 60% 이상 줄여야 할 판이다. 한국은 9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두 배로 늘었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이고도 더 줄여야 한다.
한국은 당분간 에너지 소비가 더 늘어날 것까지 감안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진국과는 완전히 다른 감축 목표·일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고 목표치가 턱없이 낮아서도 곤란하다. 모든 나라가 감축 계획을 내놓았을 때 선진국은 물론 다른 개도국과도 비교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선진국들은 중국·인도처럼 배출량이 많은 개도국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로서 한국에 더 큰 노력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
한국으로서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절약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투자를 늘려야 한다. 한국이 마련한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내놓고 설득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력을 길러야 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해결책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다른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거기서 배출권을 얻는 이른바 청정개발체제(CDM)가 대표적인 예다. 필요한 배출권을 채우고도 남는다면 선진국에 팔 수도 있다.
발리 회의의 결정대로 개도국의 온난화 피해를 예방하고, 선진국이 가진 청정·에너지 기술도 개도국에 전수하는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 기업이 전략을 잘 세우고 접근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적 침체를 상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은 향후 2년간의 감축 협상에서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최대로 올리려 할 것이다.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한국이 패하지 않으려면 폭넓은 시야와 냉철한 판단, 탄탄한 협상력을 골고루 갖춰야 할 것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