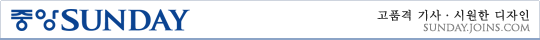 주중 한국대사관 황정일(52) 공사가 7월 29일 복통으로 중국 베이징 시내 비스타클리닉을 찾아가 항생제 로세핀과 칼슘이 함유된 링거액을 투약 받던 중 갑자기 숨졌다. 중국 측은 사인을 ‘심근경색’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주중 한국대사관과 외교부는 의문을 제기하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중국 측에 요구해 외교 갈등을 빚었다. 황 공사의 사망 원인과 문제점을 추적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황정일(52) 공사가 7월 29일 복통으로 중국 베이징 시내 비스타클리닉을 찾아가 항생제 로세핀과 칼슘이 함유된 링거액을 투약 받던 중 갑자기 숨졌다. 중국 측은 사인을 ‘심근경색’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주중 한국대사관과 외교부는 의문을 제기하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중국 측에 요구해 외교 갈등을 빚었다. 황 공사의 사망 원인과 문제점을 추적했다.
7월 30일 오후 7시 베이징대 부속 제3병원. 중국인 부검 의사 2명과 법의학자 1명이 황 공사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모였다. 한국대사관은 수소문 끝에 현지의 한국인 산부인과 전문의를 참관인으로 내세웠다. 참관인은 부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문제가 없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 당국이 사망 48시간 이내에 부검을 해야 한다고 해 의사를 급히 수배했으나 부검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의사를 찾지 못해 산부인과 의사를 입회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부검은 세 시간 동안 진행됐고 중국 측은 ‘지병에 의한 심근경색’이라는 1차 부검 소견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주중 한국대사관과 황 공사의 가족은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부검 결과에 반발했다. 평소 황 공사가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칼슘 제제와 항생제인 로세핀을 동시에 처방한 것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장이 지난달 15일 베이징으로 출국했다. 서 부장은 심장과 위의 장기 표본과 슬라이드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 중국 의사·약리학자 25명과 ‘황 공사 사망 원인의 종합적 규명을 위한 전문가 협의’도 했다. 그리고 적출한 심장 조직의 일부를 갖고 귀국했다. 육안검사와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한 뒤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결론 내렸다. 서 부장은 “황 공사는 본인이나 가족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맥경화 기왕증(旣往症·병력)을 갖고 있었으며 이것이 심근경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스타클리닉이 오진하고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별개로 하고 링거를 맞은 것이 사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심근경색은 잦은 소화불량·속쓰림·복통·구토증세가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식중독 증상으로 오인하기 쉽다고 한다. 이에 따라 황 공사의 사인을 둘러싼 한·중 양국의 갈등은 1개월 만에 수그러들게 됐다. 서 부장은 “우리 측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검을 참관했더라면 불필요한 외교적 갈등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황 공사 사망 직후 주중 대사관이 국과수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왔고, 서 부장이 “국과수가 반드시 부검을 참관해야 할 사안”이라고 수차례 설명했다. 하지만 대사관 관계자는 “알았다”고 답한 후 전화를 끊었다. 그후 산부인과 의사는 서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검을 참관하기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느냐”며 난감해 했다고 한다. 참관이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국과수가 참관하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허락이 필요하고 그러자면 시간이 더 지체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주재 외교관이나 상사원 등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중석 부장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 단계에서 국과수 관계자가 대책 회의에 참석해 부검ㆍ현지 조사 참여 여부 등을 논의하는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중앙SUNDAY 구독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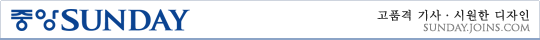 주중 한국대사관 황정일(52) 공사가 7월 29일 복통으로 중국 베이징 시내 비스타클리닉을 찾아가 항생제 로세핀과 칼슘이 함유된 링거액을 투약 받던 중 갑자기 숨졌다. 중국 측은 사인을 ‘심근경색’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주중 한국대사관과 외교부는 의문을 제기하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중국 측에 요구해 외교 갈등을 빚었다. 황 공사의 사망 원인과 문제점을 추적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황정일(52) 공사가 7월 29일 복통으로 중국 베이징 시내 비스타클리닉을 찾아가 항생제 로세핀과 칼슘이 함유된 링거액을 투약 받던 중 갑자기 숨졌다. 중국 측은 사인을 ‘심근경색’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주중 한국대사관과 외교부는 의문을 제기하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중국 측에 요구해 외교 갈등을 빚었다. 황 공사의 사망 원인과 문제점을 추적했다. ![[오늘의 운세] 6월 1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북∙일, 몽골서 비밀접촉…"김정은 직보라인 보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3/d6b5ccbe-6bc0-4332-9a39-99455974df1d.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