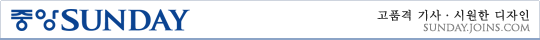몇 년 전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있는 깊이 10m가량의 맨홀 속에서 어린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다.
인근에 사는 아이로, 사흘 전에 실종 신고된 상태였다. 아이는 뚜껑을 제대로 덮지 않은 맨홀에 실수로 소지품을 떨어뜨려 이를 줍기 위해 내려갔던 것으로 추정됐다. 아이는 맨홀 구멍 가장자리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했고, 머리와 가슴에 손상을 입어 의식을 잃었을 것이다. 추락 직후까지만 해도 생존해
있었지만 바닥에 얕게 고여 있던 물이 문제였다.
하필이면 추락 후 물이 고여 있던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정신을 잃었던 것이다. 부검 결과 아이의 직접 사망 원인은 익사로 밝혀졌다. 접시 물에 코 박고 죽은 격이었다.
아이가 익사로 이어지게 된 것은 추락으로 의식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의식만 있었다면 익사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최종 사망 원인을 따질 때는 단순 익사로 처리하지 않고 익사에 이른 다른 요인이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단순히 물에서 발견된 주검이라고 해서 모두 익사체로 볼 수는 없다. 수영하다가 혹은 물 근처에 있다가도 심장 발작이나 간질 때문에 의식을 잃고 익사할 수 있다. 이 때에도 직접 사망 원인은 익사지만 최종 사인은 병사(病死)가 된다. 물에 빠져 사망하기 직전에 구출해 소생시켰지만, 며칠 뒤에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사고사(事故死)로 분류한다.
드물지만 사고를 동반하지 않고 건강한 청소년이 얕은 물에서 실신해 익사하는 경우도 있다.
대개는 자맥질하다가 발생하는데 잠수 전의 과호흡(過呼吸) 때문이다. 호흡중추는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에 영향을 받는다. 잠수하기 전에 여러 번 깊은 호흡을 하면 몸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된다. 이렇게 되면 호흡중추를 자극하지 못해 산소가 심각하게 부족해지고 갑자기 실신하는 것이다.
익사는 들이마신 액체가 기도 말단이나 폐포(허파꽈리)를 막음으로써 사망하는 것이다. 익사의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물에 빠지면 1분가량은 숨을 참을 수 있다. 그 사이 혈액 속에 많아진 이산화탄소가 호흡중추를 자극해 결국 원치 않은 호흡을 하게 만든다. 이때 물을 흡인해 의식을 잃는다. 이어서 온몸의 골격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며 동공이 수축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근육이 처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호흡이 얕아지면서 가사(假死)상태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호흡운동이 발작적으로 몇 번 있다가 차츰 없어져 사망하게 된다.
익사하면 주검은 보통 물속으로 가라앉지만 입고 있던 옷 때문에 떠있는 경우도 있다. 가라앉아도 부패로 발생하는 가스 때문에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른다. 부패 가스 때문에 비중이 낮아져서다. 떠오르는 시기는 부패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 여름철에 수온이 높으면 부패가 빨리 진행되므로 3일 이내에 떠오르지만, 수온이 0도에 가까운 겨울철에 익사하면 수온이 올라가는 봄철이 돼야 떠오르기도 한다. 사망한 지 오래되지 않은 주검이라면 익사 여부를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 있지만 주검이 부패했다면 이를 가리는 게 쉽지 않다.
이윤성 교수 서울대 의대·법의학
![[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세한도' 기부 때도, 하늘 갈 때도 "알리지 말라"…기부왕 손창근 별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2fc15087-8cdc-4961-8b7a-c1e93fe03703.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