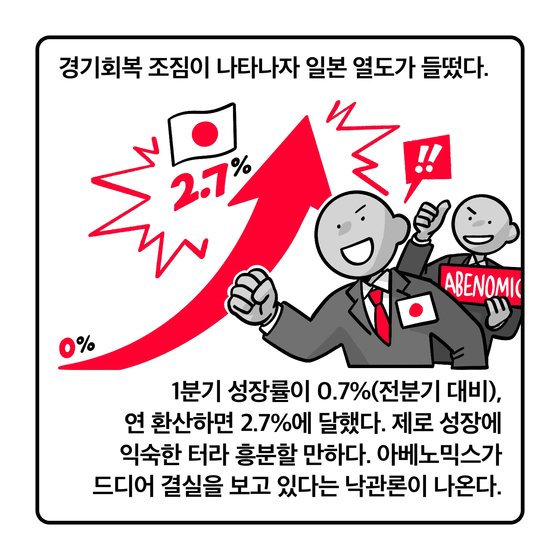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자 일본 열도가 들떴다. 1991년 버블 붕괴 이후 30여년 못 보던 풍경이기 때문. 올 1분기 성장률이 0.7%(전분기 대비), 연 환산하면 2.7%에 달했다. 제로 성장에 익숙한 터라 흥분할만하다. 아베노믹스가 드디어 결실을 보고 있다는 낙관론이 나온다. 일본 경제는 내수 중심이다. 국내총생산(GDP) 중 가계소비가 54%를 차지한다. 돈을 풀어도 꿈쩍 않던 소비가 1분기 0.5%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1.4% 늘었다. 엔저와 코로나 엔데믹 덕분에 관광도 호황이다. 3월 외국 관광객은 182만 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의 100배다.
소비가 늘면서 기업에 온기가 퍼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올해 상장사 순이익이 2%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제자리를 맴돌던 임금도 오른다. 올해 임금 상승률은 93년(3.9%) 이후 최고치가 예상된다. 닛케이지수는 3만3000을 넘어섰다. 33년 만에 최고치. 미국·중국 갈등 속에 일본이 대만의 대안 투자처로 떠오른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가 대만 반도체업체 TSMC 주식을 매각했다. 그 돈으로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 5대 종합상사 주식에 60억 달러(약 8조원)를 투자한 게 화제가 됐다.
성장·소비·투자·주가 지표 호전
펀더멘털 개선보다 유동성 덕분
엔저에도 수출 감소…디지털 낙후
혁신·변화 없이 진짜 회복 어려워
일본 경제가 온통 호재로 둘러싸인 듯하다. ‘소득·이익 증가→소비·투자 회복→디플레이션 탈출’의 선순환에 올라탄 것일까. 이번에도 버핏이 기가 막히게 맞힌 걸까. 낙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으로 지난해 이후 전 세계가 금리를 올려도 일본은 저금리를 고수했다. 최근 회복은 넘치는 유동성에 힘입은 바 크다. 경제 펀더멘털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라는 얘기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4%대에 달한다. 90년대 이후 줄곧 1%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올랐다. 젊은이들은 한 번도 경험 못한 인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을 깰 불쏘시개를 바라던 일본이다. 하지만 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나쁜 인플레이션’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고물가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는 물가가 올라도 금리를 올려 돈줄을 조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56%로 선진국 중 가장 높다. 그 돈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했고, 일본은행이 국채의 50%(530조엔)를 떠안았다. 아베노믹스를 시작한 10년 전보다 다섯 배나 늘었다. 금리를 올리면 국채가격이 하락해 대규모 평가손이 불가피하다. 이자도 많이 늘어난다. 금리를 쉽게 올리기 어려운 이유다.
엔저도 뜨거운 감자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엔화는 달러당 140엔을 웃돌고 있다. 통화가치는 한 나라의 펀더멘털을 반영한다. 통화 약세는 그만큼 국력이 약화됐다는 의미다. 기업은 부자여도 국민은 가난해진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에서 일본은 대만에 밀렸다. 근로자 평균 임금은 G7 중 최하위다. GDP는 2010년 중국에 세계 2위를 내주더니 독일의 추격으로 3위도 위태롭다. 88년 세계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53개가 일본 기업이었다. 지난해는 도요타 한 곳만 포함됐다.
엔저에도 1분기 수출은 4.2% 감소했다.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든 영향이 크지만, 기업 경쟁력도 시원치 않다.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이 부진하다. 독일이 고부가가치 공산품을 생산하며 수출을 꾸준히 늘린 것과 대비된다. 도요타 등 대표 기업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긴 것도 원인이다. 제조업 해외생산 비중이 98년 10%에서 2020년 24%로 늘었다. 해외에서 생산해 해외에 파니 엔저로 인한 가격 효과를 못 보는 것이다.
더 치명적인 건 세계 IT 혁명에 올라타지 못한 점이다. 지금도 사무실에서 팩스와 도장을 쓰고, 관공서·은행에서 플로피디스크로 자료를 저장한다. 신용카드를 안 받는 점포가 흔하다. 정부가 최근 마이넘버카드(한국 주민등록증) 보급에 공을 들이지만, 입력 오류와 발급 지연이 속출한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일본 디지털 기술력은 63개국 중 62위다. 빅데이터 활용과 기업 민첩성은 꼴찌다. 세계는 정신없이 바뀌는데, 벌어들인 돈을 쌓아두는 ‘축소 균형’에 주력한 결과다. 기업 지배구조에도 약점에 있다. 오너 아닌 이사회 중심 의사결정 구조로는 신속 과감한 투자를 하기 어렵다.
지난해 유엔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일본은 13위에 그쳤다. 한국은 6위. 도전과 변화보다는 체제에 순응하는 데 익숙하다. 우월감은 여전하지만 위기감이 적다. 정부가 잘못해도 정권을 뺏길 위험이 거의 없다. ‘경제 관료의 입김이 여전히 세다.’(노구치 유키오 『1940년 체제』) 세계 1위 고령화(2021년 65세 이상 29%)로 내수 전망도 밝지 않다. 경제가 본격 반등을 시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요인이 너무 많은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 성장률이 내년에 1.0%로 둔화할 것으로 봤다. 정부·기업·국민 등 사회 곳곳에 혁신이 불타오르지 않는 한 진짜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글=고현곤 편집인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오늘의 운세] 4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4/2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초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 대기업 상무 출신, 전문기술 배우려 또 대학에…"몸 낮추고 몸값 올리는 노력은 계속해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4/27/ac8138be-929f-4f41-8283-4cdfa711b01f.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