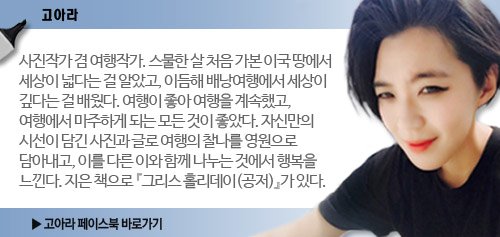누구나 한 번쯤은 절벽 앞에 선다. 대학시험부터 취업, 연애 등에 있어 세상이 ‘실패’라고 일컫는 것을 겪을 때마다, 크고 작은 절벽들은 우리를 찾아온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주변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겠다고 길을 떠난 청춘을 무척이나 염려했다. 타인의 말에 휘둘려 그만둘 성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갈수록 팽창되는 불안감에 한 발 두 발 밀려, 나는 어느덧 벼랑 가까이에 와 있었다. 아니, 떠밀렸다고 표현하는 편이 더 적절할 수도 있겠다.

웨스트피오르 서쪽 땅끝에는 거대한 절벽이 있다. 길이가 무려 14㎞에 이르고, 최대 높이는 441m에 달하는 이 절벽의 이름은 라트라비야르그(Látrabjarg). 그린란드와 아조레스 제도를 제외하고는 유럽 최서단이자, 유럽 최대 조류 서식지로 유명한 곳이다. 그러나 정작 이곳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단순했다. 절벽의 실체가 궁금했다.
라트라비야르그로 가는 길은 듣던 대로 험난했다. 이미 먼지를 뿌옇게 뒤집어쓴 자동차는 또 다시 기나긴 비포장도로를 달렸다. 황금빛 억새밭을 건너, 부채 모양의 파도가 치는 해변을 지나, 들쑥날쑥한 피오르를 굽이굽이 올랐다. 어느새 도로는 희미해지고 땅끝이 눈앞에 보였다. 아무도 없는 거대한 절벽에는 바람의 거친 노랫소리만이 가득했다. 바람이 저희끼리 부딪칠 때마다 휘휘 하고 기괴한 소리를 냈는데, 이 소리 때문에 다리가 더 후들거렸다.

투박하게 난 길을 따라 절벽의 끝으로 다가갔다. 언뜻 봐도 머리가 어질해지는 높이였다. 지레 겁을 먹고 땅에 납작 엎드렸다. 굼벵이 움직이듯 찔끔찔끔 기어가 허공으로 고개를 겨우 내밀었다. 깎아내린 듯한 육지의 끝으로 새하얀 파도가 아득히 밀려들었다. 무서워서 일어서려는데 눈앞으로 새들이 날아갔다. 미처 떠나지 못한 철새인 것 같았다.

자유롭게 나는 새 두 마리를 바라보다가 필요 이상으로 잡초를 세게 움켜잡은 두 손을 보니 어이없는 웃음이 새어 나왔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수많은 새가 이곳으로 날아든다고 했다. 절벽은 추락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낭떠러지에 불과했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고 먼 바닷길을 날아온 새들에게는 안식처가 되었다.

바지에 잔뜩 묻은 흙을 털어내고 일어났다. 이제야 푸른 바다와 저 멀리 둥글게 휘어진 수평선이 보였다. 절벽이 무서워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장관이었다. 하늘과 바다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세상을 정면으로 마주한 기분이라 해야 할까. 세상 속에 안긴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 설명할 수 없는 애매한 기분이었지만, 좋은 감정인 것만은 분명했다.

새들은 아직도, 그리고 거침없이 절벽 사이를 가로질렀다. 그들의 날갯짓이 나에게 자유와 용기를 전했주었다. 오늘 본 절벽의 실체가 내 온갖 상념까지 허물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여전히 절벽은 안식처보다는 낭떠러지에 가깝고, 추락은 언제나 두려울 것을 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라트라비야르그에서 만났던 풍경과 비상하는 새에게 받은 사소한 용기를 기억하고 싶다. 따뜻한 계절에 반드시 다시 올 것을 기약하며, 절벽을 떠났다.




![[오늘의 운세] 5월 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0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