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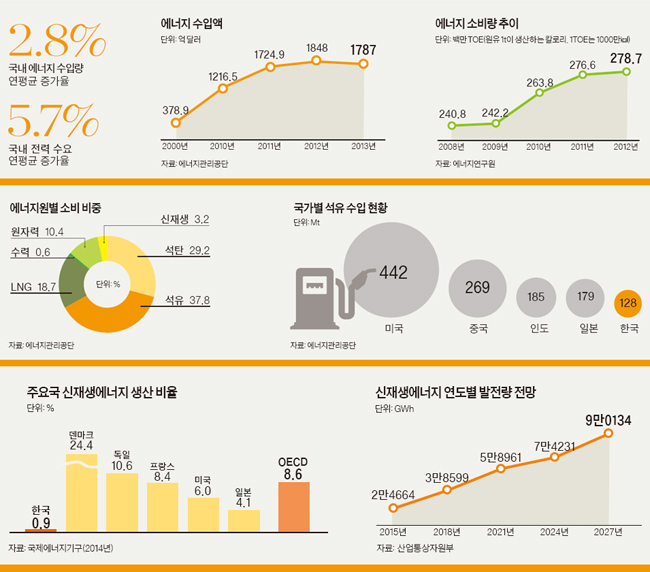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를 겪던 1998년, ‘아·나·바·다’ 운동이 있었다. 물품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쓴다는 개념이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운동이다. 미래의 에너지 형태는 이 네 가지 개념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미리 가 본 미래 에너지 사회
에너지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인다. 이렇게 아껴둔 에너지는 에너지 저장장치(ESS)에 모아두었다가 전력이 부족한 피크타임에 나눠 쓴다. 물론 이 에너지는 돈으로 환매할 수도 있다. 전기차 등에 있던 에너지는 또다시 전력망에 공급해 다시 쓸 수 있다.
알뜰한 에너지 소비가 가능한 세상
가까운 미래에는 가정에서 매시간 에너지 사용량이 그래프로 표시된다. 매일 내가 어디에 얼마만큼 썼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량은 돈으로 환산돼 적정량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침도 시스템이 알려준다. 공장이나 건물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퇴근하고 자리를 비우면 자동으로 실내등을 꺼주고, 주차장에서도 실내조명 자동제어시스템이 전력 사용을 제어한다.
이뿐이 아니다. 냉방시설을 가동할 때 시간대별로 에너지 단가가 가장 저렴한 냉방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공장에서는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 여부와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시간대를 파악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원가를 줄인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이 그리는 일상의 단면이다. 진화는 이미 시작됐다. 일부에서는 이를 도입해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코엑스가 EMS를 가동해 연 10억원, 강원랜드가 4억 8000만원, 송도컨벤션센터가 7300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절감한 에너지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에너지관리사업자는 EMS를 통해 절약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 수요자원 거래 시장을 통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력 거래가 가능한 ‘수요자원 거래 시장’을 개설했다. 실제 시장 개설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 첫 거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166만㎾의 전력 수요를 감축한 바 있다. 향후에는 사업자뿐 아니라 개인도 자유롭게 참여 가능한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에너지가 사물인터넷과 결합하면 효율성은 극대화된다. 제러미 리프킨 교수가 ‘한계비용 제로’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사물인터넷이 가진 잠재력 때문이었다. 사물인터넷은 모든 기계를 지능형 네트워크에 연결해 단위별 에너지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다. 에너지 생산성과 효율성을 40% 이상 끌어올린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만 3700만여 개의 스마트 계량기가 건물에 설치돼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각 기기와 장치에 부착돼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스마트센서는 2013년 35억 개를 넘어섰다. 스마트센서의 수는 향후 10년 안에 2조 개를 넘어서고 2030년이면 100조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거의 모든 기기가 사물인터넷으로 제어되는 셈이다. 이 센서들은 온도·습도·밝기 등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전달해 에너지 빅데이터를 형성한다.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과 예측은 비로소 가장 효율적인 소비 형태를 만들어 낸다.
이렇게 되면 구체적인 에너지 계획을 세우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를테면 ‘전기료를 몇만원 낮추려면 어떤 가전제품 사용을 하루 몇 시간씩만 줄이면 된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배터리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미래 에너지사회를 좌우할 궁극의 열쇠로 불린다. 얼마나 많은 용량을 얼마나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최고의 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나라와 기업이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게 된다는 얘기다.
전기에너지는 원래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에너지다. 발전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바로 쓰지 않으면 소멸한다. 그래서 이를 저장하는 장치가 필수다. 에너지 수요 관리의 핵심이다.
배터리 기술은 신재생에너지 활용성과도 밀접하다.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이 자체로는 가치가 높지 않다. 태양에너지는 낮에만 발전할 수 있고, 풍력·조력 역시 생산량과 질이 균일하지 않다. 일정 전압을 유지하기 어렵고, 시간대별로 전력 공급이 요동친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는 품질이 안 좋은 에너지로 여겨져 왔다. 대신 배터리에 저장되면 이러한 단점은 극복된다.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불리는 전기차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전기차 상용화 여부의 핵심이 바로 배터리다. 기존의 배터리 기술로는 전기차가 먼 거리를 가지 못하고, 속도 역시 빠르지 못하다. 느린 충전 시간도 많은 사람이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였다. 핵전지 등 차원이 다른 차세대 배터리가 개발되면 전기차 상용화는 앞당겨질 수 있다. 휴대전화를 전기차에 꼽아 남은 배터리로 주행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에너지, 화폐의 기능을 넘보다
공상과학영화 ‘인 타임(In Time·2011)’은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한다. 영화에서는 물건에 저마다 시간이 책정돼 있다. 모든 비용이 시간으로 환산된다. 커피 한 잔은 4분, 권총 한 정은 3년, 스포츠카 한 대는 59년인 식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팔뚝에 ‘카운트 보디 시계’가 새겨져 있다. 이 시계에 기록된 잔여 시간만큼만 살 수 있고 순간마다 시간은 줄어간다. 물건을 사도 이 시간은 줄어든다. 물건을 사면 기록된 시간은 그만큼 차감된다. 반대로 일을 하면 정해진 시간만큼 채워진다. 이 시간은 생명이자 돈이다.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생체에너지가 화폐의 기능을 하는 사회를 그린 셈이다.
영화는 에너지도 화폐가 될 수 있다는 상상을 불어넣는다. 에너지의 발전을 두고 영화에서처럼 에너지가 화폐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물론 현재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얘기다. 아직 에너지 거래 시장은 초기 단계다. 개인이 자유롭게 에너지를 사고팔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게다가 개인이 휴대할 수 있을 정도의 배터리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담을 수도 없다.
하지만 역으로 이런 조건들이 갖춰진다면 어떨까. 출력과 에너지 밀도가 높은 초고성능 전기저장장치가 개발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리고 에너지 정량을 쉽게 뽑아내고 주입하는 기술이 있다면 머나먼 얘기만은 아니다.
류장훈 기자 ryu.janghoon@joongang.co.kr

![은퇴해도 월 300만원 꽂히네…"한국서 가장 부유한 세대 온다" [860만 영시니어가 온다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1/6164bf75-f38e-4fd7-80ab-135806d5a6da.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