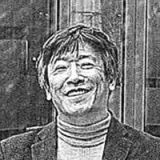강홍준
강홍준논설위원
“우리 학교엔 죽고 싶다는 아이들이 많은데…. 도와주세요.”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이 6개월간 학교를 방문한 J교수에게 이런 말을 꺼냈다. 그 교수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라고 물을 때마다 ‘우리 학교는 아무 문제 없어요’라고 하셨던 분인데 퇴임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장은 학교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 참고 참다 이런 말을 꺼낸 것이다. 그는 “서울의 낙후 지역에 있는 학교도 아닌데 이런 학교가 있을까 싶었지만 이게 우리의 숨겨진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서초고에 부임한 이대영 교장은 취임 직전 학교 교감·보직 교사들에게서 절망적인 학교 소식을 들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의 수준이 갈수록 떨어져 대입 실적도 좋지 않고….” 서초구라는 강남 3구 지역에서 서울대에 한두 명 보낼까 말까 하는 이런 후진 실적은 입학하는 아이들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이 교장은 “차라리 잘됐어요. 바닥부터 시작하죠”라고 말했다. 이후 1년간 우리 사회에서 이름 있는 입시 전문가들을 학교에 불렀다. 수시 모집이 대입의 핵심인데 학교에선 도저히 수시 대비를 해줄 수 없으니 외부 전문가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매달렸다고 한다. 6월·9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입시 전문가를 불러 고3 담임들을 교육시키고, 대학 입학사정관들을 불러 학부모에게 수시에 대비하는 특강을 하는 식이다. 그는 “학부모께 ‘돈 싸들고 사교육 시장 가시지 말고 학교로 와 설명을 들어보세요’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드렸다”고 말했다.
올 3월 집계된 이 학교의 2014학년도 대입 실적은 경이적이다. 서울대 11명, 고려대 14명, 연세대 13명, KAIST 1명이 최종 합격했고, 서초구 지역에선 유일하게 서울대 의대에도 한 명 합격시켰다.
일반고 위기는 이젠 너무도 흔한 말이다. 하지만 위기의 본질을 아이들의 낮아진 수준에서 찾는 건 게으른 관리자의 변명이 아닐까. 오히려 교장·교사 사이에 퍼져 있는 “어차피 안 돼”라는 관성의 힘이 일반고를 2·3류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
중학교 물리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관성을 깨려면 외부에서 힘이 작용해야 한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관성을 깰 수 없다. 일반고 중에서 서초고처럼 될성부른 일반고는 이렇게 생겨났다. 일반고가 살길은 문제의 심각성을 회피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부 사람들을 찾아 도움을 구하는 데 있다.
강홍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