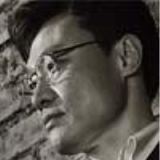이규연
이규연논설위원
‘신성한 의무라면 신성하게 대접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시험 때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날,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수백 개의 항의성 글이 쇄도했고, 결국 헌재 사이트는 마비됐다. 그 무렵, 헌법재판관 Q씨를 만났다. “어느 정도의 반발은 예상했지만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군필자의 분노샘을 자극한 것 같다.”
군필자들의 의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거칠어졌다.
‘30개월간 두들겨 맞아가며 받은 돈이 고작 수십만원이다. 내 인생, 어디서 보상받나.’
‘공수부대, 해병대 다 모여. 헌재를 폭파하자.’
위헌 결정의 관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여성·장애인 차별’ 프레임이다. 몇 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공무원시험에서 현역 복무자는 3% 이상의 가산점을 받고 있었다. 재판관들은 군 가산점이 미필자인 여성·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가로막는 차별이라고 봤다. 다른 하나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 프레임이다. 국민이 마땅히 해야 할 신성한 의무인데 이를 이행했다고 해서 모두 다 보상해줘야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군필자들은 전자보다 후자 프레임에 더 뿔이 났다. 당시 재판관 9명 중 일부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실을 찾아내 비난을 퍼부었다.
‘신의 아들들은 그렇게 신성한 의무를 왜 안 했나.’
며칠 지난 뒤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 챈 정부는 부랴부랴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군필 직장인에게 2호봉을 더 주고, 사병 봉급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호봉 인정은 기업이, 봉급 현실화는 재정당국이 반대했다. 이도 저도 안 되니, 17·18대 국회 때 네 차례나 군 가산점을 부활하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역시 여성계 반발로 무산됐다. 병역 보상의 필요성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이해관계가 얽혀 헌재 결정 후 15년이 지나도록 해법을 찾지 못했다.
최근 국방부가 제대군인 보상책으로 군 복무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졸자의 군 복무 기간을 호봉으로 환산해주는 직장에 혜택을 주는 구상도 내놓았다. 언론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냉소적이다. 이번에도 차별 프레임, 신성한 의무 프레임이 작동한다. 국방부가 민감한 사안을 불쑥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 구체적인 준비도 덜 된 구상인 것 같다. 하지만 군 가산점 제도와 달리, 이번 조치를 차별 프레임으로 볼 여지는 적다. 직접 피해를 보는 계층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은 기업 인턴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산학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다. 군 복무라고 학점으로 인정해주지 못할 이유도 없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 중인 대만에서는 군필자에게 사회적 가산점을 주고 있고 복지시설 이용료와 각종 세금을 20% 감면해준다.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 역시 입대자에게 대학입학금을 전액 지원해준다. 모병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2억원이 넘는 퇴직금과 각종 사회가산점을 준다. 각국이 스스로에게 맞는 다양한 보상책을 시행 중이다.
노르웨이 여성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병역을 이행한다. 이를 여성계가 앞장섰다. 우리는 당장 이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기 힘든 구조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월급쟁이’ 모병제로 바로 전환하기도 어렵다. 군 가산점 제도 같은 차별 색채가 짙은 정책을 부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만 군필자가 상대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취업을 준비하고 학업을 이어갈 시기에 2~3년의 공백은 어떤 식으로든 보상해줘야 한다. 학점·호봉 인정제를 포함해 다각적인 보상 방안을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 다시 해묵은 논쟁이 쏘아올려졌다. 이번에는 ‘작은 공’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규연 논설위원
![[오늘의 운세] 5월 3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맡긴 돈' 김옥숙 메모, 딸 판결 뒤집다…SK측 "비자금 유입 없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5a9a129b-9038-423f-a34c-5d888343f75e.jpg.thumb.jpg/_ir_432x244_/aa.jpg)